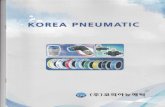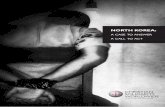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
Transcript of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
I. 머리말
과학사는 과학자들이 스스로의 계보를 쓰는 데에서 출발하였지만, 과거를
치장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사학의 한 분과로 인정을 받을 만큼 성장하였다.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역사를 쓰는 비판적 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과학사가 과
학자들의 승리의 역사를 넘어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 질문들을 정당한 것
으로 인정하고 과학의 “진보”나 “발전”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과
학사는 과학자와 과학사학자 집단을 넘어 역사학 전반에 영감을 주는 유익한 분
과로 커나갈 수 있었다. 구미의 주요 대학에서 과학사학자가 역사학과에 임용되
는 것이 전혀 놀랍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와 같은 과학사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 과학사의1) 최근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서구의 과학사학계
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김 태 호**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
었음 (NRF-2008-361-A00005).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교수
과학사
Ⅰ. 머리말
Ⅱ. 개항기에서 식민지시기 과학기술
Ⅲ. 1950년대의 과학기술계
Ⅳ. 권위주의 고도성장기(1960~70년대)
와 그 이후
Ⅴ. 한국 현대 과학사 연구의 향후 전망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52
에 비해 역사도 짧고 연구자 공동체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동등한 위상을 기대하
기는 무리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한정어에서 비롯되는 이중의 제
약이 있다. 첫째, 민족사 또는 국사의 틀 안에서 한국 과학사에 접근할 경우 민족
또는 국가 단위의 발전이나 진보라는 개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이는 민족사
또는 국사라는 틀에 내재하는 한계일 수도 있으나, 과학사와 접목될 경우 더욱
까다로운 문제가 된다. 과학사 자체가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인류 이성의 발
전 또는 진보의 역사”라는 자기정체성과도 맞닿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 또
는 국가의 발전, 동시에 인류의 집단 이성으로서의 과학의 발전이라는 두 개의
발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민족을 기본 단위로 한 과학사를
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전통 과학사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는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다.
반면 근현대 과학사에서는 오히려 이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찾아
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이는 한국 과학사가 직면한 두 번째 제약, 즉
근현대 과학이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비롯되어 한국에는 “수입”
되었다는 역사적 조건과도 연결된다. 근현대 한국은 과학, 기술, 의료를 배우고
들여오는 입장이었다는 관점을 전제하는 한, 한국 근현대 과학사는 어쩔 수 없
이 그 수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또는 왜 성공적이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치중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서사가 다른 분야, 특히 경제의 성장과 접목되
는 경우 한국 근현대 과학사는 이른바 “한국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는 데 일조해
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 또는 기대는 한국 안에서뿐
1) 과학사, 기술사, 의학사(의료사)는 실제로는 조금씩 다른 주제들을 조금씩 다른 방법론을
구사하여 접근한다. 따라서 각 연구자집단이 충분히 클 경우 서로 구별되는 분과학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 세 분과학문과 그 연구자집단이 그 정도 규모로
성장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여 이 글에서는 편의상 “과학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기술사 또는 의학사의 저작이나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
할 것이다.
353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아니라 한국 밖에서 한국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널리 퍼
져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한국 과학사의 독자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구의 과학사가 과학의 본성이나 발전이라는
믿음 등에 대해 근원적인 비판을 가함으로써 존중받는 분과학문으로 성장했다
는 점을 돌이켜 보면, 과연 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자들이 “경제 기적”의 서사를
차용하거나 그에 편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일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연구 저작의 양으로 보면 한국 과학사, 특히 한
국 근현대 과학사는 최근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다. 과학사학 전문학술지인 『한
국과학사학회지』 뿐 아니라 역사학계의 여러 학술지에 한국 근현대 과학사를 주
제로 한 논문이 점점 많이 실리고 있으며, 저자도 과학사학 뿐 아니라 다양한 배
경을 가진 이들로 그 층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과학사 분야의 학위논문들
은 점점 근현대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강해져 그 수로는 전통과학사를 넘어서기
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과학사학계 연구자 공동
체를 넘어 역사학계 전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짧은 논평이 이 질문에 대해 확고한 답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
근의 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잠정적이나마 앞으로의 연
구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나아가 과학사학계가 이로부터 어떤 전망을 공유할
수 있을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 란에서는 이미 2008
년, 2010년, 2012년에 과학사 분야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 일이 있었다. 2008년
에 한국 과학사(이관수 2008), 2010년에는 한국 전통과학사(구만옥 2010), 2012
년에는 (국내에서 연구한)서양과학사에 대한 논평이 실렸으므로(홍성욱 2012),
이번에는 중복을 피하여 2008년 이후 출판된 한국 근현대 과학사로 논평의 대상
을 좁히고자 한다. 전근대와 근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종설이 응당 나와야 하겠
으나, 한 편의 원고에서 전근대와 근대를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루는 일은 쉽
지 않기에 이번에는 서구 근대 과학기술 및 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에 대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54
한 연구들을 돌아보고, 전통 과학사의 회고와 전망은 다음에 더 전문적인 논평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도록 하겠다.
Ⅱ. 개항기에서 식민지시기의 과학기술
개항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시기에 비하면 그 양이 많지 않다.
식민지시기에 이식되거나 습득한 과학기술 관련 제도와 조직들이 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데 비해, 개항기의 여러 가지 시도들은 특별한 성과를 내
지 못한 채 무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때
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이 이 시기에 천착하여 개항기
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김연희 2009). 김
연희는 개항기 서구문물 도입과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기 사업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김연희 2006), 이후 연구를 확장하여 개항기에 서구 과학기술
이 한반도에 소개되는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과거의 연구가 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물을 발굴해 내고 과학기술에 관
련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들을 선별해 내는 작업이었다면, 김연희는 그것
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해 왔다. 개항기의 각종 시책들을 현대인의 관
점에서 결과의 성패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행위주체들이 그 시책을 통해
기대하고 추구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주목함으로써, 그는 과학사에서 개항기를
무지에서 비롯된 시행착오와 실패로 점철된 시기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했다.
이어지는 식민지시기의 과학기술 관련 제도와 인력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이 논평이 다루는 시기(2008~2014)에 가장 활발하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주
제다. 여러 신진연구자들이 식민지시기의 과학기술을 다루었다. 이들은 역사학
계의 최근 논의를 받아들여 “수탈이냐 근대화냐”와 같은 이분법적 질문을 지양
355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하고 식민지적 근대의 전개 과정과 그 실체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
었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 여러 제약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과학기술계를 적
극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들
을 내놓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연구는 과학기술계 인력의 성장에 관한 것들이다. 비록 일제
가 과학기술계 고급인력의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
와 있던 일본인 과학기술자들을 보조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학교 수준
의 교육을 받은 중급 과학기술자들이 적지않게 양성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몇
몇은 일본인 상급자 또는 스승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
라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복 후 한국 과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었다. 김성원은 생물학자 모리 타메조(森為三)의 조수였던 조복성이 재
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고 한국 곤충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김성원 2008). 또 이태희는 조선총독부 중
앙시험소의 활동을 추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안동혁을 비롯한 조선인 연구인
력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보이는 한편, 제국의 중심부였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
은 기관에 머물렀을 중앙시험소가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과
의미를 얻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이태희 2009). 선유정도 뒷날 한국 임학
의 대부로 성장한 현신규의 초기 경력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과
학기술 방면의 경력을 추구하는 일의 복잡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선유정 2014).
김태호도 안과의사 공병우의 초기 경력을 재구성함으로써 식민지시기 의료인의
성장 경로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조선인들이 어떻게 “명
사”로 부각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김태호 2013).
식민지시기 조선인 과학기술 인력의 성장이 전적으로 일본인 상급자나 스
승의 후견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인 과학자들은 일본인의 인간적 호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일본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조선인 과학기술자로서의 전
략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재조 일본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56
나 철학에 따라 연구의 노선과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정은 나카이 다케노신
(中井猛之進)과 이시도야 쓰토무(石戸谷勉) 등의 일본인 식물학자들과, 그들과
함께 활동했던 정태현과 도봉섭 등의 조선인 연구자들을 통해 이를 상세하게 보
여주고 있다. 일본 본토의 학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나카이가 연구의 보
편성을 중시했던 반면, 조선에서의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이시도야는 조선
의 특수한 사정을 더 강조했고, 조선인 연구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생각
하는 방향의 연구를 시도했던 것이다(이정 2013). 이정은 이를 통해 식민지적 근
대 그 자체가 일방적으로 이식되거나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여러 조건
과 식민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거쳐 그 결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한편 때로는 일본인 연구자와 후원 관계로 묶이지 않고서 조선인으로서
의 독자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연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만용이 연구해 온 석주
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문만용은 석주명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
는 나비분류학에 전념한 까닭을 그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구여건이 좋은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를 넘어서려면 조선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하는데, 조선의 산하에서 보낸 시간과 비례하여
역량이 쌓이는 자연사분야야말로 그에 적합하다는 것이 석주명의 주장이었던
것이다(Moon 2012).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 안에서의 협력이 분명히 먼저 눈에 들어
온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표면적 협력 안에서의 미시
적 긴장관계도 보이고, 그 긴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어내기 위한 각 행위주체
들의 전략적 사고와 언행도 보인다. 더욱이 그 긴장의 전선이 민족적 갈등 하나
만이 아니고, 때로는 다른 요인들 ― 일본 제국의 교육 체계 안의 위계, 개인적 인
연, 혈연과 지연, 종교와 문화, 사회계층 및 계급 등 ― 이 민족적 갈등보다도 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이와 같은 “일상적인”
갈등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라는 근본적인 모순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을
때에 국한된다. 총력전 체제 아래서 다시 민족적 모순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에
357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민족적 갈등을 다른 갈등들과 같은 층위에서 병렬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식민 치하 조선인의 삶에서 보이는 긴장과 균열들에 천착한 연구를
과학사학계에서 선도한 것은 아니고, 현재도 과학사학계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학사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에서 이런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근현대의 과학기술이 기본적으로 체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활동
이라는 사실과 떼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만이 체제 안에서 영위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은 체제 밖에서 전업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
의 없다는(임상의료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점에서 다른 전문지식과는
다르다. 식민지시기 과학기술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곧 식민 통치 체제의 안에
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조선총독부와 제국대학 같은 식민통
치기구 또는 식민지에 진출한 산업재벌 등 식민 통치 체제의 핵심에 비교적 가까
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체제의 중심부 또는 준
중심부에서 일상을 영위해야 한다는 전제와, 동시에 그들의 삶이 필연적으로 지
닐 수밖에 없던 식민지적 근대성의 여러 특징들과 그에서 비롯된 긴장들이 동시
에 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된 긴장들은 식민 권력의 기획이 종종 의도대
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을 식민 권력을 관철하
는 수단으로서만 파악할 경우 이런 속성은 간과하기 쉬우나, 이런 점을 주목한다
면 과학기술은 식민 권력이 잘 작동하는 모습 뿐 아니라 오히려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된다. 특히 지질이나 기상 같은 현장 과
학(field science)은 실험실 과학에 비해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식민지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안승택은 일본의 과학자들이 일본의 농법을 조선에 이식하려다가 기대만
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 이유를 일본과 한반도의 미시적인 기후의 차이에
서 찾고자 하고, 특히 비슷한 것으로 인식해 온 장마와 매우(梅雨)의 차이를 집중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58
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당혹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안승택 2010). 미야가와 타쿠야(宮川卓也)도 조선의 기상학을 일본 제국의
기상학의 하위 분야로 편입하려던 일본 과학자들이 그 특수성을 설명하고 포섭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미야가와 2010).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
의 식민지적 기획이 굴절되는 모습은 의학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의학 분야의 식
민지적 기획이 노골적으로 우생학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노
골적인 의도를 담지 않은 다른 과학기술 분야의 기획에 비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
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준영은 혈액형으로 민족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작한 연구가 당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고, 일본측 연
구자들이 어떻게 그에 대응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했다(정준영 2012).
이상과 같이 개항기부터 식민지시기까지의 과학기술사 연구는 그 양과 질
모두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식민지시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혀서, 이 시기를 일면적으로 규정하거나 일부 특징을 과장하여 시대상을 호도하
려는 경향을 지양하고 실증적이고 건전한 논쟁을 북돋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Ⅲ. 1950년대의 과학기술계
한국현대사에서 1950년대는 앞으로는 식민지시기, 해방공간, 한국전쟁 등
의 굵직한 사건과 뒤로는 1960~70년대 개발독재로 현대 한국(남한) 사회의 주
골격이 형성된 시기 사이에 끼어 있다. 하지만 1950년대가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형성하는 데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 박정희 시기의 특
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도 사실은 1950년대에 그 단초가 형성된 것이 있다
는 연구들도 최근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비록 1950년대의 과학기술계에서 눈에 띄는 업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
359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학사도 1950년대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창 가운데 하나다. 1950년대는 한국
전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재편이 일단락된 뒤 재건에 치중하며 다음 시기의 발
전을 준비하던 시기다. 물론 다른 분야도 이와 같은 재건 작업에 분주했지만, 과
학기술계를 살펴보는 것이 유독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에는 의미있는 크기의 과학
기술자 공동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몇 안 되는 논자들이 이
전 세대의 제약이 없이 과학기술계의 앞날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능했다.
이들의 구상 중 어떤 것들은 실제로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계의 발전 방안에
반영되기도 했다(김태호 2013b). 둘째, 과학기술계는 응용과 기초의 불균형 등
몇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분
야 중 하나다. 즉 1950년대와 다음 시기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
이기도 하다. 따라서 1950년대의 과학기술계는 이후 권위주의 고도성장기에 과
학기술계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시기다. 홍성주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했으나, 결국 관료 집단에게 정
책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홍성주 2010). 이 과정
에서도 1950년대의 논의들은 앞뒤 시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다 할 과학기술 지원 체계가 없었던 1950년대에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
지로 과학기술도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평화를 위한 원자력
(Atoms for Peace)”이라는 이름 아래 제3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펼친 대규모
원조 사업이 한국의 과학기술계에는 거의 유일한 재원이 되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기초과학 분야가 원자력 사업의 외피를 쓰고 원자력 원조 프로그램에 참여
하게 되었다. 김성준과 존 디모야(John P. DiMoia)의 연구는 원자력 사업의 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 “Triga MK-II”의 도입 사업은 원자력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는 것이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
가 엇갈렸기 때문에 갈등 조정을 위한 많은 시도가 뒤따랐다. 사업의 추진 과정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60
내내 미국측은 이승만 정부가 이 원자로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
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대로 한국측은 이를 이용하여 더 많
은 지원을 얻어내고자 했다. 또한 한국 안에서도 실용적인 성과(특히 국방에 활
용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는 관료 집단과, 연구용 원자로이므로 기초과학 진
흥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성준은 한국 내부의
논쟁 과정과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
으며(김성준 2009), 디모야는 미국 쪽 문서를 폭넓게 활용하여 당시 미국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을 재구성하고 있다(DiMoia 2010).
한편 1950년대 한국인 과학기술자에 의한 과학기술 활동의 주무대는 오히
려 해외였다고도 할 수 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에 많은 인재들
이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귀국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연
구와 교육을 지속했다. 식민지시기에 교토제국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
수까지 되었던 이태규는 그러한 경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서
울대학교 출범 당시 초대 문리대 학장이 되었으나, 국대안 파동의 여파로 한국
을 떠나 미국 유타대학에 정착하였다. 말년에 과학기술원(KIST) 초빙으로 귀국
할 때까지 20여 년동안, 이태규는 유타대학에서 많은 수의 한국인 유학생을 지도
했고 이들은 귀국 후 한국 과학계의 중추를 이루었다. 따라서 현대 한국 과학기
술계를 이해하는 데 이태규와 같이 한국에 있지 않으면서도 한국 과학계에 큰 영
향을 미친 인물들을 빼놓는다면 그 전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이태규에 대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최근의 것으로는 존 디모야가 유타의
문서보관소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추적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DiMoia 2012).
또 김근배는 이태규와 자주 비교되곤 하는 월북 화학공학자 리승기를 다시 한번
같이 다루면서, 세계성과 지역성이라는 키워드로 두 사람의 이력을 재구성하고
자 시도하였다(김근배 2008b). 신미영은 뒷날 유행성출혈열 연구로 큰 명성을
얻은 이호왕의 초기 연구 이력을 분석하면서, 1950년대말 미국유학의 경험과 그
와는 극히 대조적인 한국의 현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절충하려 했는지 보여주
361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었다(신미영 2012).
이밖에 김태호는 과학자들이 기억하는 1950년대 과학기술계의 동향과는 다
소 동떨어져 있으나 당시와 후세 대중들의 인식에는 강하게 남아 있는 주제인 한
글타자기의 개발과 보급을 연구하기도 했다(김태호 2011). 이는 인물이나 제도
가 아니라 특정 과학기술 사물을 중심에 놓은 흔치 않은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접근방식을 택하는 연구들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권위주의 고도성장기(1960~70년대)와 그 이후
고도성장기의 과학기술사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자는 김근배와 문만용을 꼽
을 수 있다. 김근배는 식민지시기에서 출발하여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며 현대 과
학기술사의 다양한 주제들을 발굴해 왔다. 최근에는 박정희 시기의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연구들도 내놓고 있으며(김근배 2010), 그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 과학기술의 특징을 추출하는 이론적 작업에도 뛰어들었다
(김근배 2008a). 문만용은 KIST의 설립과 변천 과정을 연구하여 미국의 기획과
한국의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절충되었는가를 분석했다(문만용 2010b).
그는 이를 한국 정부출연연구소 전반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여
정부가 주도한 1980년대 초반까지의 과학기술 연구 체제를 정리했다(문만용
2008; 문만용 2009). 문만용은 제도사적 접근 외에도 담론 분석을 통해 당대의
과학기술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담화문
과 같은 가장 공식적이고 정제된 담론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일기와
같은 사적이고 여과되지 않은 기록을 통해 그는 과학기술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기대를 살펴보았다(문만용 2012; 문만용 2013).
강한 국가가 주도한 경제 성장이 이 시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시
기 과학기술사를 다룬 연구들도 대부분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62
히 새마을운동과 같은 전국민적 동원체제의 한 요소로 과학기술이 포섭되어 활
용된 것에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영미와 송성수는 각각 “새마을기술봉사
단” 사업과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의 사례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이 새마을운동의
와중에 어떻게 호명되어 동원체제의 일부가 되었는가,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방적인 동원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
신들의 목표를 추구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이영미 2009; 송성수 2008a). 김연
희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촌 전기화사업의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김연희 2011).
동원 그 자체가 아니라 동원과 표리를 이룬 과학기술의 구체적 혁신에 초점
을 맞추면, 농학 또는 임학 분야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동원체제
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작동한 곳이 농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순수과학 분야가 주목할 만한 혁신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데 비
해 응용과학인 농학이나 임학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었
던 때문이기도 하다. 농학에서는 선유정과 김태호가 “통일벼”의 육종과 보급 과
정을 정리하고 그것이 유신독재시대의 동원체제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분석하였다(김태호 2008; 선유정 2008; 김태호 2009). 한국 과학사학계의 규모
를 감안하면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복수의 같은 세대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다
루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활발히 이루
어질 것인지 주시할 만하다. “산림녹화”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임학의 발달에
대해서도 선유정의 연구가 있으며, 문만용도 산림녹화와 식량증산의 두 가지 동
원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선유정 2009; 문만용 2010a). 그리고 문만용과 강미
화는 최형섭과 오원철 등 당대의 과학기술계의 핵심인물을 분석하여 개발독재
시기에 국가의 주도 아래 몇 명의 행정가형 과학기술자를 매개로 하여 과학기술
계가 성장하는 과정을 정리하기도 했다(문만용·강미화 2013).
이밖에 존 디모야는 의료 분야의 동원체제에 주목하여 1960년대 국가 주도
의 가족계획에 대해 연구했고(DiMoia 2008), 전치형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
363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을 살펴봄으로써 도로 건설이라는 기술적 프로젝트가 경제개발의 이미지를 전
파하는 것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Jeon 2010).
이 시기에 비해 아직까지는 양이 적으나, 1980년대 이후의 과학기술에 대한
역사적 접근도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이 동시대로
간주되는 사건을 잘 다루지 않는 것처럼, 과학사에서도 동시대의 사건을 다루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사학자들이 1980년대를
적극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의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 시험을 넘어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을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중후반부터이기 때문이다. 즉 현
재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과학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된 1980년대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송성
수가 이 시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반도체와 포
항제철 등을 사례로 분석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한국 과학기술이 습득의 단계를
넘어 “탈추격”의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송성수 2008b; Song
2011). 문만용은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연구를 1980년대로 연장하여, 과학기
술의 후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차츰 줄어들고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Moon 2011).
분야별로는 의생명과학의 발전을 다루는 연구가 눈에 띈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이 분야의 팽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2007년의 황우석 사태와 같이 생명공학이 대중적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사건들
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두 가지를 따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황우석
사태의 밑바탕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생명과학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집
중적으로 지원했던 역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비정상적으로 보인 황우석 사
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생명과학 진흥
정책에 대해서도 역사학의 메스를 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황우석 사태에 대해
서는 이미 대단히 많은 연구가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접근으로 김훈기와 신향숙의 연구를 소개하겠다(김훈기 2009;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64
신향숙 2013). 그리고 김상현도 황우석 사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그 배경으
로서 박정희 정권 시기의 움직임들을 소개하고 있다(Kim 2014).
다만 1980년대와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과학기술사적 접근은 방법론 측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남기고 있다. 동시대사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분
석의 틀을 역사학이 아니라 정책연구나 기업사 또는 기업가 전기 등 목적을 지
닌 연대기적 서술에서 빌어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탈추
격”과 같은 개념은 혁신연구에서 차용해 온 것인데, 혁신연구는 기본적으로 “혁
신”이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그것에 이르는 방법을 찾는 접근법이다. 반면 역사학
은 특정한 개념이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역사적 연원을 분석하
고 궁극적으로는 해체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는 점에서 대상에 접근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다. 요컨대 “탈추격”이나 “혁신” 같은 목적지향적 개념이 역사학
적 연구 안에 무비판적으로 섞여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동시대 과학기
술사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사학적 개념과 구도가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
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정책연구나 혁신연구를 역사학과 접목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반대로 역사학의 연구방법론과 목적은 정책학이나
혁신연구의 그것과는 다르고, 따라서 역사학이 정책학이나 혁신연구와 구별되
지 않는 목표를 추구할 경우 오랜 시간을 거쳐 정련되어 온 그쪽 분야의 방법론
과 연구 문헌에 비길 수 있는 성과를 내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Ⅴ. 한국 현대 과학사 연구의 향후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특정 주제에 대해 각론으로 깊
이 들어가는 연구들이 눈에 띈다. 이들 연구는 특정한 기관, 제도, 또는 사물의 태
동과 성장 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를 더 깊
게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설이 부정확한 정보나 피상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
365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고 있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들은 과학사 커뮤니
티 뿐 아니라 한국현대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특정한
시기 또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는 연구들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
인다. 분야가 성숙하고 신진연구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
운 현상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신진들이 성장하여 중진이 될 10년 또는 20년 뒤
에는 과연 한국 현대 과학사에 대한 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 여부를 논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과학사라는 분야 자체가 안고 있는
근대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국학”의 일부분이라는 특수성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학으로서 한국과학사를 쓴다면, 민족 또는
국가를 단위로 하여, 과학(누구도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발전시켜야
하는 것)의 발전과 진보를 논한다는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도 나
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이나 발전과 같은 개념을 문제 삼지
않고 당연하게 사용할 경우 이른바 “한강의 기적” 같은 통속적 이야기들을 역사
학적 관점에서 비판할 여지를 스스로 좁혀 버릴 우려가 있다. 최근의 해외 과학
사학계에서는 대체로 민족, 국가, 과학, 이성, 발전, 진보 등의 개념을 모두 역사
적 맥락 안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과학사의
흐름과 한국 과학사의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간극을 좁혀야 국내외의 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이 비로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4. 9. 20 심사시작일: 2014. 9. 20 심사종료일: 2014. 9. 24)
주제어 : 과학사, 한국-20세기, 식민지시기, 박정희 시대, 발전주의
Keywords : history of science, Korea-20th Century, Japanese Occupation era
(1910~1945), Park Chung Hee regime (1962~1979), developmentalism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66
[참고문헌]
■ 국문
구만옥 2010, 「한국 전통과학사 연구: 심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 『역사학보』 207집, 역사학회.
김근배 2008a,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 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집, 역사문제연구소.
_________ 2008b, 「남북의 두 과학자 이태규와 리승기: 세계성과 지역성의 공존 모색」 『역사비평』 82집, 역
사문제연구소.
_________ 2010, 「생태적 약자에 드리운 인간권력의 자취: 박정희시대의 쥐잡기운동」 『사회와역사』 87집, 한
국사회사학회.
김성원 2008,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_________ 2009, 「1950년대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 과정과 과학기술자들의 역할」 『한국과학사학회지』
31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김연희 2006, 「고종 시대 근대 통신망 구축 사업: 전신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_________ 2009, 「개항 이후 해방 이전 시기에 대한 한국기술사 연구 동향」 『한국과학사학회지』 31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_________ 2011, 「농촌 전기공급사업과 새마을운동」 『역사비평』 97집, 역사문제연구소.
김태호 2008, 「신품종 벼 ‘IR667’(통일)과 한국 농학의 신기원」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2호, 한국과학
사학회.
_________ 2009, 「‘통일벼’와 증산체제의 성쇠: 19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과학기술사적 접근」 『역사와현
실』 74집, 한국역사연구회.
_________ 2011, 「‘가장 과학적인 문자’와 근대 기술의 충돌: 초기 기계식 한글타자기 개발 과정의 문제들,
1914~1968」 『한국과학사학회지』 33권 3호, 한국과학사학회.
_________ 2013a, 「‘독학 의학박사’의 자수성가기: 안과의사 공병우(1907~1995)를 통해 살펴 본 일제강점기
의료계의 단면」 『의사학』 22권 3호, 대한의사학회.
_________ 2013b, 「1950년대 한국 과학기술계의 지형도」 『여성문학연구』 29, 한국여성문학학회.
김훈기 2010, 「한국 생명공학정책의 형성과 과학자집단의 정책 활동: 유전공학육성법 제정에서 ‘바이오
367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텍 2000’ 수립까지」 『한국과학사학회지』 32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문만용 2008, 「KIST에서 대덕연구단지까지: 박정희 시대 정부출연연구소의 탄생과 재생산」 『역사비평』
85집, 역사문제연구소.
_________ 2009, 「198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편성: KIST의 KAIST로의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
회지』 31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_________ 2010a, 「이중의 녹색혁명: 박정희 시대 식량증산과 산림녹화」 『전북사학』 36집, 전북대학교사학
회.
_________ 2010b,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KIST의 설립과 변천, 1966~1980』, 서울, 선인.
_________ 2012, 「박정희 시대 담화문을 통해 본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한국과학사학회지』 34권 1호, 한국
과학사학회.
_________ 2013, 「일기로 본 박정희 시대의 ‘농촌 과학화’」 『지역사회연구』 21권 1호, 한국지역사회학회.
문만용·강미화 2013,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 ‘제도 구축자’: 최형섭과 오원철」 『한국과학사학회지』 35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미야가와 타쿠야 2010, 「식민지의 ‘위대한’ 역사와 제국의 위상: 와다 유지(和田雄治)의 조선기상학사 연
구」 『한국과학사학회지』 32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선유정 2008, 「과학이 정치를 만나다: 허문회의 ‘IR667’에서 박정희의 ‘통일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_________ 2009, 「과학공간에서 정치공간으로: 은수원사시나무 개발과 보급」 『한국과학사학회지』 31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_________ 2014, 「일제강점기 현신규의 임학자로의 성장과 그 의미」 『한국인물사연구』 21, 한국인물사연구회.
송성수 2008a, 「‘전(全)국민의 과학화운동’의 출현과 쇠퇴」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_________ 2008b, 「추격에서 선도로: 삼성 반도체의 기술발전 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2호, 한국과
학사학회.
신미영 2012, 「이호왕의 일본뇌염바이러스 연구: ‘새로운’ 연구 환경에 적응하기」 『한국과학사학회지』 34
권 3호, 한국과학사학회.
신향숙 2009, 「1980년대 유전공학육성법의 출현: 과학정치가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피드백」 『한국과학사
학회지』 31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_________ 2013,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언론과 과학계의 유전공학 담론」 『한국과학사학회지』 35권 1호, 한
국과학사학회.
안승택 2010, 「장마와 매우(梅雨) 사이: 기후는 식민지 조선의 농업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한국과학사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68
학회지』 32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이관수 2008, 「한국 과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199집, 역사학회.
이영미 2009, 「1970년대 과학기술의 ‘문화적 동원’: 새마을기술봉사단 사업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 정 2013,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 1910~1945: 조일 연구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이한 근대 식물
학의 형성」,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태희 2009, 「193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위상 변화」 『한국과학사학회지』 31권 1호, 한국과학사
학회.
정준영 2012,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 『의사학』 21권 3호,
대한의사학회.
홍성욱 2012, 「경계를 넘는 과학: 국내 서양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들」 『역사학보』 215집, 역사학회.
홍성주 2010,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형성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등장, 1945~1967」,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영문
DiMoia, John 2008,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Let’s Have the Proper Number of Children
and Raise Them Well!): Family Planning and Nation-Building in South Korea, 1961~1968,”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2, No. 3,
Springer.
DiMoia, John 2010, “Atoms for Sale? Cold War Institution-Building and the South Korean Atomic
Energy Project, 1945~1965,” Technology and Culture, Vol. 51, No. 3, Johns Hopkins Uni-
versity Press.
DiMoia, John 2012, “Transnational Scientific Networks and the Research University: The Making
of a South Korean Community at the University of Utah, 1948–1970,”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6, No. 1, Duke University Press.
Jeon, Chihyung 2010, “A Road to Modernization and Unification: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Highway in South Korea,” Technology and Culture 51, Johns Hopkins Univer-
sity Press.
Kim, Sang-Hyun 2014, “The Politics of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in South Korea:
Contesting National Sociotechnical Imaginaries,” Science as Culture Vol. 23, Issue 3,
369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Taylor and Francis.
Moon, Man Yong 2011, “Technology Gap, Research Institutes, and the Contract Research Sys-
tem: The Rol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한국과학사학회지』
33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Moon, Manyong 2012, “Becoming a Biologist in Colonial Korea: Cultural Nationalism in a Teach-
er-cum-Biologis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6, No. 1, Duke University Press.
Song, Sung Soo 2011,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Korean Steel
Industry: The Case of POSCO,” 『한국과학사학회지』 33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歷 史 學 報 第 2 2 3 輯 ( 2 0 1 4 . 9 )370
[Abstract]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Kim, Tae-Ho
(Hanyang Univ.)
This article reviews the scholarly works on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odern Korea, published from 2008 to 2014. It is remarkable
that a number of young scholars has entered this field by publishing research
on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
cupation era (1910~1945) and the Park Chung Hee regime (1962~1979),
partly in response to the growing number of literature on those periods by
historians in general. Those works are helpful for general readers interested
in those periods, not just historian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at they
meticulously trace the growth of individual scientists and scientific commu-
nity in Korea. It should be noted that, however, there remains a potential
danger that those works could be misread as overlooking or even endorsing
the oppressive systems underlying the growth of scientific enterprise, as they
are rather focusing on local dynamics and tensions than raising direct ques-
tion about the system ― colonial or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m ― itself.
Thus it remains as a challenge what could be asked as a “big question” about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which might change our current un-
derstanding of the topic, from those new case studies.
![Page 1: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jpg)
![Page 2: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2.jpg)
![Page 3: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3.jpg)
![Page 4: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4.jpg)
![Page 5: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5.jpg)
![Page 6: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6.jpg)
![Page 7: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7.jpg)
![Page 8: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8.jpg)
![Page 9: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9.jpg)
![Page 10: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0.jpg)
![Page 11: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1.jpg)
![Page 12: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2.jpg)
![Page 13: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3.jpg)
![Page 14: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4.jpg)
![Page 15: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5.jpg)
![Page 16: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6.jpg)
![Page 17: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7.jpg)
![Page 18: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8.jpg)
![Page 19: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19.jpg)
![Page 20: Recent Trend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Modern Korea [in Korean]](https://reader039.fdokumen.com/reader039/viewer/2023051218/633fc33643efc9b28901d89d/html5/thumbnails/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