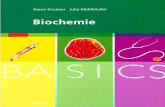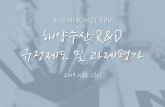독일직업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The Role of the German...
Transcript of 독일직업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The Role of the German...
차 례
제1장 서론 ................................................................................................ 7
1. 연구의 필요성 ............................................................. 7
2. 연구 목적 및 구성 ...................................................... 11
(1) 연구 목적 ......................................................... 11
(2) 연구 방법 및 구성 ................................................ 12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 14
1. 통일 후 경제통합의 진전 ............................................. 14
(1) 1인당 GDP의 수렴 .................................................... 14
(2) 노동생산성의 수렴 .................................................... 19
2. 통일 후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 21
(1) 구동서독 지역 간 노동이동과 고용률 수렴 ........................ 21
(2) 구동서독 지역 간 실업률의 수렴 .................................... 23
(3) 구동서독 지역 간 임금 수준의 수렴 ................................ 25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31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 34
1. 통독 이전 동서독 직업교육훈련제도 ............................... 34
(1) 통독 이전 동서독 교육제도와 직업교육훈련 ....................... 34
(2) 통독 이전 동서독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 39
2. 통일과정에서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변화과정 .................... 41
(1) 동독의 국가-대기업주도형 양성훈련시스템의 붕괴 .............. 43
(2) 독일통일과 서독의 교육훈련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 .......... 47
(3) 1989~1992년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동서 융합과정 ............. 51
3. 동서독 노동시장통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성과 ...... 52
(1) 동서독 직업교육훈련 통합의 방향 .................................. 52
(2) 동서독 직업교육훈련 통합의 기제 .................................. 53
(3) 정책시행의 성과 ...................................................... 59
제4장 실증분석 : 동독지역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 62
1.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 63
(1) 분석자료 ............................................................... 63
(2) 분석모형 ............................................................... 63
(3) 분석자료 개관 ......................................................... 67
2. 도제제도 직업군 정의 ................................................. 70
3. 실증분석 결과 ........................................................... 74
(1) 실증분석 결과 ......................................................... 74
(2) 시사점 .................................................................. 77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 79
1. 요약 및 결론 ............................................................. 79
2. 정책과제 : 한국 통일과 직업훈련제도 개편 ...................... 86
(1) 마이스터고 제도의 정착과 역할 ..................................... 86
(2) 한국 통일과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 ............................... 89
참고문헌 ............................................................................... 95
표 차례
<표 3-1> 동독의 직업학교 수와 훈련생 수의 변화(1949~1988) .................. 44
<표 3-2> 서독지역 양성훈련공급건수와 양성훈련 지원자 수 ...................... 48
<표 3-3> 서독지역 공석인 양성훈련공급건수와 지역별 분포(1988~1990) ...... 49
<표 3-4> 서독지역 산업별 양성훈련공급건수와 훈련 지원자 수(1988~1990) .. 50
<표 3-5> 동독이주민의 경력촉진훈련, 재훈련, 직무숙달훈련 참가(1990) ....... 55
<표 4-1> 독일 임금구조조사 주요 변수의 평균치(전일제 근로자 : 2001년 및 .. 68
2006년)
<표 4-2> 직업별 직업훈련교육 이수자 비율(전일제 근로자, 2001) ............... 72
<표 4-3> 직업별 직업훈련교육 이수자 비율(전일제 근로자, 2006) ............... 73
<표 4-4> 독일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2001) ................................ 76
<표 4-5> 독일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2006) ................................ 76
그림 차례
<그림 2-1> 구동서독 지역별 1인당 GDP(1991~2013) ............................. 15
<그림 2-2> 독일 전체 대비 구동서독 지역 1인당 GDP 비율(1991~2013) ...... 16
<그림 2-3> 구동서독 지역별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1992~2013) ............. 17
<그림 2-4> 독일 GDP의 구동서독 지역별 구성비(1991~2013) ................... 18
<그림 2-5> 구동서독 지역별 제조업 부문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1991~2013) .. 19
<그림 2-6> 독일 전체 대비 구동서독 지역 제조업 부문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 .. 20
비율(1991~2013)
<그림 2-7> 독일에서 피고용자 수(1991~2013) ...................................... 22
<그림 2-8> 독일 전체 피고용자 수에서 구동독 지역 피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 23
비중(1991~2013)
<그림 2-9> 구동서독 지역별 실업률(1991~2013) ................................... 24
<그림 2-10> 동독 지역의 실업구조 추이(1991~1999) .............................. 25
<그림 2-11> 구동서독 지역별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1991~2013) .. 26
<그림 2-12> 독일 전체 대비 구동서독 지역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 .. 27
비율(1991~2013)
<그림 2-13> 구동서독 지역별 서비스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1991~2013) .. 28
<그림 2-14> 독일 전체 대비 구동서독 지역 서비스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 .. 28
비율(1991~2013)
<그림 2-15> 구서독 지역 대비 구동독 지역 산업별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 .. 29
비율(1991~2013)
<그림 3-1> 서독 학교교육의 기본구조 ................................................. 36
<그림 3-2> 1989년 구동독 학교교육의 구조 .......................................... 38
1. 연구의 필요성
○ 독일 통일 및 유럽연합의 경험은 상이한 사회경제체제의 통합에서
상품시장,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은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지만, 노
동시장의 통합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의 조성 없이는 쉽사리 진
행될 수 없음을 보여줌.
- ‘도제제도’로 특징지어지는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서독의 대표적
인 경제사회 모델 중의 하나로,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 전파되어
동독 제도와 융합됨으로써 동서독 경제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
을 하였음(Piotti, 2010).
- 서독의 도제제도 혹은 직업교육훈련제도가 동독에 곧바로 전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통독 이전부터 동서독 양국은 직업학교 이
론교육과 작업장에서의 기술훈련을 병행하는 이원화제도를 유
제1장
서 론
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지하였다는 점임. 동서독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중세 도제제도
부터 나치하에서 형성된 이원화 양성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음.1)
- 도제훈련제도는 중세 도제훈련의 전통이 남아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독일어권 국가들에서 직업훈련제도의 근간으
로 지속되어 왔음(정주연·최희선, 2013).
○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의 경제통합과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 있음.
- 현재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통일 이전 동서독의 경제사회
적 격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태임. 2013년 북한의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7만 9,000원(한국 원화 기준)으로 남
한의 21분의 1 수준임.
- 서독의 도제제도 혹은 직업교육훈련제도가 동독 제도와 곧바로
융합될 수 있었던 것은 통독 이전부터 동서독 양국은 직업학교 이
론교육과 작업장에서의 기술훈련을 병행하는 이원화제도를 유
지하였기 때문임.
- 독일의 경우 노동시장 통합의 주요 기제의 하나로 작용한 직업교
육훈련제도 통합이 1990년 통일협약에 명기되어 적용되었는데,
이것은 중세에 기원을 두고 나치하에 완성된 이원화 직업교육훈
련제도가 동서독 공히 유지되었고, 기술인력 양성의 질적 차이가
1) 본 연구에서 도제제도는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역사적 전통을 고려한 용어이며, 직업교육
훈련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함.
제1장 서론 9
크지 않았다는 데에 기초함.
- 한국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 정치통합이 급진적으로 진전되는
경우에도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북한 경제를 한
시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등 독일
의 통일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전홍택 편,
2012).
○ 하지만 한반도에서, 통일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품시장,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통합은 물론 노동시장 통합이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임.
- 교육훈련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구축 없이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진행될 경
우, 대량 실업과 이주 사태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사회경제
시스템의 통합 자체가 지연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가 통일 독일의 경제통합 혹은
노동시장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가설을 설정
- 제3장에서 독일 통일의 경제통합 혹은 노동시장 통합의 기제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급진적인 동질화 과정을 살펴보고, 제4장에
서 통일 후 동독지역의 이른바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위의 가설을 입증함.
1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우선 제3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급진적 동질화 과정을 주
목함. 1990년 통일협약에 따라 동독의 이원화 양성제도하의 자
격증을 통일과 함께 그대로 인정하고, 또한 동독에 전파된 서독
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1994년경에 이미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었음.
- 또한 제4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동독지역의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를 분석함. 2000년대 이후에도 발견되는 동독지역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가 동서
독 노동시장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
- 이것은 한국 통일과정에서도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중 직업교육훈련제
도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통일 한국의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제도
의 정착 및 확산을 제안함.
- 조합주의(corporatism)의 영향을 받은 구서독과는 달리 구동독은
국가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 독일 도제제도의
전통은 유지되었지만 직업학교의 운영에는 국가의 개입이 두드
러졌음.
- 마이스터고 제도에 대한 국가 개입이 크다는 관점에서 구동독의
직업훈련제도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사회주
제1장 서론 11
의인 북한과의 통일과정에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연구 목적 및 구성
(1) 연구 목적
○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 전파된 대표적인 서독 경제사회 모델로서
서독의 도제제도 혹은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급진적 동질화 과정을
연구하고,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노동시장 통합에의 성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동서독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급진적 융합 및 정착으로 동 제도는
독일의 노동시장 통합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임.
- 현재 EU는 과거 구 동유럽 지역의 폭발적인 이민 압력에 직면하
여, 외국인 인력정책 입안 및 추진에 있어 통일 독일의 노동시장
통합과정의 경험을 참고하고 있음.
○ 독일 도제제도의 요소를 도입한 한국의 마이스터고 제도가 확산
되어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근간으로 정착한다면, 이것은 통일 이후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마이스터고 제도는 전문기능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다만, 마이스터고 제
도는 현재 엘리트 특성화고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극히 일부라는
1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점이 제한적임.
-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은 통일 이후 북한 노동력의 숙련 향상을
통한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경제사회 제도로
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 연구 방법 및 구성
○ 본 연구는 ‘독일 도제제도가 통일 독일 노동시장 통합에 일정한 역
할을 하였다’는 가설을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함.
-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지표는 1인당 GDP, 임금, 생산성,
실업률 등의 지표를 사용함. 동서독 지역 간 동일 숙련에 대한 임
금격차 혹은 생산성의 격차가 작을 경우 동서독 지역 노동시장 통
합이 진전된 것으로 간주함.
○ 제2장은 통일 이후 독일경제 주요 지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통일
독일의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과정을 살펴봄.
○ 제3장 문헌연구에서는 독일 통일 전후의 직업교육훈련의 제도와
실태를 분석하고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제도 융합과정, 이를 위한
정책 및 성과 등을 분석함.
○ 제4장 실증분석에서는 독일 임금구조조사 2001년 및 2006년 자료
를 이용하여 동독지역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를 추정함.
추정방법은 이중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사용하
1. 통일 후 경제통합의 진전
(1) 1인당 GDP의 수렴
○ 경제통합은 두 지역 이상이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생산패턴을
성취함을 의미함(Burda and Hunt, 2001).
- 1인당 GDP의 큰 격차, 임금 등 요소가격의 큰 격차는 불완전한 경
제 통합의 증거로 제시됨.
- 본 연구에서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의 지표로는 1인당 GDP, 실업
률, 노동생산성, 임금수준 등을 사용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지표
추이를 통하여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의 추이를 개관함.
- 노동시장 통합은 제도 수렴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제3장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15
에서 그 일부로 구동서독 직업훈련제도의 수렴과정을 분석함.
○ 통일 후 독일에서 경제통합의 진전은 구동서독 지역별 1인당 GDP,
구동서독 지역별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 GDP의 구동서독 지역
별 구성비 등의 수렴에서 확인됨.
- <그림 2-1>, <그림 2-2>에서 보듯이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1991년 7,218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의 1인당 GDP 2만 1,852
유로의 33.3%에 불과했지만, 통일 직후 7년간 급증하여, 1997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1만 5,458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
역의 1인당 GDP 2만 4,951유로의 62%까지 접근하였음.
- <그림 2-1>, <그림 2-2>에서 보듯이, 통일 직후 1997년까지 급진
전된 1인당 GDP에서 구동독 지역의 구서독 지역 접근 혹은 수렴
은 1998년 이후에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 2013년 구동독 지
<그림 2-1> 구동서독 지역별 1인당 GDP(1991~2013)
5,000
10,000
0
15,000
20,000
40,000(유로)
35,000
25,000
30,00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 독일구서독
자료 :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주 : 베를린은 구서독 지역에 포함.
1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역의 1인당 GDP는 2만 3,585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의 1인
당 GDP 3만 5,147유로의 67.1%였음.
○ 통일 독일에서 구동서독 지역의 경제통합 및 수렴은 구동서독 지
역별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수렴에서도 확인됨.
- <그림 2-3>에서 보듯이 통일 직후인 1992년 구동독 지역의 GDP
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6.8%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의 GDP의 전
년대비 증가율 6.0%보다 20.8%포인트 높았음.
- 이 격차는 통일 직후 약 7년간 급격히 수렴하여, 1997년 양 지역
의 1인당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모두 2.0%로 동일해졌으며,
그 후 현재까지 양 지역의 1인당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거
의 동일했음.
- 2013년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그림 2-2> 독일 전체 대비 구동서독 지역 1인당 GDP 비율(1991~2013)
(독일 전체=100)
20
40
0
60
80
120
100
구동독구서독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자료 :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17
각각 2.3%, 2.7%였음.
- 1991년 통일 후 1997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GDP의 급증은 <그림
2-4>에서 보듯이 구동서독 지역별 GDP 구성비의 추이에서도 확
인됨.
- 즉, 독일의 GDP 총액에서 구동독 지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은 1991년 6.9%에서 1997년 11.4%까지 급증한 후 2013년까지 같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3년 독일의 GDP 총액에서 구동독
지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1.0%였음.
○ 독일의 GDP 관련 지표들은 1991년 통일 후 독일에서 동서 간 경
제통합 및 수렴이 7년(1991~1997)이라는, 상당히 단기간에 급진전
되었음을 보여줌.
<그림 2-3> 구동서독 지역별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1992~2013)
-5
0
-10
5
15
10
30(%)
25
20
1992 1994 1996 2000 2004 20081998 2002 2006 2010 2012
구동독 독일구서독
자료 :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1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특히 구동서독 지역별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 즉 지역별 경제성
장률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거의 동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임.
- 통일 독일 후 경제통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서 간 지역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2013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가 구서독 지역
의 67.1%에 불과했음.
- 하지만 독일의 경우 1인당 GDP의 구동서독 지역 간 격차가 유
지되면서도 더 이상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 점, 즉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위기 이후에도 구동서독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았던 점은 유의되어야 함.
<그림 2-4> 독일 GDP의 구동서독 지역별 구성비(1991~2013)
84
88
86
82
90
92
100
98
94
96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서독구동독
(%)
자료 :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19
(2) 노동생산성의 수렴
○ 통일 후 독일에서 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라 구동독 지역의 노동생
산성은 급속하게 구서독 지역의 수준에 접근했음.
- 우선 노동생산성 격차 축소는 구동서독 지역별 제조업 부문 피고
용자 1인당 부가가치의 수렴에서 확인됨.
- <그림 2-5>, <그림 2-6>에서 보듯이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 부문 피
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는 1991년 1만 2,608유로로 같은 해 구서
독 지역의 제조업 부문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 4만 1,781유로
의 30.2%에 불과했지만, 통일 직후 4년간 급증하여, 1994년 구동
독 지역은 2만 7,218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의 4만 5,999유로
의 59.2%까지 추격했으며, 그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구
<그림 2-5> 구동서독 지역별 제조업 부문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1991~2013)
10,000
20,000
0
30,000
40,000
80,000
70,000
50,000
60,00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 독일구서독
(유로)
자료 :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2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동독 지역은 4만 6,475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의 6만 427유
로의 76.7%까지 접근했음.
- 통일 직후 4년(1991~1994) 동안 구동독 지역 제조업 부문의 1인
당 부가가치가 무려 2배나 급증한 것은 인상적임. 이에는 통일 직
후 구서독 지역에서 구동독 지역으로의 노동력 유출도 부분적으
로 기여했음.
○ 노동생산성의 수렴 속도는 독일 경제통합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이
슈 중의 하나임.
-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통독 당시 서독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통
독 10년 이후까지도 낮은 수준이었는데,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
고 있음.
<그림 2-6> 독일 전체 대비 구동서독 지역 제조업 부문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 비율(1991~2013)
40
60
20
80
120
10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구서독
(유로)
자료 :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주 : 베를린은 구서독 지역에 포함.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21
- 동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물적 자본의 양이 적은 결과일 수 있으
며, 인적 자본의 질도 낮을 수 있음. 동독의 노동자들은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낮았지만,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은 서독에 비해 높
았음. 단, 동독에서의 협조적 작업환경은 새로운 생산기술을 빠
르게 도입하여, 동독 노동자들은 1990년 제조업에 도입된 팀 기
반 생산체제에 쉽게 적응하였음(Burda and Hunt, 2001).
○ 1995년 이후 생산성 수렴 속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은 이 시기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이 급속히 낮아지고, 1996년부터는 동독지역의 실
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임.
- 경제성장 속도가 급감하면서 노동퇴장(labor hoarding)이 많아졌
으며, 또한 1990년대 중반 동독지역 도로, 교량, 대학, 병원, 경찰
서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노동생산
성 수렴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었음.
2. 통일 후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 구동서독 지역 간 노동이동과 고용률 수렴
○ 노동이동에 따른 구동독 지역의 피고용자 수 감소는 <그림 2-7>에
나타나 있음.
- 구동독 지역의 피고용자 수는 1991년 통일 후 3년간은 구조전환
의 과도기에 구동독 노동력의 구서독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인
2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해 1991년 643만 명에서 1993년 557만 명으로 감소했음.
- 1994년 이후 동서 간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구동독 지역의 고용
감소는 1999년까지는 진정되었지만, 2000년부터 다시 반전되어
2005년 497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13년 516만 명까지 증가
- 반면, 구서독 지역의 피고용자 수는 통일 직후 과도기에 1991년
2,871만 명에서 1997년 2,832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1998년
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13년 3,220만 명을 기록했음.
- 이에 따라 <그림 2-8>에서 보듯이 구동독 지역의 피고용자 수가
독일 전체 피고용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8.3%에서
2013년 13.8%로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2-7> 독일에서 피고용자 수(1991~2013)
27,000
28,000
29,000
26,000
31,000
30,000
33,000
32,000
1,000
2,000
3,000
0
5,000
4,000
7,000
6,00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구서독
(천명) (천명)
자료 : Arbeitnehmerentgelt, Bruttolöhne und-gehälter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주 : 1) 베를린은 구서독 지역에 포함. 주 : 2) 왼쪽 축 눈금은 구서독 지역의 피고용자 수, 오른쪽 축 눈금은 구동독 지역의 피고용자
수를 가리킴.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23
(2) 구동서독 지역 간 실업률의 수렴
○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1991년 통일 후 7년간은 구조전환기에 급
증했으나 1997년 이후 동서 간 경제통합이 완료되면서 실업률 상
승추세 진정
- <그림 2-9>에서 보듯이,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1991년 통일 후
7년간은 구조전환의 과도기 조건에서 1991년 10.2%에서 1997년
19.1%로 급증했음. 하지만 1997년 이후 동서 간 경제통합이 완료
되면서 구동독 지역 실업률의 상승은 진정되어 2005년까지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3
년 11.6%로 낮아졌음.
- 이에 따라 구동서독 지역 간 실업률 격차도 1991년 4%포인트에
서 2003년 10.8%까지는 확대되었다가 2004년 이후 축소되기 시
<그림 2-8> 독일 전체 피고용자 수에서 구동독 지역 피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1991~2013)
12
14
16
10
18
2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자료 : Arbeitnehmerentgelt, Bruttolöhne und-gehälter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24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작하여 2013년에는 4.9%로 좁혀졌음.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0년 유로존 위기 이후에도 독일 전체의 실업률이 감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동서독 지역 간 실업률 격차도 축소되
고 있는 점은 주목됨.
- 통일 후 구동서독 지역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에 따른 실업률 격차
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11.6%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 실업률 6.7%보다 1.73배나 높았음.
○ 실업률 격차 축소가 쉽지 않음은 독일에서 노동시장 통합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시사함.
○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실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통일 초기에는 파트타임 등 단기간 근로의 비중이 높은 반면, 1990
년대 중반 이후에는 등록된 실업자의 숫자가 증가하였음.
<그림 2-9> 구동서독 지역별 실업률(1991~2013)
5
10
15
0
20
25(%)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 독일구서독
자료 :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Arbeitslosigkeit im Zeitverlauf, 2014.5.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25
- <그림 2-10>을 보면, 독일은 통일 직후 해고보다는 파트타임 등
을 통하여 과잉노동력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하
여, 통일 직후에는 파트타임 형태의 잠재실업자의 비중이 높았음.
- 통일 직후에는 교육훈련프로그램 등록 비중이 높았으나, 교육훈
련프로그램 등록 비중은 통일 2~3년 이후부터 급속히 감소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등록된 실업자의 숫자가 증가하였음.
(3) 구동서독 지역 간 임금 수준의 수렴
○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은 노동시장의 통합을 수반했음. 통일 독
일에서 노동시장의 통합은 구동서독 지역별 제조업 피고용자 1인
당 연간 보수, 구동서독 지역별 실업률의 격차 축소에서 확인됨.
- <그림 2-11>, <그림 2-12>에서 보듯이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연
<그림 2-10> 동독 지역의 실업구조 추이(1991~1999)
500
1,000
1,500
0
2,000
3,000
2,500
(천명)
1991/Ⅰ 1992/Ⅱ 1993/Ⅲ 1998/Ⅲ1996/Ⅰ1994/Ⅰ 1997/Ⅱ 1999/Ⅰ
등록된 실업자 고용창출프로그램 참가자 직업훈련등록자
단기간 근로자 수를 전일제 근로자 수로 전환한 숫자
자료 : Bonin and Zimmermann(2000).
2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간 보수는 1991년 구동독 지역에서는 1만 3,069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 3만 155유로의 43.3%에 불과했지만, 통일 직후 5년
간 급증하여, 1995년 2만 4,032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 3만
6,202유로의 66.4%까지 접근하였음.
- <그림 2-11>, <그림 2-12>에서 보듯이, 통일 직후 1995년까지 급
진전된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에서 구동독 지역의 구
서독 지역 접근 혹은 수렴은 1996년 이후에는 중단되었음.
- 그러나 구동서독 지역 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지는 않았음.
2013년에도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는
3만 3,839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 5만 507유로의 67%였음.
○ 구동서독 지역 간 임금수준의 수렴은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진전
되었음.
<그림 2-11> 구동서독 지역별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1991~2013)
10,000
20,000
0
30,000
40,000
60,000
50,00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 독일구서독
(유로)
자료 : Arbeitnehmerentgelt, Bruttolöhne und-gehälter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27
- <그림 2-13>, <그림 2-14>에서 보듯이, 서비스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는 1991년 구동독 지역에서는 1만 3,473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의 2만 5,060유로의 53.8%에 불과했지만, 통일 직후 6
년간 급증하여, 1996년 2만 2,274유로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 2만
9,064유로의 76.6%까지 접근하였음.
- 또 <그림 2-13>, <그림 2-14>, <그림 2-15>에서 보듯이, 제조업 부
문과 달리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통일 직후 1996년까지 급진전된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에서 구동독 지역의 구서독 지역 접근
혹은 수렴은 1997년 이후에도 완만하지만 계속 진전되어 2013년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는 2만 9,268유로
로 같은 해 구서독 지역 3만 5,276유로의 83%까지 접근했음.
- 하지만 <그림 2-15>에서 보듯이 통일 직후 시기인 1991~1994년
<그림 2-12> 독일 전체 대비 구동서독 지역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 비율(1991~2013)
(독일 전체=100)
20
40
0
60
80
120
10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구서독
자료 : Arbeitnehmerentgelt, Bruttolöhne und-gehälter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2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에서 구동독 지역의 구서독 지역 접근
혹은 수렴 속도가 제조업 부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빨랐음.
<그림 2-13> 구동서독 지역별 서비스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1991~2013)
5,000
10,000
0
15,000
20,000
40,000
35,000
30,000
25,00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 독일구서독
(유로)
자료 : Arbeitnehmerentgelt, Bruttolöhne und-gehälter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그림 2-14> 독일 전체 대비 구동서독 지역 서비스업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 비율(1991~2013)
(독일 전체=100)
20
40
0
60
80
120
10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구동독구서독
자료 : Arbeitnehmerentgelt, Bruttolöhne und -gehälter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29
- 즉 구서독 지역 대비 구동독 지역의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 비
율은 제조업 부문의 경우 1991년 43%에서 1994년 66%로 증가하
여 격차가 22%포인트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1991년
54%에서 1994년 73%로 증가하여 격차를 19% 줄이는 데 그쳤음.
- 통일 직후 구동서독 지역 간 임금 수준의 수렴이 제조업 부문에
서 더 신속했던 것은, 후술되듯이 통일 전부터 구동서독 지역 제
조업 부문에 공히 존재했던 도제제도의 영향, 통일 후 구동독 지
역에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노동조합 효과 등
제도적 요인들과 관련 있음.
○ 서독의 노동조합 제도의 구동독 지역 확산이 임금을 신속히 올린 측
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그림 2-15> 구서독 지역 대비 구동독 지역 산업별 피고용자 1인당 연간 보수 비율(1991~2013)
40
50
30
60
70
90(%)
80
1991 1993 1995 1999 2003 20071997 2001 2005 2009 20132011
제조업서비스업
자료 : Arbeitnehmerentgelt, Bruttolöhne und-gehälter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3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서독의 노사관계 제도는 동독 지역 근로자의 임금을 급속히 높였
음(Burda and Hunt, 2001).
-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임금상승은 동독 지역에 급속히 확산
된 서독의 노동조합의 영향도 컸음.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임
금상승이 이미 1990년 통일 직후 정해진 경우도 있음.
- 서독의 노동조합은 1990년부터 동독지역에 확산되어 구동독의
공산주의 노동조합을 대체했음. 서독의 노사관계제도가 이식되
었으며, 새로운 서독 스타일의 노동조합이 산업별로 임금교섭을
시작하였음.
- 당시에는 동독지역의 기업이 아직 사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
동조합의 교섭상대자는 아직 해고되지 않은 기존의 기업 관리자
인 경우가 많았음. 이들이 노동조합과 야합하여 임금을 높였다
는 주장도 많음. 그러나 서구적 복지 및 사회보장의 측면에서도
임금상승이 이루어졌음. 어쨌든 일부 산업, 예를 들어 금속산업
에 있어서는 1994년 임금수준이 서독수준에 도달한 경우도 있음.
- 동독지역 임금상승은 서독 노동자들의 관점에서는 동독지역의
생산비를 높임으로써 동독 근로자와의 경쟁을 낮추고 서독지역
으로의 이민을 낮추는 이점도 있었음.
- 그러나 1993년에는 ‘고용주들의 반란’이 시작되어 임금 상승이
억제되기 시작했음. 이후 노동조합은 협상력이 약화되어, 일부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31
기업들은 교섭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또 일부 기업은 노동자와 타협한 임금수준을 지키지
않기 위해 사용자 단체를 탈퇴하였고, 신생기업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음.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독일 통일 전후의 시기는 상이한 사회경제체제 통합에서 오는 충
격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글로벌화의 급진전에 따른 충격이 확산
되는 시기로, 계획경제하의 동독 노동시장에는 서독의 시장경제모
델, 상대적 가격, 글로벌 경쟁 등이 한꺼번에 쇼크로 닥쳐옴(Burda
and Hunt, 2001).
○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시행되었던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동 정책에 영향을 받는 노동력의 비율, 동 정
책에 지출된 비용 등의 측면에서 경제,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의 관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는 (단기)직업훈련(training), 단시간근로
(STW, short time work), 고용창출프로그램(ABM, Arbeitsbeschaf-
fungsmassnahmen), 조기퇴직 등이 포함되며, 노동청에서 노동자
혹은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 교육훈련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하며,
특히 동독이 시장경제로 전환될 때 직업훈련은 매우 중요한 것
3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으로 생각되었음. 독일정부는 직업훈련을 유용하다고 간주했고,
특히 동독 지역 직업훈련의 인센티브를 매우 강화시켰는데, 특히
통독 직후에는 직접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적인 곤경을 피
하는 데 사용되었음.
○ 통독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직업훈련의 성격
은 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음(Eichler and
Lechner, 1996).
- 통독 직후 동독지역에 시행된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
한 교육훈련, 직업적인 자격을 완성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혹은
직접적인 실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이었으며, 경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은 거의 지원되지 않았음.
- 통독 직후 동독 지역 대부분의 교육훈련자는 서비스 산업의 종사
자였고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서비스 산업에 취업했음.
서비스 산업 출신 교육훈련자는 1992년 47%, 1993년 48%, 1994
년 53%이었고, 서비스 산업에 취업한 교육훈련자는 각각 59%,
52%, 55%임.
- 제조업의 경우에는 1992년 38%가 제조업 종사자였으며 교육훈
련 이후 제조업에 취업한 사람은 28%임. 기술 관련 직종을 위한
훈련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음. 1992년의 경우 8%가 과거 기술훈
련 직종이었고 훈련 후 기술 관련 직종에 취업한 사람은 6% 정
도임.
제2장 통일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진전, 1991~2013년 33
- 제조 부문과 기술 관련 직종으로부터의 순유출과 서비스업종으
로의 순유입은 동독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함.
또한 제조업과 기술 관련 직종에서는 단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시사함.
○ 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하며, 1994년 이
후에는 서독의 직업교육훈련제도가 동독지역에도 안착하여 이원
화 양성제도하에서 인력이 양성됨.
- 통독 직후 1991년의 경우에는 대체로 고용되지 않은 모든 인력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1994년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상 인력의 수는 130만 명, 실업자의 수는
110만 명,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비경제활동인구 140만 명 등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인력의 수가 급격히 감
소하였음.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2-1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독일 통일 이후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전개과정은 동 정책이
노동시장 통합에 단기적인 효과는 내지만 그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음을 시사함. 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노동시장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임.
1. 통독 이전 동서독 직업교육훈련제도
(1) 통독 이전 동서독 교육제도와 직업교육훈련
○ 독일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조기에 시작되는 직업교육임.2)
- 서독의 청소년들은 4년 또는 연방주에 따라 6년에 걸친 초등교육
이후 인문학교(Gymnasium)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실업학
교인 보통학교(Hauptschule)나 실업학교(Realschule)에 진학할 것
인지 결정하고 보통학교나 실업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은 5학년
또는 7학년부터 실업교육을 받음.
- 동독의 경우 초등과정부터 중등과정까지 전체 의무교육과정이
2) 본 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을 지칭하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의 용어
도 사용함.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35
10년제 폴리테크 상급학교(Politechnische Oberschule, 종합기술
상급학교)에서 실시됨. 즉 전체 의무교육이 실업교육으로, 교육
의 목표는 전인적 실업교육임.3)
□ 서독의 직업교육
○ 서독의 직업교육은 제1차 영역교육(Primarbereich)인 초등학교(Gr-
undschule) 교육이 종료되면 시작됨.
- 초등학교(Grundschule) 교육은 만 6세에 시작하여 연방주의 교
육정책에 따라 9세에 종료되기도 하고 11세까지 연장되기도 함.
9세에 초등교육을 종료하는 경우 10~11세 5~6학년 과정의 학생
들은 진학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지도단계(Orientierungstufe)를
거침.
○ 제2차 영역 1단계(Sekundarbereich 1)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유형은
단기 실업학교에 해당되는 보통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
alschule), 인문학교(Gymnasium), 그리고 종합학교(Gesamtschule)
로 구분됨.
- 종합학교는 실업교육과 인문교육을 병행하는 중학교 교육과정
임(주독일대사관, 2013). 2011, 2012학기 중등학교 학생 중 1/3
이 인문학교, 1/3이 실업학교, 1/3이 종합학교 또는 보통학교에
재학함.
3) www.bundesregierung.de/Content/DE/Magazine/MagazinSozialesFamilieBildung/080/s-c-
berufsbildung-ost-und- west.html
3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5학년(또는 7학년)에 시작하여 인문학교 상급과정(Gymnasiale
Oberstufe)을 포함하여 12학년(또는 13학년)에 종료되는 인문학
교(Gynasium)교육은 심층적인 인문교육을 목표로 함. 졸업 후 대
<그림 3-1> 서독 학교교육의 기본구조
학년
향상 훈련
나이
교육영역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 또는 직무 관련
향상훈련)
제3차 영역/
향상훈련
직업자격취득과정 종료
일반대학입학자격 종합대학/공과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공무원대학예술대학일반 및 산업대학
전문학교야간인문학교/
(대입준비)칼리지
19 료종 정과득취격자업직
13 중급직업자격취득과정 졸업 산업대학입학자격
9년 또는 10년간 보통학교졸업/실업학교졸업
인문학교 상급과정 (인문학교, 직업인문학교/
전문인문학교)
18 제2차 영역 2단계
12 직업학교와
기업체양성훈련(이원화제도)
(기능인)학력향상
1년제 학교
직업전문학교 전문상급학교17
11 16
1년제 직업기초교육학교또는 산학협력
1015
10 10학년과정
실업학교 인문학교 종합학교
16제2차 영역 1단계
159특수학교 보통학교 148
137
126 지도기간(학교형태 독립적 또는
학교형태 의존적)
11 5
10
94
특수학교 초등학교
제 1차 영역
3 8
2 7
1 6
5
특수
유치원유치원
기초 영역
4
3
직업자격취득 대학교육 종료
일반대학입학자격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1992).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37
입시험(Abitur)에 합격하면 대학입학자격(Hochschulreife)이 주어
짐. 전체 중등교육 상급과정(한국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중 대
학진학률은 2012년 해당 연도 대학입학학령 학생의 40%였음.
○ 제2차 영역 2단계(Sekundarbereich 2) 고등학교 교육기관의 중심은
해당 연령층 학생의 70%가 등록하고 있는 이원화직업학교임. 중학
교과정 교육을 마친 학생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이원화직
업훈련을 받으며 기업은 16~17세 훈련지망자 중 유능한 인재와 훈
련계약을 체결함(정주연·최희선, 2013).
□ 동독의 직업교육
○ 동독은 1946년 소련점령 독일지역에 학교교육 민주화법이 제정되
고 그 법에 따라 동독지역 전역에 인문계 실업계 구분이 없는 단일
학제가 도입됨으로써 서독과 다른 단일학제 교육을 시작함.
○ 1959년 동독사회주의 정부는 “학교체계의 사회주의적 개발에 대한
법(Gesetz über die sozialistische Entwicklung des Schulwesens)”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10년제 폴리테크 상급학교(Politechnische
Oberschule)교육을 제도화했음. 10년제 단일학제 의무교육과정은
전인적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임. 동독교육의 중심은 인문
교육이 아닌 실업교육이었음.
○ 폴리테크 상급학교의 생산현장수업은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
며, 국영기업과 농업협동조합은 폴리테크 수업을 개발하고 수행하
는 책임을 담당(Tietze, 2009)
3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도시의 학생들은 대량생산과정에 필요한 기계공학 및 자동화기
술을 주로 배우고 농촌의 학생들은 농업생산, 농업화학, 트랙터
운전, 그리고 수확기운전을 배움. 현장수업은 폴리테크 상급학
교의 핵심요소임.
○ 10년 과정의 폴리테크 상급학교를 졸업하면 전문기술인력이 되
기 위해 기업의 직업학교에서 양성훈련을 받거나 2년제 전문대학
(Fachschulen)에 입학할 수 있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상급학
<그림 3-2> 1989년 구동독 학교교육의 구조
종합대(단과)대학사내아카데미
직업학교
(지역)인민향상훈련기관 대입준비
과정
대입준비병행직업학교
영재학교와영재수업
상급
중급
초급
상급학교의대학준비과정
10년제 일반 종합기술 상급학교(폴리테크 상급학교)
학교입학준비기관 학년나이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전문대학
장애인특수학교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1992).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39
교나 직업학교의 대학입학준비과정에서 대입자격시험을 준비해
야 함(<그림 3-2> 참조).
(2) 통독 이전 동서독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 역사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직업훈련은 중세 도제의 기술인력 양성
방식에 기원을 두고 나치하에 형성된 이원화 양성제도를 유지하면
서 상이한 체제 속에서 제도적으로 상이하게 발전
○ 동독과 서독은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사회경제체
제는 달랐지만 성장지향적 산업사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음.
- 이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표준화를 위한 직업자격제도
의 운영, 평생훈련을 통한 기술력 향상,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대
응하기 위한 노동인력의 전문성과 기술응용력 강화 등 일반적 목
표에서 공통점이 있었음.
□ 동서로 분단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 분단 이후에도 동서독 양국은 직업학교 이론교육과 작업장 기술훈
련을 병행하는 이원화제도를 유지하였음.
- 서독의 경우 직업학교가 주정부 산하에 설치되었고 동독은 서독
과 달리 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직업 훈련생
이 이론학습과 기술훈련을 이원화된 형태로 병행한 훈련시스템
은 유지되었음.
4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또 동독과 마찬가지로 서독도 직업훈련은 표준화 프로그램 속 훈
련계약부터 시작해서 졸업시험(Lehrabschlußprüfung)으로 종료
됨. 양성직업의 훈련과정, 업무, 승진기회 따위가 명시된 직업요
람과 해당 직업에 표준화된 훈련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훈련 지
침에 근거해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또한 2차 대전 이전 업종, 직종, 경력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던 훈련
직업의 수가 분단 이후 동서독 양국 공통으로 대폭 감소되었다는 점
을 다음 공통점으로 들 수 있음(Hegelheimer, 1971).
- 1965년 서독의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는 535개 직업훈련 인정
직업을 제공했음. 그러나 훈련생의 분포를 보면 34개 직업에 70%
의 훈련생이 집중되었고 나머지 500개 직업에 30%가 분산됨.
- 1966년 동독의 직업훈련 인정 직업의 수는 655개인데 그중 약
10%인 65개 직업에 75%의 훈련생이 집중되었고 나머지 25% 훈
련생이 90% 직업에 분산됨.
- 이들 비인기 직종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1인당 훈련비를
상승시켜 교육경제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높았음. 1970년 서독
의 경우 515개 직업, 동독은 305개 직업이 양성직업으로 인정됨.
2012년 통일 독일의 양성직업은 345개로 등록됨.
○ 동서독 직업훈련제도의 차이점은, 다원화 사회인 서독의 경우 서
로 다른 이해집단이 직업훈련의 목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
해 경쟁하는 반면, 동독의 경우 직업훈련의 목표와 내용이 사회주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41
의 교육목표와 인력계획하에 국가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점임.
- 서독의 경우 업종별 단체가 노동시장에 그들의 기술수요에 부응
하는 교육훈련을 공급함으로써 훈련직종이 조정됨.
-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중심축인 대규모 생산공장이
교육훈련을 주도한 반면 서독의 경우 다원화 경제구조 속에서 다
수의 중소상공인과 수공업이 교육훈련의 중심을 이룸.
- 동독 직업훈련의 목표는 전인적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훈
련의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사상교육과 기술이론이 강조되
는 반면, 서독의 직업훈련은 전문기술인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이론과 더불어 실제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데 집중함.
- 이는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치사상의 차이에 근거할 뿐 아니
라 동독의 경우 기계와 장비의 부족과 낙후성으로 훈련과정에 고
급 장비와 기계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고 장비와 기계를 실제로
다루는 실기보다 그 원리를 가르치는 이론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
음(Scheuer et al., 1992).
2. 통일과정에서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변화과정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1990년 3월 급진적 통일을 주장하
던 우파연합이 총선에 승리한 후 1990년 7월 동독은 경제, 사회, 통
화를 통합하고 8월 서독의 기본법을 동독에 확대적용하기로 통일협
4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약을 체결함. 이후 동독은 놀라운 속도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
- 동독의 경제는 노후화된 물적자본, 낮은 생산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품생산으로 통일과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
했음.
- 동독의 대기업과 콤비나트는 분해되고 도산되었으며 그간 실업
을 경험해보지 못한 동독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실업
대란에 휩쓸림.
- 1990년 동독의 총생산은 1989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고 1989
년 대비 1992년의 일자리는 다섯 중 둘이 사라졌음. 통일 독일은
무엇보다 이런 돌발적인 고용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신속한 노동
시장 부양정책이 필요했음.
- 이에 서독정부는 1991년 막대한 규모의 노동시장 부양정책을 폄.
그 개별조치로 먼저 잉여인원을 감축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실업증가율을 완화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된 160만 명에게 단
축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노동력공급을 줄이기 위해 고령노동자
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였음.
- 다른 한편, 실업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업자의 생활을 보
장하고 대량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요소를 잠
재우는 한편 그 사이 안정적으로 노동정책을 펼 시간을 벌었음.
- 단기적으로 일자리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공급조치(Arbeits
beschaffungsmaßnahmen(ABM))를 통해 공공근로를 제공함.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43
- 또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시장의 기술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의 질을 향상하는 훈련을 실시했음.
- 이에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 노동시장직업
연구소(IAB)의 노동시장모니터(IAB-Arbeitsmarktmonitor)의 보
고에 의하면 1994년 말까지 전체 동독주민 중 54%가 한 번 이상
향상훈련조치에 참가했음(Wingens & Sackmann, 2000).
(1) 동독의 국가-대기업주도형 양성훈련시스템의 붕괴
○ 1990년 독일 통일은 구동독의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재
조직을 요구하였음. 무엇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사회적 시장경
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음.
- 이 재조직의 과정은 위로부터는 신탁기관에 의한 국유기업의 사
유화과정이고 아래로부터는 동독, 서독, 외국의 민간투자자가 참
여한 자본주의 기업의 건설과정이었음.
- 통일 당시 동독의 기업은 대기업과 콤비나트가 주를 이루었고 중
소기업은 1970년 3차 국유화조치 이후 매우 미미하게 존재하였
음. 소매상, 숙식업소, 소규모 수공업 정도가 중소 민간기업으로
허락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기관이 위로부터 기존의 대기업과 콤비나
트를 분해, 해산하는 과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아래부터
44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새롭게 중소기업을 건설하는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음(Fritsch &
Michael, 1996).
○ 대기업과 콤비나트 중심의 동독의 기업구조가 해체되자 이들 기업
을 중심으로 직업학교와 사내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던 동독의 교
육훈련시스템이 붕괴되었음(<표 3-1> 참조).
- 이는 기업의 도산과 분해로 훈련기업의 수가 축소된 것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육훈련협력체계가 무너졌기 때문
- 통일 이전 동독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기업연합체인 콤비나
트와 교육훈련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자사의 기술인력양성을 대
기업에 위탁했음.
- 대기업이나 콤비나트의 직업학교 훈련생 중 70% 정도는 중소기
<표 3-1> 동독의 직업학교 수와 훈련생 수의 변화(1949~1988)
직업학교 전체
훈련생* 사내직업학교** 훈련생지자체
직업학교***훈련생
1949 1,270 742,553 509 60,023 641 682,530
1962 1,133 301,900 646 143,300 399 141,300
1967 1,172 468,700 684 229,100 435 215,700
1970 1,108 430,934 702 239,052 349 167,325
1980 977 459,485 726 311,714 251 147,232
1985 963 377,567 719 258,239 244 119,032
1988 955 359,308 717 244,572 238 114,516
주 : 1) * 1949년 수치는 Berufsvollschulen을 포함, 1962~1970년의 수치는 의료직업학교와 중앙 직업학교 및 그곳의 훈련생 수를 포함, 1980~1988년 수치는 의료전문학교의 훈련생 수를 포함.
주 : 2) ** 사내직업학교.주 : 3) *** 지자체직업학교.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45
업 위탁 훈련생이었음(Wehrmeister, 2005).
- 통독과정에서 대규모기업이 해체되고 이후 출현한 중소규모 기
업들은 타사의 훈련생을 위탁받아 양성할 대량훈련 능력이 없어
짐. 이에 따라 다른 기업의 훈련생과 협력계약을 맺어 양성해왔
던 훈련계약이 파기됨.
- 1990년 7월 19일 동독지역에 발효된 직업학교법은 사업장에 운
영하던 직업학교를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함. 그러나 기초지
자체는 재정적인 기초가 취약하여 통일 이후 필요한 양성훈련의
현대화를 추진하지 못하였음. 통일 직후 동독 양성훈련의 공급은
양적으로 부족했고 질적으로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함.
○ 1990년 상급학교 10학년과정을 종료한 11만 7,543명, 상급학교를
8학년에 졸업하거나 8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졸업하는 저학년 졸업
생이 3만 5,409명으로 1989년 1만 9,560명과 비교하여 조기졸업자
의 숫자가 급증하고 양성훈련 수요도 증가했음. 기업의 양성훈련
공급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1990년 8월 말까지 상급학교 졸업생 1만 2,474명이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통독과 체제전환과정에 발생한 훈련기업과 훈련시스템의 붕괴, 그
로 인한 양성훈련시장의 불안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8
월 22일 동독정부는 양성훈련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발표. 1990
년 9월 25일 서독 연방고용청은 고용촉진법에 근거, 전체 3억 마르
4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크의 지원금을 양성훈련준비 및 양성훈련비로 지출할 것을 결의함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1).
- 동독의 노동청(Arbeitsverwaltung)은 훈련지원자를 긴급히 직업
기초교육, 직업준비교육, 직업준비조치 등에 참가하도록 함.
- 상급학교 10년을 마치지 않고 조기에 상급학교를 마치고 양성훈
련을 받고자 하는 훈련지원자는 학교에 재등록하여 폴리테크 상
급학교 10학년 과정을 마치도록 권장함.
·�고학력 훈련생을 선호하는 기업의 훈련생 선발기준 때문에 학
교를 조기에 마치고 양성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
으로 10년제 폴리테크 상급학교의 전 과정을 마친 졸업생에 비
해 훈련계약이 어려움.
- 또 폴리테크 상급학교 10년을 마친 졸업생들에게도 2년간의 상급
학교대학준비과정(Erweiterten Oberschule)에 등록하도록 권장
- 다른 한편, 일부 지원자는 서독지역에서 훈련자리를 찾았음.
- 이러한 긴급한 조치의 성과로 1990년 9월 말 양성훈련계약을 맺
지 못한 졸업생의 수가 3,209명으로 감소(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1)
○ 1990년 동독 양성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또 하나의 문제는 높
은 양성훈련의 중도계약해지였음.
-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도산으로 훈련계약을 종료하지 못하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47
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 1990년 9월 말까지 전
체 1만 8,500건의 훈련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었음. 특히 신규훈련
의 해지가 많아 전체 계약해지 중 총 1만 2,600건이 1990년에 체
결된 훈련계약이었음.
- 계약이 해지된 훈련생들은 다른 훈련기관에 알선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거나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
하면서 학교나 훈련기관으로 재통합되었음.
(2) 독일통일과 서독의 교육훈련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
○ 통독 직전 서독 교육훈련시장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즉
기업의 훈련공급과 훈련생의 공급의 불균형이었음. 이러한 문제는
인구증감과 경기변동으로 발생
-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서독의 교육훈련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1980~1981년간 기업의 훈련공급초과, 1982~1987년 훈
련지원자 공급초과, 그리고 1988~1990년 다시 훈련지원자 공급
부족 현상 때문임.
○ 1998~1990년 통일과정의 서독의 교육훈련(양성훈련) 시장의 실태
는 다음과 같음.
- 당시 기업의 훈련공급은 증가추세에 있었음. 1988년 기업의 훈련
공급은 전년대비 3.7% 증가, 1989년 훈련공급은 전년대비 5.7%
증가, 그리고 1990년은 전년대비 9%가 증가함. 1990년 기업의 훈
4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련공급건수는 65만 3,000건으로 해당 연도 훈련지원자 46만 5,000
명과 비교하여 18만 8,000건이 많아 훈련공급이 40% 초과됨.
- 반면 인구의 감소로 훈련지원자는 감소함. 1980년 중반부터 훈련
지원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8년 전년대비 9.8% 감소
를 정점으로 1990년에는 -3.7%로 감소세가 완화됨. 이는 인구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층 인구감소세와 그 궤를 같이함.
-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석인 훈련공급건수는 1988년 약 6
만 2,000건에서 1989년 8만 5,000건, 1990년 11만 4,000건으로 급
<표 3-2> 서독지역 양성훈련공급건수와 양성훈련 지원자 수
등록된 훈련건수 등록된 훈련지원자 수훈련지원자 100명에 대한 훈련공급건수
전체전년대비 변동률
전체전년대비 변동률
전체전년대비 변동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80 501,970 12.9 459,300 -3.8 109.3 17.3
1981 498,738 -0.6 443,346 -3.5 112.5 2.9
1982 467,525 -6.3 506,265 14.2 92.3 -17.9
1983 458,473 -1.9 602,079 18.9 76.1 -17.5
1984 464,520 1.3 653,802 8.6 71.0 -6.7
1985 480,640 3.5 664,662 1.7 72.3 18.0
1986 511,436 6.4 639,431 -3.8 80.0 10.6
1987 546,382 6.8 591,876 -7.4 92.3 15.4
1988 566,421 3.7 534,170 -9.8 106.0 14.9
1989 598,933 5.7 482,876 -9.6 124.0 17.0
1990 652,543 9.0 464,986 -3.7 140.3 13.1
자료 : 연방고용청, 직업상담통계, 1980~1990년 서독지역 연방고용청에 등록된 수.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49
격히 증가. 이는 각 연도 훈련공급건수의 11%, 14.2%, 17.5%에
해당
- 이 수치는 서독의 훈련생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했음을 보여줌.
1988년 훈련공급건수 10건 중 한 건이 공석이던 것이 1990년에
는 5건 중 한 건이 공석인 상황에 접근하고 있었음(<표 3-2> 참조).
<표 3-3> 서독지역 공석인 양성훈련공급건수와 지역별 분포(1988~1990)
연방주
공석인 양성훈련공급
전체전년대비 변동률
전체 등록된 양성훈련공급건에 대한 비율
1988 1989 1990 1988 1989 1990
건수 비율
슐레스비히-홀슈타인
1,406 1,349 2,535 87.9 5.8 5.6 10.4
함부르크 205 516 985 90.9 1.6 4.5 8.1
니더작센1) 3,248 5,997 9,480 58.1 5.3 9.3 13.0
브레멘2) 114 335 905 170.1 1.5 4.3 11.9
노드라인-베스트팔렌
9,026 11,678 18,562 58.9 6.4 8.0 12.1
헤센 4,930 6,792 8,177 20.4 9.9 13.2 15.2
라인란드-팔츠 3,841 5,230 7,517 43.7 11.9 14.9 19.4
바덴뷔르템 베르크
14,427 19,376 28,682 48.0 15.0 18.8 24.8
바이에른 23,346 31,193 34,801 11.6 19.4 23.3 23.0
자를란트 663 1,040 1,368 31.5 8.0 12.2 14.9
서베를린 756 1,407 861 -38.8 5.4 10.7 6.3
서독지역 61,962 84,913 113,873 34.1 10.9 14.2 17.5
자료 : Bundesanstalt für Arbeit,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statistik(조사일자 9월 30일까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1991), Übersicht 5, 21.
주 : 1) 브레멘 고용청 관할지역을 제외.주 : 2) 니더작센에 속하는 브레멘 고용청 관할 지역 포함.
5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훈련생 부족현상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
- 독일 통일이 훈련시장에 영향을 미친 서베를린 같은 경우 1990
년 훈련지원자의 공급이 급증하여 전년대비 공석인 훈련공급건
수가 39% 감소
- 한편 북부 독일의 경우 공석인 훈련공급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브
레멘주는 170%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88%,
함부르크 91%, 노드라인-베스트팔렌 59%를 기록하여 훈련생 부
<표 3-4> 서독지역 산업별 양성훈련공급건수와 훈련 지원자 수(1988~1990)
직업분야등록된 양성훈련공급건수 등록된 훈련자 수
1988 1989 1990 1988 1989 1990
금속 108,762 117,203 128,257 74,369 68,819 68,083
전기관련직·전기공 38,330 40,256 42,950 38,603 37,066 36,818
섬유, 의류, 가죽직종 11,667 12,558 13,437 12,594 11,218 10,074
식품, 음식관련직 35,931 40,115 43,472 17,458 14,159 12,334
건설, 건설보조 및 목수 54,674 62,924 72,695 32,833 32,316 33,257
그 외 제조업직업 15,492 16,881 18,555 10,861 10,974 11,693
기술직 12,850 13,299 14,193 17,542 17,814 20,460
판매서비스직 114,135 122,427 131,459 111,484 98,354 93,086
운송직 6,326 5,871 6,036 2,273 2,218 2,416
조직 행정 사무직 88,625 81,210 83,575 123,767 110,076 101,550
보건, 체육, 고객서비스, 가사, 청소직
42,124 47,756 54,820 38,820 32,871 30,008
기타 서비스직 22,522 22,845 26,960 36,594 33,735 33,788
기타 14,983 15,588 16,134 16,972 13,256 11,419
전체 566,421 598,933 652,543 534,170 482,876 464,986
자료 : Bundesanstalt für Arbeit,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1991).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51
족의 심각성을 보여줌(<표 3-3> 참조).
(3) 1989~1992년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동서 융합과정
○ 1989년과 1992년 사이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동서융합은 다음과 같
이 진행됨.
- 통일 직후 동독의 대기업과 콤비나트가 분해 또는 도산되면서 대
기업과 콤비나트가 주축이 되어 실행되었던 교육훈련 체제가 무
너짐.
- 양성훈련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양성훈련 지망자의 일부
는 학교로 되돌아가 학업을 연장함.
-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양성훈련지원자는 동독정부의 양성훈련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와 서독 연방고용청의 3억 마르크에 달하
는 양성훈련준비 및 양성훈련지원금으로 각종 양성훈련 조치에
참여
- 동독 노동청은 훈련지원자를 긴급히 직업기초교육, 직업준비교
육, 직업준비조치 등에 참가하도록 함. 독일은 이런 양성훈련 지
원조치를 통해 서독의 기술과 훈련시스템을 동독에 이전함.
- 또 일부 동독출신 훈련지원자는 서독기업에서 훈련을 받음. 지역
적으로는 베를린, 산업별로는 수공업분야에서 이러한 동서융합
현상이 두드러졌음.
5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향상훈련의 융합은 단축근무자와 실업자의 향상훈련, 경력촉진
훈련, 재훈련, 직무숙달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짐. 1991년 90만 명
에 달하는 동독 근로자가 향상훈련을 받음. 이러한 향상훈련이
서독의 기술과 표준을 동독지역 근로자에게 전달
○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독일의 고용촉진법은 직업
훈련을 통해 서독의 기술, 표준, 경험을 동독으로 이전하는 핵심적
인 노동시장 통합기제가 됨.
3. 동서독 노동시장통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성과
(1) 동서독 직업교육훈련 통합의 방향
○ 동서독 경제통합은 동독지역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건설, 정착하고
동독지역 경제가 세계시장 및 유럽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동독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이 서독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국가는 기간시설 및 설비투자, 중소기업의 출현을 위한
각종 촉진정책, 경쟁력 있는 노동인력의 양성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지원함. 서독 연방과 연방주는 이
러한 사업을 위한 독일통일기금으로 1,150억 마르크를 지원하기
로 함(Klodt, 1990).
- 지원금은 기간시설의 건설, 설비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53
창업지원금으로 사용
- 향상훈련에는 민간의 훈련기관 설립지원을 위해 약 8,000만 마르
크를 통일기금에서 배정
○ 서독은 이러한 막대한 공적투자와 민간투자,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직업
훈련지원책을 수립
○ 1차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독지역에 경쟁력 있는 직업훈
련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참여하기로 결
정함.
○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국가에서 직업훈련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
이 아니라 산업업종단체, 노사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국가
의 지원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을 명시
○ 동독지역의 경제가 사회적 시장주의의 질서를 감당할 능력이 되면
국가는 직업능력의 양성 및 향상제도에 대한 개입을 줄이기로 함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1).
(2) 동서독 직업교육훈련 통합의 기제
○ 통일과정에서 동서독정부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동서통합의 원
칙을 통일협약에 명시함. 통일협약은 동독지역의 직업교육훈련 촉
진정책을 서독의 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기로 함.
54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통일협약
○ 1990년 체결된 통일협약 37조 1항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동서 통
합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 “독일민주공화국[역자, 동독]에서 취득한, 또는 국가적으로 인정
한 학교, 직업, 학문과 관련해 발급한 졸업증과 자격증은 [통일협
약] 3조에 일컫는 지역[구동독지역]에 그 효력을 지속함. 제3조에
서 일컫는 지역과 서베를린을 포함한 다른 독일 연방주에서 통과
한 [각종 시험의] 합격증 또는 자격증은 그것의 가치가 동일할 경우
동일하게 취급되며 동일한 권리를 부여함.”(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schutz, 2014)
○ 이를 통해 동독의 이원화 직업학교에서 획득한 직업의 자격은 서독
에서 유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제가 마련됨.
- 이렇게 통일협약이 동서독 직업학교제도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동서독 상이한 사회체제 속에서
양성된 직업능력이 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았음. 동서독 동일하게
명시된 직업의 경우에도 훈련과정이 상이할 경우 양성된 노동력
이 갖춘 지식과 숙련은 동일하지 않음(Gewände, 1990).
- 이를 위해 독일 연방고용청은 통일독일 노동시장의 직업자격,
직업능력, 노동의 질을 향상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대규모 훈련조
치, 노동의질 향상을 위한 질적 조치(Qualifizierungsmaßnahmen)
를 취함.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55
□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 조치(Qualifizierungsmaßnahmen)
○ 동서독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질적 조치는 사내에서 실시되는 직
무훈련에 기초하고 있음.
- 동서독 노동시장의 직업자격, 직업능력, 노동의 질을 향상하고 통
합하기 위한 질적 조치의 입안은 1990년 1월~5월 서독이주 동독
주민 약 3만 2,000명의 서독 노동시장 적응력을 조사 분석한 자
료에 기초하고 있음.
- 당시 연방고용청은 해당 동독이주민을 대상으로 노동의 질 향상
을 위한 질적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
- 그 결과, 해당 조치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의 서독이주 동독주민은
사내에서 실시되는 직무숙달훈련으로 서독지역의 새 직장에 직
무에 적응할 수 있었음. 그리고 전체 참가자의 3.5%인 1,122명만
재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했음.
<표 3-5> 동독이주민의 경력촉진훈련, 재훈련, 직무숙달훈련 참가(1990)
전체 이주민
절대치 백분율 절대치 백분율
참여건수 전체 235,000 100.0 32,017 100.0
경력촉진훈련 180,000 76.6 13,352 41.7
재훈련 22,000 9.4 1,122 3.5
직무숙달훈련 33,000 14.0 17,543 54.8
자료 : Bundesanstalt für Arbeit(1990), Arbeitsmarkt in Zahlen, Aussiedler, Übersiedler im Mai 1990. Nürnberg, Klodt(1990).
주 : 1990년 1~5월.
5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이 결과를 근거로 독일정부는 사내훈련을 동서독 노동의 질 통합
의 핵심 훈련기제로 결정
- 이에 독일정부는 체제전환기 동독지역 기업의 잉여 노동력을 사
내향상훈련과 단축근무를 병행하여 가능한 취업자의 실업화를
방지. 이 조치에 따라 동독기업은,
① 전환기 생산현장에 발생한 잉여 노동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축소하고,
② 단축근무자에게 이전 임금의 70%를 지급,
③ 기업은 단축된 근무시간에 향상훈련 “Traning on the Job”을
실시하고,
④ 단축근무로 축소된 임금은 정부가 단축근로수당으로 보전함.
- 통일협약에 근거한 동독의 고용촉진법은 서독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에 비해 동독지역 근로자에게 관대하게 적용됨. 즉
단축근로수당의 한시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그로 인해 사업
장의 잉여노동력이 단축근로수당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기존
의 기업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함.
□ 직업훈련의 법적 기제로서의 고용촉진법
○ 통일협약이 체결되기 이전 이미 1990년 7월 1일 동독지역에 고용
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 der DDR)이 도입되면서 동독 경
력촉진훈련과 재훈련을 위한 새로운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짐.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57
-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직업능력향상훈련에 대한 법적인 기
초는 통일협약에 근거함. 그에 의하면 동독지역의 경력촉진훈
련과 재훈련과 같은 향상훈련은 서독의 직업훈련법(Berufsbil-
dungsgesez)과 수공업규정(Handwerkordung)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또 통일협약은 동독의 고용촉진법을 동독주민의 향상훈련촉진
과 관련된 한시적 특별법으로 인정함.
- 1990년 10월 3일 그간의 경력촉진훈련 및 재훈련과 관련된 동독
정부의 시험규정을 비롯한 재규정이 그 효력을 종료하였음. 그리
고 직업훈련법과 수공업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시험규정이 동독을
포괄한 독일 전역에 적용되었음.
- 그간 진행되고 있는 향상훈련은 법이나 시행령으로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향상훈련 실행기관에 진행을 일임하였음.
- 그러나 해당 향상훈련이 고용촉진법에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향상
훈련인 경우 고용촉진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
음(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1, 124).
□ 직업훈련의 내용, 형식, 표준의 통합을 위한 제 조치
○ 직업훈련 상담과 직업훈련쿠폰 발행
- 독일정부가 통일 독일 노동시장통합기제의 중심을 근로자의 향
상훈련에 두었지만 기업이 분해되고 도산하며 경제 및 산업구조
5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가 급격히 변화하는 조건에서 기존의 재직기업에서 사내향상훈
련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자사의 향상훈련을 타사의 근로자 및 실업
자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고용청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뿐 아니라
사회훈련기관 및 타사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향상훈련 참가자
에게 훈련쿠폰을 지급
- 또 동독 근로자의 경우 전환기 전직과 새로운 경력개발의 필요성
이 제기됨. 또 이러한 결정은 근로자 자신의 자질, 소양, 노동시
장에서 축적된 경험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쿠폰을 발행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훈련쿠폰제도는 근로자가 훈련쿠폰이 인정하는 훈련기관을 스스
로 선택하여 향상훈련을 받고 훈련제공기관이 수령한 쿠폰을 노
동청에 제출하여 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
- 또 급격한 경제 및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훈련참가자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큼. 그
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고용정책에 경험이 없는 동독정부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이에 근로자가 미래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직종을 찾도록 하기위
해 서독지역의 산업업종단체가 상담을 제공함. 이를 통해 서독
의 산업업종단체가 동독의 인적자본 재형성에 참여함(Klodt &
Henning, 1990).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59
○ 훈련지도자 양성지원
- 양성훈련지도자, 직업학교교사, 향상훈련지도자, 상공업회의소
자격시험위원 및 직업교육훈련위원, 양성 및 향상훈련상담가 등
직업훈련지도자는 직업훈련정책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인력
- 연방교육과학부는 노사 및 연방교육기관이 함께 직업훈련지도자
훈련촉진프로그램을 실시
○ 훈련모델이전을 통한 직업훈련의 현대화
- 서독에서 직업훈련현대화를 위해 개발된 모형을 동독에 전달하
여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기존의 콘셉트를 보완하도록 함.
- 또 정부는 서독 민간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영업, 경
영, 기술, 교수법과 직업훈련방법을 이전하도록 유도
(3) 정책시행의 성과
○ 통일과 동시에 추진된 각종 직업훈련의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는
- 동독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서베이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되기 시작함. 그러나 자료의 규모가 작고 조사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변수도 세분화되지 못함.
- 따라서 직업훈련의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는 연방고용청에서 수
6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집하고 있는 대규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중반 본격적
으로 연구됨. 그러나 이 자료의 취약점은 직업훈련변수와 고용효
과를 측정하는 변수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못한 것
- Speckesser(2004), Fitzenberger & Speckesser(2007), Fitzenberger
& Voelter(2007), Lechner et al.(2007) 연구가 이 행정데이터를 사
용하여 연구동독지역에 시행된 훈련조치의 고용효과를 분석함.
- 이들 연구는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이루어진 다양한 훈련프로
그램이 4년에서 8년 후 고용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
함.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기적으로 동독지역에 실시한 직업훈련조치는 고용에 부정적
인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잠금효과(lock-in effects)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됨.
·�그러나 위 연구의 대다수가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직업훈련
조치가 고용에 유효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줌
(Lechner & Wunsch, 2009).
○ 이를 통해 통일 직후 동독 고용촉진법에 의해 실시된 직업훈련촉
진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동독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
적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발휘하기보
다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실직위기의 근로자에게 직무 관련 과제를 부여하면서 임
금과 생활이 보전되도록 하였고 사회적으로 실업의 규모를 낮추
제3장 통일 전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 61
었음.
- 둘째, 통일 직후에 시행된 직업훈련조치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
탈하지 않고 근무대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인적
자본의 손실을 막고 근로자의 기술수준이 유지·향상될 수 있었
음. 이 인적자본은 동독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을
때 경제회복세에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했음(Lechner &
Wunsch, 2009).
○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직업훈련촉진정책은 동독지역 근로자의 노
동시장 경쟁력을 향상하여 고용효과를 높였음.
○ 본 장에서는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 혹은 도제제도의 노동시장 통
합에의 기여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함.
○ 본 장에서는 동독 지역의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를 분석함
으로써 도제제도가 동서독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하였다는 명제를
검증함. 즉,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직업
군, 즉 ‘도제제도 직업군’의 양의 임금효과를 발견함.
○ 본 장의 실증분석은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
만 포함하며, 파트타임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 전일제 근로자만 포함하며 파트타임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
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직업교육훈련 중인 근로자
및 전일제 직업을 찾고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하게 되어 도제제
도 혹은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임금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63
1.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임금구조조사(Verdienststrukturerhe-
bung)’ 2001년 및 2006년 자료임.
- 동 자료는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과거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와 유사한 자료로, 임금 근로자의 고용실태에 관하
여 조사한 무작위 표본 자료(random sample data)임. 자영업자
는 포함되지 않음.
- 본 연구는 웹 사이트에 공개된 학생용 Campus 파일을 이용하였음.
- Verdienststrukturerhebung은 1990년대에도 조사되었는데, 1990년
대의 명칭은 ‘생산직과 서비스직의 (사무직)임금 및 (생산직)임금
의 구조(Gehalts- und Lohnstrukturerhebung im Produzierenden
Gewerbe und im Dienstleistungsbereich)’이며, 1992과 1995년 자
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입수할 수 없었음.
(2) 분석모형
○ 본 장의 가설은 도제제도 혹은 직업교육훈련제도가 독일 통일 이
후 동서독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하였다는 것임.
- 이 가설은 동독지역의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를 분석함
64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으로써 검증함.
○ 분석방법은 이중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사용함.
- 통일 이후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직업군, 즉 ‘도제제도직업군’이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 비해 동서독 간 임금격차가 적다는 것임.
즉, ‘도제제도 직업군’과 동독 지역 등 두 변수의 교차항의 부호
를 검증함. 본 연구의 ‘도제제도 직업군’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함.
○ 본 장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DD 모델보다는 DDD 모델이 더 적
합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DD 모델을 사용함.
- 직업교육훈련제도가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노동시장 통합에 기
여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DDD 모델, 즉 통일
직후 1990년대와 2000년대 간에 ‘도제제도 직업군’이 그렇지 않
은 직업군에 비해 동서독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검
증해야 함.
- 그러나 통일 직후인 1990년대의 ‘임금구조조사’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설 검증은 불가능함. 2001년 데이
터와 2006년 데이터는 입수하였는데, 이 데이터로 DDD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즉, 2001년과 2006년을 비교하는 것은 거
의 의미가 없음. 그것은 앞의 데이터에서 보듯이 동서독 경제통
합은 대체로 2000년 이전에 대부분 진전되었고, 2000년대 이후
에는 ICT 기술진보, 글로벌화의 진전 등으로 동서독 지역 간 임금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65
격차의 축소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추세임. 특히 2000년대 이
후에는 대학진학률이 상승하고 도제제도의 의미가 특히 서독에
있어서는 감소하였음.
○ ‘도제제도 직업군’은 대체로 공업 및 수공업 분야 혹은 구동독 정부
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분야로 이 분야에서의 동
서독 간 임금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도제제도 직업군’은 중등교육 수준의 근로자가 대다수이고 직업
적 특성에 있어서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이동성이 낮은 그룹인
데 이들 그룹과 다른 직업군 간의 동서독 간 임금격차를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그것은 대체로 공업 및 수공업 공장에서 일하는 중등 교육수준의
근로자는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근로자임. 통일 이후
대졸 이상 고학력 엔지니어, 사무직, 서비스직, 작가 등의 직업은
서독으로 이주하여 임금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높았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의 실증분석은 주당 근무시간 30
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만을 포함함.
○ 모델
ln WAGEi = β0 + β1 GENDERi + β2 AGEi + β3 TENi +
Σk=1,39 δk VARk,i + β4 EASTi + β5 DUALOCCi +
β6 EAST×DUALOCCi + εi ........................................... (1)
6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여기서, WAGE는 월 단위 총보수(유로), GENDER는 성별 더미변
수, AGE는 연령, TEN은 근속연수임.
- VAR는 전일제 근로자의 교육훈련수준, 기업규모, 임금협상 형태,
산업 및 직업분류 등과 관련한 44개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으며,
기준 카테고리 변수를 제외한 39개 변수가 포함됨.
- 교육훈련수준은 7개 카테고리가 있으며, 중등교육 이하 및 직업
교육훈련 비이수, 중등교육 이하 및 직업교육훈련 이수, 중등교
육 이수 및 대학입학자격 획득이면서 직업교육훈련 비이수, 중등
교육 및 대학입학자격 획득이면서 직업교육훈련 이수, 전문대졸,
대졸, 학력미상 등임.
- 기업규모는 7개 카테고리가 있으나, 서독 지역에는 대기업 카테
고리가 2개, 동독 지역은 한 개 카테고리가 있어, 이를 통합하였
으며 5개 카테고리로 설정
- 임금협상 형태는 산별 노조가 임금을 협상하는 경우, 기업단위
노조가 임금을 협상하는 경우, 노조가 없는 경우 등 3개 카테고
리가 있음.
- 산업분류는 대분류 산업으로 경공업, 제조업, 에너지·수력, 건
설, 도소매업·자동차 수리보수, 음식료품 및 숙박, 교통·통신, 금
융·중개업, 부동산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 9개 카테고리가 있음.
- 직업분류는 20개가 있으며, 농부, 광부, 기계공, 방직공, 건설공,
물류 관련 직업, 엔지니어, 일반기능공, 상업 종사자, 서비스 컨설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67
턴트, 교통 및 뉴스 관련 직업, 기업가, 데이터 관련직 및 인보이
스 처리, 일반사무직, 경찰직, 작가 및 예술가, 보건 관련 직업, 기
타 인문·과학 관련 전문가, 일반 서비스직, 기타 등임.
- EAST는 더미변수로, 1은 구동독지역 거주, 0은 구서독지역 거
주임. DUALOCC는 본 연구에서 ‘도제제도 직업군’으로 정의한
변수이며, 이 변수는 다음 절에서 설명함. EAST×DUALOCC는
Difference-in-difference로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도제제도 직업
군 소속을 의미함. ε는 오차항임.
(3) 분석자료 개관
○ 본 절에서는 2001년 및 2006년 ‘임금구조조사’ 데이터의 주요 변
수의 특성을 분석함.
- 전일제 근로자만 대상
○ <표 4-1>의 2001년 및 2006년 독일 임금구조조사 주요 변수의 평균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독일 임금구조조사 데이터에서 구동독지역 거주 근로자 비율은
2001년 19.0%, 2006년 20.2%로 모두 20% 내외임.
- 전체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71.8%, 2006년
63.6%로, 남성 근로자에 편중되어 조사된 경향이 있으며, 2000년
대 후반 이와 같은 경향은 다소 시정되었음. 구동독지역에 비해
6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구서독지역에서 남성근로자 샘플 비중이 더욱 높으며, 2006년 데
이터의 구동독지역의 경우에는 남성근로자 샘플 비율이 56.1%로
남성 근로자의 편중이 시정되었음.
-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2001년 구서독지역 및 구동독지역 모두 약
39세였으나, 2006년에는 약 36세로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약 3세
가량 낮아졌음.
- 2001년과 2006년간 샘플 근로자의 평균연령 저하와 함께 근로자
의 평균 근속연수도 하락하였음. 2001년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9
년이었지만 2006년에는 6.5년임. 평균연령의 경우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데 비해 평균 근속연수의 경
우에는 두 지역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구동독
<표 4-1> 독일 임금구조조사 주요 변수의 평균치(전일제 근로자 : 2001년 및 2006년)
2001 2006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동독거주비율(%) 19.0 20.2
남성비율(%) 71.8 73.3 65.4 63.6 65.5 56.1
평균연령(세) 38.9 38.8 39.4 35.7 35.6 36.0
평균근속연수(년) 9.0 9.1 8.5 6.5 6.7 5.6
월평균보수(유로) 2,561 2,713 1,913 2,811 2,958 2,236
월평균보수 : 남성(유로) 2,745 2,895 2,026 3,047 3,195 2,368
월평균보수 : 여성(유로) 2,092 2,212 1,698 2,399 2,505 2,068
대기업종사자(%) 42.1 45.5 27.8 47.5 50.3 36.7
노조가입률*(%) 54.4 56.7 44.5 49.8 51.4 43.8
관측치수 43,458 35,190 8,268 47,495 37,875 9,620
주 : * 산별 노조 혹은 기업별 노조.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69
지역 거주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는 구서독지역 거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에 비해 2001년에는 약 0.6년, 2006년에는 약 1.1
년 짧음.
- 전일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2001년 2,561유로에서 2006년
2,811유로로 상승하였으며, 서독지역 근로자의 보수는 2,713유
로에서 2,958유로로, 동독지역 근로자는 1,913유로에서 2,236유
로로 증가하였음.
- 남녀 임금격차는 서독지역에서 2001년에 비해 2006년에 더욱 확
대되었음. 서독 지역의 경우 이 기간 동안 683유로에서 690유로
로 확대된 반면, 동독 지역의 경우 328유로에서 300유로로 축소
되었음.
- 종업원 수 25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2001년에는 42.1%,
2006년에는 47.5%이며,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간에 큰 차이
가 있음. 즉, 2006년의 경우 구서독지역 근로자의 50.3%가 대기
업 근로자인 반면 구동독지역에서는 근로자의 36.7%만이 대기
업 근로자임.
- 산별 혹은 기업별 노조에 의한 임금교섭 비율도 구동서독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음. 임금이 산별 교섭 혹은 기업별 교섭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54.4%, 2006년 49.8%로 다
소 하락하였음. 노조가입률도 구동서독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데
2006년의 경우 구서독지역 근로자의 51.4%가 노조를 통하여 임
금을 교섭하는 반면, 구동독지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43.8%만이
7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노조를 통하여 임금을 교섭함.
2. 도제제도 직업군 정의
○ 본 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도제제도 혹은 직업교육훈련제도가 활성
화된 직업군을 ‘도제제도 직업군’, 즉 앞의 식 (1)의 DUALOCC로
정의함.
- <표 4-2> 및 <표 4-3>에서 보듯이 도제제도는 모든 직업에서 활용
되고 있음. 따라서 직업군의 관점에서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직업
군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도입
- 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표에는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의 전일제 근로자만 포함되어 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는 포함되
어 있지 않음.
○ 전통적으로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고, 임금구
조조사 자료에서 볼 때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
을 도제제도 직업군으로 정의
- 이 기준에 맞는 직업군들은 (3) 기계공, (5) 건설공, (8) 일반기능공,
(13) 데이터작업 관련 종사자 등임(괄호 안의 숫자는 직업분류).
- (3) 기계공의 전체 기능공 중 중등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수 비율
은 2001년과 2006년 각각 78% 및 80%, (5) 건설공의 경우 각각
83% 및 82%, (8) 일반기능공의 경우 각각 82% 및 77%, (13) 데이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71
터작업 관련 직업의 경우 각각 64% 및 57%임.
-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 도제제도 직업군은 그
밖에도 (11) 기관사 등을 포함한 교통 관련 직업이 높은데, 그 비
율은 2001년과 2006년 각각 81% 및 79%임. 독일에서 기관사 등
을 포함한 교통 관련 직업은 공기업인 경우가 많음.
- 또한 (15)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포함한 공공직이 각각
76% 및 83%로 매우 높음. 그러나 (11) 교통 관련 직업과 (15) 공
무원 등은 직업교육훈련 혹은 도제훈련으로 양성되는 비율이 높
지만 본 절의 ‘도제제도 직업군’에서는 제외함.
- 즉, 공공 관련 직업군을 도제제도(직업교육훈련제도)가 활성화된
직업군, 즉 ‘도제제도 직업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본 장의 가설,
즉 통일 이후 ‘도제제도 직업군’에서 동서독 간 임금격차가 적다
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
- (9) 상업 종사자 및 (14) 사무직 또한 본 데이터에서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도제제도 직업군’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9) 상업 종사자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은 2001년과 2006년
각각 80% 및 77%, (14) 사무직의 경우에는 각각 81% 및 71%에 달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이 높은 직
업군은 아니고 2000년대 이후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이 높아
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임.
7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도제제도 직업군’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의도 가능한데, 본 연구에
서는 사용하지 않았음. 즉, 전통적으로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직업
군으로 알려져 있고, 구동독에서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
<표 4-2> 직업별 직업훈련교육 이수자 비율(전일제 근로자, 2001)
단위 : 명, %
전체중등직업훈련교육이수자 수
대졸자 수* 대졸자 비율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
1. 농부 111 70 11 11% 72%
2. 광부 3,304 2,143 8 0.2% 69%
3. 기계공 6,841 5,055 22 0.3% 78%
4. 방직공 1,369 678 10 0.8% 56%
5. 건설공 2,317 1,750 0 0% 83%
6. 물류관련 847 431 15 2% 58%
7. 엔지니어 1,635 106 1,464 91% 8%
8. 일반기능공 2,746 2,014 340 13% 82%
9. 상업 종사자 2,674 1,847 189 8% 80%
10. 서비스판매 5,292 2,828 347 7% 65%
11. 교통관련 2,893 1,981 30 1% 81%
12. 기업가 1,144 528 398 38% 59%
13. 데이터관련 전문가
1,770 877 480 29% 64%
14. 일반사무직 6,060 4,187 390 7% 81%
15. 경찰직 등 563 364 42 9% 76%
16. 작가·예술가 294 120 70 27% 59%
17. 보건직 195 106 47 27% 68%
18. 기타 전문가 264 9 242 92% 5%
19. 일반서비스 1,217 504 18 2% 58%
20. 기타 1,922 848 33 2% 50%
합계 43,458 26,446 4,156 10% 70%
주 : 1) * 전문대 비포함, 4년제 대졸자 수.주 : 2) ** (중등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수 + 중등교육 이상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수) / (전체 - 미상)
단, 미상은 학력수준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근로자.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73
교육훈련 강화 업종으로 알려진 직업군이며, 이 기준에 맞는 직업
군들은 (2) 광부 (3) 기계공 (7) 엔지니어 (8) 일반기능공 (13) 데이
<표 4-3> 직업별 직업훈련교육 이수자 비율(전일제 근로자, 2006)
단위 : 명, %
전체중등직업훈련교육이수자 수
대졸자 수* 대졸자 비율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
1. 농부 131 70 25 20% 60%
2. 광부 2,938 1,889 14 0.5% 70%
3. 기계공 5,310 3,963 42 0.8% 80%
4. 방직공 1,498 832 6 0.4% 62%
5. 건설공 1,347 965 1 0.08% 82%
6. 물류관련 487 275 12 3% 63%
7. 엔지니어 1,352 154 1,046 80% 18%
8. 일반기능공 2,153 1,432 325 16% 77%
9. 상업 종사자 2,322 1,487 162 8% 77%
10. 서비스판매 3,569 1,862 352 11% 69%
11. 교통관련 2,919 1,884 18 0.7% 79%
12. 기업가 879 334 370 48% 50%
13. 데이터관련 전문가
1,704 673 491 33% 57%
14. 일반사무직 6,810 3,709 1,091 18% 71%
15. 경찰직 등 1,081 739 46 5% 83%
16. 작가·예술가 791 162 187 39% 46%
17. 보건직 7,722 2,086 3,758 50% 30%
18. 기타 전문가 175 27 129 75% 19%
19. 일반서비스 1,737 648 17 1% 52%
20. 기타 2,475 743 168 8% 39%
합계 47,400 23,934 8,260 19% 61%
주 : 1) * 전문대 비포함, 4년제 대졸자 수.주 : 2) ** (중등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수 + 중등교육 이상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수) / (전체 - 미상)
단, 미상은 학력수준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근로자.
74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터작업 관련 등임.
- (2) 전체 광부 중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수 비율은
2001년과 2006년 각각 69% 및 70%이며, 대부분이 중등 직업교육
훈련 이수자들임. (3) 기계공의 경우에는 2001년과 2006년 각각
78% 및 80%, (7) 엔지니어의 경우 각각 8% 및 18%, (8) 일반기능
공의 경우 각각 82% 및 77%, (13) 데이터작업 관련 직업의 경우
각각 64% 및 57%임.
- 전체 근로자 중 중등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비율에서 볼 때, 이 기
준은 적합도가 떨어지는 편인데, 특히 (7) 엔지니어의 경우 2001
년 91%, 2006년의 경우 80%가 전문대졸 혹은 대졸자로, 대부분
이 대졸자이고 중등 직업교육 훈련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 직업군을 도제제도 직업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정의를 사용하지 않았음.
3. 실증분석 결과
(1) 실증분석 결과
○ 2001년 및 2006년 독일 임금구조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거주
지역, 즉 구동독에 거주하는지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동독지역 거주 임금근로자는 서독지역 거주 임금근로자에 비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75
해 2001년의 경우에는 약 32%, 2006년의 경우에는 약 25% 임금
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동독지역 거주로 인한 임금 손실은 여성 근로자의 임금 손실보
다 훨씬 큰 수준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손실은 2001년 및 2006년
모두 약 21%로 거의 일정한 수준임.
○ 본 실증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구동독지역에 거주하는 ‘도제제도 직업군’에 속하는 근로자는 모든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 임
금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실증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EAST×DUALOCC, 즉 구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도제제도 직업군 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음.
- 즉, 구동독 거주, 성별, 연령, 근속연수, 학력, 산업, 직업, 기업규
모, 노조를 통한 임금협상 여부, 도제제도 직업군 등의 변수를 통
제한 이후, 구동독지역에 거주하는 도제제도 직업군에 속하는 근
로자는 2001년에는 2.8% 정도, 2006년에는 2.6% 정도 임금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동독지역에 거주하는 도제제도 직업군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미
치는 임금효과는 남성근로자에 한함.
- 구동독지역에 거주와 도제제도 직업군의 교차항 (DD)의 계수는
남성근로자와는 달리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7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표 4-4> 독일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2001)
전체 남자 여자
GENDER 0.213(0.004) - -
AGE 0.011(0.001) 0.012(0.002) 0.010(0.003)
TEN 0.004(0.002) 0.003(0.002) 0.006(0.005)
EAST -0.324(0.005) -0.346(0.006) -0.286(0.009)
DUALOCC 0.369(0.012) 0.393(0.014) -0.029(0.041)
EAST×DUALOCC 0.028(0.009) 0.050(0.011) -0.006(0.022)
Constant 6.450(0.016) 6.651(0.020) 6.587(0.028)
교육수준, 기업규모, 산업, 직업, 노조가입 등
관련 변수○ ○ ○
N 43,454 31,210 12,244
R-sq 0.5482 0.5467 0.4925
주 : ( ) 안은 표준오차.
<표 4-5> 독일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2006)
전체 남자 여자
GENDER 0.214(0.004) - -
AGE 0.014(0.002) 0.015(0.002) 0.012(0.003)
TEN 0.005(0.002) 0.004(0.002) 0.007(0.004)
EAST -0.257(0.005) -0.269(0.006) -0.235(0.007)
DUALOCC 0.136(0.014) 0.106(0.015) 0.373(0.026)
EAST×DUALOCC 0.026(0.010) 0.026(0.012) 0.101(0.026)
교육수준, 기업규모, 산업, 직업, 노조가입 등
관련 변수○ ○ ○
Constant 6.505(0.013) 6.624(0.017) 6.534(0.019)
N 47,495 30,221 17,274
R-sq 0.5356 0.5340 0.5214
주 : ( ) 안은 표준오차.
제4장 실증분석 : 동독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 77
도제제도 직업군이 주로 남성 근로자 중심의 제조업 직종이기 때
문일 수 있음.
(2) 시사점
○ 통일 이후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기 직업훈련이 행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까지 전통적인 ‘도제제도 직업
군’인 제조업 부문 근로자들 임금이 동서독 지역을 통제한 이후에
는 약간이나마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상적임.
- 통일 직후에는 실업방지 차원에서 단기 직업훈련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음.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단기 직업훈련의 대부분
은 서비스 산업 출신 실업자 혹은 잠재 실업자에게 행해졌음. 서
비스 산업 교육훈련자의 상당수는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였고 교
육 훈련을 받은 다음에도 다시 서비스 산업에 취업했음.
-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단기 직업훈련 수혜
자가 적으며, 특히 기술 관련 직종을 위한 훈련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음. 1992년의 경우 8%가 과거 기술훈련 직종이었고 훈련 후
기술 관련 직종에 취업한 사람은 6% 정도임.
- 이것은 기술훈련직종의 경우 단기 직업교육 훈련으로는 재취업
이 가능하지 않으며, 정규 교육훈련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을 의미함.
○ 1994년 이후에는 동독에도 도제제도가 복구되어 도제제도를 통한
7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되었음.
○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제2장의 통일 이후 경제통합 개관에서
살펴보았던, 통일 직후 구동서독 지역 간 임금 수준의 수렴이 제조
업 부문에서 신속했다는 것과 부합함.
- 단, 동독의 제조업 부문의 임금이 높았던 것은 통일 후 구동독 지
역에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노동조합 등 제도
적 요인도 컸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구동독 지역에서 도제제도는 통독 후 수년 만인 1994년에는 복구
정착되어 도제제도를 통한 정규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되었는
데, 이와 같은 빠른 제도 수렴은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동서
독 직업훈련제도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동질성을 보
유하고 있었기 때문임.
- 통독으로 동독의 대기업, 콤비나트 등의 붕괴로 인하여 대기업과
콤비나트가 주축이 되어 실행되었던 직업교육훈련 체제가 붕괴되
었지만, 1994년에 이르면 정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됨.
1.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 특히 노동시장
통합에서의 역할을 기존 문헌 검토 및 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
하였음.
- 본 연구에서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의 지표로는 1인당 GDP 노동
생산성, 실업률, 제조업에서 1인당 월평균 보수, 노동이동 추이
등을 사용하였으며, 노동시장 통합은 제도 수렴과정, 특히 구동
서독 직업훈련제도의 수렴과정을 검토하였음.
- 도제제도로 특징지어지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노사관계제도는
체제 전환 초기, 동독 지역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지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동서독 경제사회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8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단, 체제 전환 초기의 동독 지역 근로자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노
동생산성과 관계없이 서독 노사관계제도의 동독 지역에의 급속한
전파의 영향도 있었음에 유의해야 함.
- 서독의 막강한 노동조합이 동독 지역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미친
영향력은 이미 1993년에 이르면 ‘고용주의 반란’을 계기로 급격히
하락하는 데 비해, 통독으로 붕괴되었던 동독의 도제제도는 1994
년에 재구축되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높이는 데 기
여하였음.
○ 본 연구는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가 통일 독일의 경제통합 혹은
노동시장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기존
문헌 검토 및 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이 가설을 입증하였음.
- 제3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급진적인 융합·정착 과정을 살
펴보았는데, 이것은 동 제도가 독일 통일의 노동시장 통합의 중요
한 기제로 작용하였을 것을 시사함.
- 제4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도 동독지역 ‘도제제도 직업군’의
임금효과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직업교육훈련
제도가 구동서독 노동시장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
사함.
- 이것은 한국 통일과정에서도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중 직업훈련제도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81
○ 독일 통일과정에서 경제통합은 통독 이후 약 7년간 단기간에 급속
히 진행되었으며, 노동시장 통합은 경제통합에 비해 완만히 진행
되었음.
- 제2장의 1인당 GDP 관련 지표들로 볼 때, 독일의 경제통합은 약
7년(1991~1997년)이라는 상당히 단기간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1인당 GDP, 실업률, 임금 등의 지표 추이를 보면, 독일의 통합과
정은 1990년대에 거의 종료된 것으로 보임. 특히 1인당 GDP 추이
를 살펴보면 1997년까지 동서독의 격차는 급속하게 좁혀졌지만,
그 이후는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는 현상이 보이고 있음.
- 단, 본 연구는 독일의 경제통합은 단기간에 진행된 것으로 분석하
였지만, 다른 견해도 존재함. 통일 독일의 구 동서독 통합전략이
‘폭발적 접근법(big bang approach)’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표와는 달리 구동독지역의 경제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도 있음(Bonin and Zimmermann, 2000).
- 통일 직후 구동서독 지역 간 임금 수준의 수렴이 제조업 부문에
서 더 신속했던 것은, 통일 전부터 구동서독 지역 제조업 부문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도제제도의 영향,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노동조합 효과 등 제도적
요인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제3장에서는 통일 전 동서독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와 통일
8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직후 구동서독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수렴 과정을 살펴보았음.
- 역사적으로 구동독과 구서독의 직업훈련은 중세 도제의 기술인력
양성방식에 기원을 두고 나치하에 형성된 이원화 양성제도를 유
지하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와 국가 사회주의체제 혹은 사회주
의 계획경제라는 상이한 체제 속에서 제도적으로 상이하게 발전
-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표준화를 위한 직업자격제도의 운영, 평
생훈련을 통한 기술력 향상,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인력의 전문성과 기술응용력 강화 등 일반적 목표에서 공통
점이 있었음.
- 또한 공통점으로는 통독 이전에도 구 동서독 양국은 직업학교 이
론교육과 작업장 기술훈련을 병행하는 이원화제도를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차이점은, 구서독의 경우 직업학교가 주정부 산하에 설치되었음.
구동독은 구서독과 달리 직업학교가 기업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
에 설치되었음.
- 또한 구서독의 경우 업종별 단체가 교육훈련 공급에 주도적 역할
을 한 반면, 구동독의 경우 사회주의 교육목표와 인력계획하에 대
규모 생산공장이 교육훈련을 주도하였음.
○ 통일 직후 구동독의 대기업과 콤비나트가 분해 또는 도산되면서,
1989년과 1992년 사이 동독 노동청의 긴급 훈련지원조치, 서독 연
방고용청의 3억 마르크의 훈련지원금 등을 통해 독일 직업교육훈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83
련의 동서 융합이 급속하게 진행됨.
- 지역적으로는 베를린, 산업별로는 수공업분야에서 이러한 동서
융합 현상이 두드러졌음.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독일의 고용촉진법은 직업훈련을 통해 서독의 기술, 표준, 경험
을 동독으로 이전하는 핵심적인 노동시장 통합기제가 됨.
- 직업교육훈련의 동서 융합 원칙은 1990년 체결된 통일협약에 명
시되었음. 구동서독 상이한 사회체제 속에서 양성된 직업능력이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의 이원화
직업학교에서 획득한 직업의 자격은 구서독에서 유효함을 인정
○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도제제도로 특징지어지는 독일의 직업교
육훈련제도가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노동시장 통합에 일정한 역
할을 하였다는 가설을 검증함.
-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도제제도 직업군’에 속하는 근로자의 임금
을 분석하였음.
- 우선 ‘도제제도 직업군’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임의로 설정하
였음.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직업군으
로 알려져 있고, 독일 임금구조조사 자료에서 직업교육훈련 이수
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을 도제제도 직업군으로 정의하였음.
- 실증분석은 독일의 임금구조조사 2001년 및 2006년 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동 자료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무작위 표본자료로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음.
84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이중차감법을 사용하여 동독지역 거주의 더미와 ‘도제제도 직업
군’ 더미의 교차항의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교차항의 부호는 모
든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즉,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도제제도 직업군’에 속하는 근로자는
동독 지역 거주, 도제제도 직업군 소속, 그밖에 산업, 직업, 기업
규모, 개인적 특성 등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 약간의 임금 이득을
얻고 있음.
- 단, 동독 지역 거주에 따른 임금 페널티는 매우 큰데, 2001년의 경
우 동독지역 거주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서독지역 거주 임금근로
자의 임금에 비해 약 32%, 2006년에는 약 25% 낮음. 개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을 통제한 이후의 수치임.
- 위와 같은 동독지역 및 도제제도 직업군의 교차항의 임금효과는
남성 임금근로자에 국한된 것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독일의 경험, 즉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노동시장 통합에서의 역할은
한국 통일 이후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함.
- 제2장에서는 통일 직후 구동서독 지역 간 임금 수준의 수렴이 제
조업 부문에서 더 신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구동독지
역에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노동조합뿐만 아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85
니라, 통일 전부터 동서독 지역 제조업 부문에 공히 존재했던 도
제제도의 영향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통합 진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
로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을 제안함.
- 물론 이와 같은 제안은 독일의 특수한 경험에 입각하여 노동시장
통합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한다는 점
에서 우려의 여지는 있음. 독일은 1990년 통일협약에서 구동독
의 이원화 양성제도하의 자격을 인정하였고, 구서독의 직업교육
훈련제도는 이미 1994년경 구동독에 안착하였음.
- 제3장에서 보듯이, 직업교육훈련제도도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었으나, 구동서독 직
업교육훈련제도가 ‘도제제도’라는 동일한 역사적 기반에 기초하
고 있어 서독 제도가 빠르게 무리 없이 확산될 수 있었음.
○ 또한 통일 이후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토대로 독일식 사회
적 시장경제의 요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과거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에 국가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제가 운용되었고, 북한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므로, 향후 북한과의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
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
제 요소가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원화 제도에서 업종별 단체가 훈련을 공급한 구서독과는 달리
8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구동독은 국가 사회주의 체제 혹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 직
업학교의 운영과 훈련의 공급에 국가가 개입했음. 한국 마이스터
고 제도는 계획· 조정·지원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은 동 제도가 구동독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유사한 측
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2. 정책과제 : 한국 통일과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
(1) 마이스터고 제도의 정착과 역할
○ 마이스터고 제도의 전 방위적 확대 등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은 한
국 제조업 재도약의 기제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체제 발
전은 뒤떨어진 편이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노동시장 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학협력 인력양성체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은 중소기업
의 인력부족 해소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마이스터고 제도는 핵심 기능인력 양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단, 마이스터고 제도는 특성화고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대표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라고 할 수는 없
음.
○ 한국은 2010년 마이스터고 제도 도입으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87
에서 현장훈련이라는 독일식 직업교육훈련제도 혹은 도제제도의
요소를 도입하였음.
- 독일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으며, 2008년 이후에도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보이
고 있음. 이것은 전 세계로 하여금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음. 많은 국가가 직업교육훈련제도
를 개편하여 독일식 현장학습 및 훈련, 즉 도제제도의 요소를 도
입하였는데, 한국의 마이스터고 제도도 그 한 예임(정주연·최희
선, 2013).
- 마이스터고 제도는 대체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대기업의 고급 숙련기능인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마이스터고 정책은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를 해소하고, 적성에 따라 전문가(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비전을 주는 정책이며, 2012년에는 국정지지도 2위의 정책
으로 부상하였음(김종우 외, 2012).
- 그러나 독일의 도제제도를 도입하면 곧바로 직업교육훈련제도
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숙련의 미스매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님.
독일의 도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독일 경제사
회 내에서 진화되어 온 산물이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경제사회에
적용되기 쉽지 않음.
- Thelen(2004)이 주장하듯이 숙련형성 제도의 차이는 선진 자본
주의 국가의 다른 모습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
8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형성 제도는 각국의 경제사회정책에 영향을 받음.
○ 마이스터고 제도는 현재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만, 동 제도가 확산되어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전형으로 정착하지
않는 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빈곤층 혹은 차상위계층의 유능한 청년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
여 보상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숙련기능직으로 성장
함으로써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스터고 제도는 사
회통합의 기제로서 중요함.
- 또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제도의 내실화는 통일과정에서 북
한지역 인력의 교육 및 재교육에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시
장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통일 직후에는 단기 직업훈련이 실업해
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수년 후부터는 정규 직업교육훈련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기업에서의 실습이 결합된 마이스터고 제도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산은 북한 인력을 빠르게 남한의 숙련형성체제에 적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마이스터고 제도가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및 노동시장 통합의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가 확
산되어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전형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마이스터고 제도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89
으며, ‘엘리트 특성화고’ 혹은 특성화고 개편을 위한 파일럿 프로
젝트 정도의 성격일 수도 있음.
(2) 한국 통일과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
○ 미래의 한국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인력의 상당수는 오랜 기간 동
안 현재의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됨.
- 남북한의 경제규모 차이, 주민의 소득수준 차이뿐만 아니라, 남
한과 북한의 인력양성구조 차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의 상당수는
‘계급이하 계급(under class)’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남한은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대학진학
률이 매우 높은 반면, 북한은 고등교육제도의 질이나 대학진학률
이 남한의 수준에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직업교육훈련제도도 남북한이 크게 상이하여 남한의 직업
교육훈련제도가 북한지역에 쉽게 전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됨.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 3~4년 만에 동독지역에 서독의 직
업교육훈련제도가 전파되어 기존 제도와 융합·정착하였음.
- 이와 같은 사실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인력은 한국의 산업인
력으로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현재의 동남아, 중국 등지로부터
의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위에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90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남북한 교육제도 중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수렴이 상대적으로 신속
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됨.
- 남한의 연구중심대학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진입하였으므로 남
북한 대학교육 체제 및 질의 격차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며, 북
한이 국가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에서는 상
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발전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됨.
- 이것은 통독 이전 동독 사회주의 정부의 경우 학교체계를 사회주
의적으로 개편하여 10년제 단일학제의 폴리테크닉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전인적 ‘실업교육’을 하였다는 데에도 근거함.
○ 물론, 한국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통일 후 경제사회통합에의 역할은
독일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일 것임.
- 마이스터고 제도는 현재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
지만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 빈곤층 혹
은 차상위계층의 유능한 청년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여 보상수
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숙련기능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의 마이스터고는 직업교육제도의 일부이고, 마이스
터고 졸업생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기능직 노동자계층의 소수의 ‘기능직 노동귀족’으로
포지셔닝할 가능성이 높음.
- 이것은 1980년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91
업생이 1960년대 이래의 섬유·가발공장의 여공들을 대체하고 양
적·질적 측면에서 핵심 노동계층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
여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마이스터고 제도 개편이 한국 산업의 재도약 및 사회통합 그리고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4)
○ 첫째, 마이스터고 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특성화고의 대부분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개
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교육예산 구조를 바꾸어 고등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
을 대폭 특성화고 예산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은 현재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부실대
학에 대한 교부금 지원을 중단하여 이들을 문 닫게 하고, 이를 마
이스터고 확충에 전용하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직업교육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2014년 교육예산을 보면,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음. 평
생·직업교육 예산 중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예산을 38.5% 감액하
였음.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교육공약으로 직업교육강화를
약속하였다는 점과 맞지 않음(한국교육신문, 2014.1.4).
4) 정주연·최희선(2013) 참조.
9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 둘째, 국립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및 취업연계가 대기
업에 편중되지 않을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국립 마이스터고의 중소기업 기능
인력 공급의 역할이 제한적인데, 이것은 대중소기업 격차를 확대
하고 직업교육제도 개편의 의의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국립 마이스
터고 졸업생들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임.
2012년 국립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은 42.3%,
대기업 취업 비율은 46.6%, 기타 공공기관 등 취업 비율은 11.1%
로, 대기업 취업 비중이 중소기업 취업비중보다 높음.
- 이것은 정부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마이스터고의 중소기업 기능
인력 양성이라는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현
재 직업교육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마이스터고 제도 확대 등 직업훈련제도 개편은 한국적 제약
을 인정하고 그 제약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도제생 파견대상 산업체 발굴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실습의 양적 확대에 집착하지 않고 적은
시간이라도 질적으로 효율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함.
- 제3장에서 보듯이, 통독 이전 동독의 도제제도에서는 장비와 기
계를 실제로 다루는 현장실습보다 그 원리를 가르치는 이론에 치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93
중하였는데, 이것은 동서독 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이념의 차이
보다는 동독의 경우 기계 및 장비의 부족과 낙후성으로 훈련과정
에 기계와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임.
- 마이스터고·특성화고가 도제생을 파견할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
도 결국은 고졸 이하 숙련기능인력의 임금이 낮고 이들이 산출하
는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임. 마이스터고 출신의 우수한 기능인력
이 기업의 핵심 기능인력으로 성장하여, 고숙련을 기반으로 고부
가가치를 생산하고 따라서 고임금을 받고 승진기회도 열리는 경
우에만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향후 북한과의 통합을 대비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요소의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과거 반세기 동안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북한은 국
가사회주의 방식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의
경제 통합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시장
경제 요소가 역할을 할 수 있음.
- 통일 후 독일에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배경에는 통일 이전 구동독과 구서독의 경제제도 및 노
동시장 제도에서의 유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본 연구는
도제제도 혹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주목하였음.
- 구동독의 국가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에
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구서독에서는 공공부문과 노사 공
95
참고문헌
·민효상·김보경·서정욱(201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국가 비교 분석: 한
국의 특이성에 대한 탐색적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국가정책연구」,
26(4).
·전홍택 편(2012),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
안”, 한국개발연구원.
·정미경(2013), “독일의 산학연계형 고등교육: 독일산업대학(Fachhochschule)
과 직업아카데미(Berufsakademie)”,「The HRD Review」, 71,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정원호(2004), “독일 노동시장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사회경제평론」,
제23호.
·정주연·최희선(2013), “도제훈련제도의 국가별 특성 및 한국직업훈련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 정책자료 2013-194, 산업연구원.
·주독일대사관(2013), “독일 이원화 직업교육 제도 현황”.
·Barabasch, A., Lakes, R. D.(2005), “School-to-work transition in East Ger-
many: Challenges of a market society”, Career and Technical Educa-
tion Research, 30(1).
·Bonin, H., Zimmermann, K. F.(2001), The post-unification German labor
market, Springer Berlin Heidelberg.
·Bramer, H.(1991), “Berufliche Weiterbildung in der DDR vor der Wende”,
Mitteilungenaus der Arbeitsmarkt-und Berufsforschung, 24. Jg./1991
(2).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schutz(2014),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Einigungsvertrag
96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vom 31. August 1990), http://www.gesetze-im-internet.de/einigvtr/
BJNR208890990.html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1991), Berufsbildungsb-
ericht 1991,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8, Bonn.
·______(1992), Berufsbildungsbericht 1992,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31, Bonn.
·Burda, M. C., Hunt, J.(2001), “From reunification to economic integration:
productivity and the labor market in Eastern German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1(2).
·Ebbinghaus, B., Eichhorst, W.(2006), “Employment Regulation and Labor
Market Policy in Germany: 1991~2005”, IZA Discussion paper, No.
2505.
·Eichler, M., Lechner, M.(2005), “Public Sector Sponsored Continuous Vo-
cational Training in East Germany: Institutional Arrangements, Partici-
pants, and Results of Empirical Evaluations”, Discussion papers/Insti-
tut für Volkswirtschaftslehre und Statistik;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ät Mannheim.
·Gernandt, J., Pfeiffer, F.(2008), “Wage convergence and inequality after
unification:(East) Germany in transition”, ZEW-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08-022.
·Gewände, W.D.(1990), Anerkennung von Übersiedlerzeugnissen: beru-
fliche Bildung und berufliche Qualifikation in der Deutschen De-
mokratischen Republik,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4, überarbe-
itete und erweiterte Auflage, Berlin, Bonn.
·Hassel, A.(2010), “Twenty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The restructuring
of the German welfare and employment regime”, German Politics &
참고문헌 97
Society, 28(2).
·Hegelheimer, A.(1971), Reformtendenzen des beruflichen Bildungswesens
i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Mitteilungenaus der Arbeits-
markt- und Berufsforschung, 4, Jg./1971(1).
·Hippach-Schneider, U., Hensen. K.A., Schober, K.(2011), “Germany. VET in
Europe-Country Report 2011”, www.cedefop.europa.eu/EN/Informa-
tion-services/vet-in-europe-country-reports.aspx
·Idriss, C. M.(2002), “Challenge and change in the German vocational system
since 1990”, Oxford Review of Education, 28(4).
·Klodt, H.(1990), “Arbeitsmarktpolitik in der DDR : Vorschläge für ein Quali-
fizierungsprogramm”, Die Weltwirtschaft.
·Kohn, K., Antonczyk, D.(2011), “The aftermath of reunification: sectoral
transition, gender, and rising wage inequality in East Germany”, IZA
Discussion papers.
·Lechner, M., Miquel, R., Wunsch, C.(2007), “The curse and blessing of train-
ing the unemployed in a changing economy: The case of East Ger-
many after unification”, German Economic Review, 8(4).
·Petrosky, J.(1996), “The German dual educational system: Evolving needs
for a skilled workforce”, Perspectives on Business and Economics, 14.
·Piotti, G.(2011), “Conversion as a mechanism of hybridization: the institu-
tional transfer of industrial relations and vocational training from west-
ern to eastern Germany”, Environment and Planning-Part C, 29(3).
·Riphahn, R. T., Zibrowius, M.(2013), “Apprenticeship training and early labor
market outcomes in East and West Germany”, BGPE Discussion Paper,
98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No. 136.
·Scheuer, M., Rappen, H., Walter, J., Wenke, M.(1992), “Ein Beitrag zur Be-
wertung der in der DDR erworbenen beruflichen Qualifikationen in
den Bereichen Metall und Elektro”, Mitteilungen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5. Jg./1992(4).
·Shin, Hans-Werner(2000), “EU Enlargement, Migration, and Lessons from
German Unification”, German Economic Review, 1(3).
·Speckesser, S.(2004), “Using Social Insurance Data for the Evaluation of Ac-
tive Labour Market Policy: Employment Effects of Further Training for
the Unemployed in Germany”, University of Mannheim, Thesis Chap-
ter, http://bibserv7.bib.uni-mannheim.de/madoc/volltexte/2004/335/
·Statistische Amter der Lander(2013/2014),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
nungen der Lander: Reihe 1, Landerergebnisse Band 1: Bruttoinland-
sprodukt, Bruttonwertschopfung in den La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______(2013),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ander.
·Statistisches Bundesamt(1992), Datenreport 1992.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______(2006), Verdienste und Arbeitskosten: Verdienststrukturerhebung
2006-Verdienste nach Berufen.
·Tietze, A.(2009), “Polytechnische Bildung. Vor 50 Jahren wurde in der DDR
ein sozialistisches Schulgesetz beschlossen”, Junge Welt, 2009.5.12.
·Wagner, K.(1998), “The German apprenticeship system after unification”,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Discussion paper FS,
참고문헌 99
98-301.
·Wiesenthal, H.(2003), “German unification and ‘Model Germany’: An ad-
venture in institutional conservatism”, West European Politics, 26(4).
·Wingens, M., Sackmann, R.(2000), “Evaluation AFG-finanzierter Weiterbil-
dung Arbeitslosigkeit und Qualifizierung in Ostdeutschland”, Mitteilun-
gen aus der Arbeitsmarkt-und Berufsforschung, 33. Jg./2000(1).
·Wolf, H., “Reunific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in Germany: The Interna-
tional Dimension”, BMW Center for German and European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Wunsch, C.(2005),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institutions, instru-
ments and reforms since unification”, University of St. Gallen Eco-
nomics Discussion Paper, (2005-06).
·www.bibb.de/de/26173.html
·www.bibb.de/de/wlk26560.html
·www.destatis.de
·www.bundesregierung.de/Content/DE/Magazine/MagazinSozialesFamilie
Bildung/080/s-c-berufsbildung-ost-und- west.html
·www.mdr.de/damals/artikel75574.html
최희선·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현)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주요 저서|· TVE-le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2013, 공저)·산업기술인력의 경력경로에 관한 연구 : SW산업을 중심으로(2012, 공저)
정미경·프랑크푸르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보훔대학교 등에서 강의
|주요 저서|·“Intellectual Capital and Innovative Capabilities of Enterprises in Korea”(2013)·“독일의 산학연계형 고등교육 : 독일산업대학 직업아카데미”(2013)
■ 저자 약력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및 시사점
인쇄일 2014년 10월 29일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발행인 김도훈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록 1983년 7월 7일 제6-0001호
주○소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화 02-3299-3114
팩○스 02-963-8540
문○의 자료·편집팀 02-3299-3151
인쇄처 이호문화사
값 4,000원ISBN 978-89-5992-698-5 93320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
ISSUE PAPER 201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