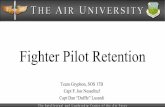경제만이 아니다 —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한...
Transcript of 경제만이 아니다 —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한...
경제만이 아니다 11
경제만이 아니다—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한
실험적・비판적 검토—
마틴 T. 베일(부산대학교 박물관)
목 차
Ⅰ. 서론 Ⅲ. 무문시대 전-중기 이행에 대한 재검토
Ⅱ. 무문시대 전-중기 사회변형에 대한 Ⅳ. 검토
개념화의 문제 Ⅴ. 결론
I. 서론
무문시대(BC 1500~300)는 하나의 형성기이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의 사회는 규모와 성
격 면에서 변화가 진행되어 2차 국가의 앞 단계까지 간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무문토기 시
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사회변동에 대한 새
로운 방식의 사고를 제안해 보려 한다. 무문토기 중기(BC 850~550)는 어느 시기보다 급격한
변동기였다. 정치-사회적으로 초보적인 복합사회, 영구적 경작지, 상당한 노동력으로 축조된 분
묘, 그리고 청동기 생산의 증거들이 고고학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환호나 목책시설을 가진 상
당 규모의 중심지적 취락이 등장하고 논과 밭의 형태로 경작지가 구축되며 매장이나 의례를 위
한 신성한 장소가 마련되는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이러한 변동의 단초는 무문토기 전기(BC
1150~850)의 후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천안 백석동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보듯이 농
업 생산물의 분배를 두고 발생한 사회적 긴장상태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동을 두고 평등한 수렵채집 사회의 종말과 농경에 기반한 초보
적 복합사회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 여전히 한국고고학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남아
있는 문화사 고고학의 관점에서 보면 무문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이어지는 무문토기 중기의 사
회적-기술적 변동은 선진적인 기술과 복합사회조직을 갖춘 농경집단의 이주로 설명된다. 많은
12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13
이러한 관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제시되어 왔고 이제 낡아 빠진 것으로 취급되지만 아직
도 그와 같은 담론이 무문시대 연구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최근
의 과정주의나 해석적(탈-과정주의적) 이론을 구사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영어로 작성된
기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고고학 논문의 상당수는 당대 유행했던 과정주의 모델을 채용
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적의 발굴사례와 자료의 양이 급증하면서 한국고고학의 지평에 커
다란 변화가 도래하였다. 바로 이 무렵부터 구제발굴의 규모와 유적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특
히 취락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는데(e.g. Ahn 2000, 2001; Bae 2000b, 2005a, 2009; Bale and
Ko 2006; Kim and Lee 2000; Kim J.T. 2000; Kim H.S. 2005a, 2005b; Ko 2003; Lee J.C.
2000; Lee S.H. 2005a, 2005b; Lee S.J. 2000; Miyazato 2005; O et al. 2005; O 1997; Song
2001), 발굴의 급증은 대규모 주택의 건축과 교통망의 건설이라는 한국경제의 정책적인 여건변
화에 기인한 것일 따름이다.
2. 무문시대 전-중기 이행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에서 선사시대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폭넓게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문화사 고
고학의 관점이다. BC 700년 이후까지도 한반도 내에서 청동기가 자체 생산되었다는 증거가 거
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시대를 청동기시대라고 부른다. 초기철기시대
(BC 300~100) 이전까지는 청동유물의 수량도 극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 고고학의 연
구에서는 수혈주거지와 토기, 그리고 다른 유물들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형식학적, 혹은 양식론
적 서술이 주를 이룬다(e.g. Ahn 2000; Im 1985; Kim J.G. 1974, 1976; Lee S.H. 2005b). 한
국 고고학에서 무문시대 전기 후반을 정의한다면 우선 이 시기의 토기를 그러한 형식이 나온 대
표유적의 이름을 따서 흔암리형식이라고 부르는 데서 출발한다. 그에 상당하는 수혈주거지는 평
면형이 세장방형이고 대형(약 40~120m2)에 속하며 복수의 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연부
에 공열문이 있는 토기형식이 이 시기의 유적에서 발견된다.
서기전 900~85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노지를 가지지 않는 소형의 흔
암리식, 혹은 先송국리식의 장방형 수혈주거지가 기존의 대형주거지들을 대체하게 된다(Ahn
2000; CHCC 2004b; GUM 1998; Miyazato 2005; YICP 2005). 이 휴암리식 주거지는 “선-송
국리문화”의 일부이며(Ahn 2000), 타원형의 얕은 작업공이 주거지 바닥의 중앙, 지붕을 지지하
는 두 기둥 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 한반도 동남부지방과 중남부지방의 유구에서는 이 단계에도
공렬토기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Bae 2009; Ko 2003: 82~91; Lee S.H. 2005a: 74~75).
자료를 통해 자체적인 변동이 있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해석되
고는 한다. 한편 과정주의 관점에서라면 무문시대의 변동에 대해 농경집단이 식량생산을 집약화
하고 사회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계의 해
석들이 그동안 무문시대 변동의 윤곽을 잡아 오긴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론적인 모델 혹
은 전제로서 다소 구식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무문시대의 사회적, 기술적 변동은 합리화, 집약화, 경제적 극대화, 그리고 경제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관점에 근거하여 설명되어 왔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근대적 개념이며 무문시대의 변
동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것도 적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관점이 과거에 대한 깊
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검토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 서구고고학의 연구에서 그릇된 개
념들로 비판받고 있는 그러한 관점들이 한국 선사고고학에서는 암묵적인 전제로 자리 잡고 있
다. 이 시험적인 논문에서 필자는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는 변동을 해석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인 개념들로부터 벗어나 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전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방식을 제안하
고자 한다. 즉 한국 문화사 고고학의 관점에서 형식학을 토대로 조립된 해석, 근대 경제중심주의
개념, 그리고 개개인은 누구나 농업생산을 집약화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과정주의적 전제 등을
극복하려고 한다.
1. 무문시대 전-중기 전이 연구의 배경에 대한 약간의 검토
무문시대 전기의 취락에서는 다세대 확대 가족을 위한 몇몇 채의 대형 수혈주거지들이 간격
을 넓게 하여 군집된다. 중기가 되면 핵가족을 위한 소형주거지들이 간격을 좁게 하여 밀집되는
양상으로 주거방식이 바뀐다. 이 시기 노동력을 집중 투입하여 축조된 거석 분묘에서는 약간의
위세적 물품들이 부장된다. 이처럼 주거와 분묘에서 확인되는 양상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초보적
인 복합사회의 증거라고 말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시기 논과 밭 등의 수많은 경작지들은 현
대의 그것과도 상당히 닮아 있어 무문사회가 복합적임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고고학
계에서는 경작지의 형태를 형식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고고식물학적인 연구나
사회조직과 관련된 논문들이 영어로 작성된 바 있다. 하지만 의례나 관념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연구논문의 한쪽 구석에서나 겨우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국어든 영어논문이든 대부분의 연구
가 경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해석은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적이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
서 나오는 담론들도 그러하지만 한국고고학 자료의 해석도 근대 경제중심주의에 토대를 둔 인간
의도와 현실성에 대한 관념의 영향을 받아 왔다.
14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15
II. 무문시대 전-중기 사회변형에 대한 개념화의 문제
1. 집약화
한국의 경우 영구적인 경작지들이 대규모로 발굴되어 있기 때문에 집약적 농경과 관련된 물
질자료는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 봐도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브뤽(Brück)이 지
적했던 것처럼 “……경작지 시스템의 존재가 농업의 집약화를 의미한다고 하는 생각은 논란
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Brück 2000: 276). 사실 영구적인 경작지가 등장하기 이전 BC
900~850의 시기 동안 농업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무문시대 중기
의 농업체계보다 덜 발전되고 덜 효율적인 농경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문시대 유적
에서 발견되는 농경도구에 착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생업 활동에만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경작유구도 그 자체만으로는 당시 경제에서 농경의 비중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
경작지 체계가 생산 양식과 조직의 변화를 의미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투입된 자본 대비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브뤽은 말한다(Brück 2000: 277). 그는 물
론 영구 경작지의 구축을 선사시대 농업의 집약화와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구증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문시대의 인구에 대해서
는 거의 연구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지의 수에 따른 주거유적의 규모와 수를 계산하여
인구의 추정을 시도해 볼 뿐이다. 이와 같은 계측을 통해 우리는 무문시대 전기가 즐문시대 후기
보다 인구가 많고 무문시대 중기가 전기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논과 밭이 확인되면 한반도의 농경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상정
해 왔지만(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Lee G.A.에 의한 비판이 있었다[2011: 311, 327]), 이러한
생각은 문제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고고학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일본고고학의 사례
에 대해서는 Crawford 2011이 있음). 고고학자들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쌀농사라고 가
정하게 된 것은 과거를 오늘날의 현실에 투사해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쌀
이 주식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20세기 중반 어느 시점까지도 쌀은
여러 종류의 식량들 중 한 부분이었을 뿐이다. 쌀은 현대 한국 민족에게 생래적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체성과 같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무문시대에도 쌀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생
각하지만 고고학 자료에서 쌀의 비중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러한 전제는 근대의 지정학,
무역상의 문제, 동아시아에 있어서 근대 식민지의 역사, 그리고 민족주의적 자기주장과 연관되
어 있다고 생각된다.
송국리문화는 중기 및 후기 무문시대(BC 700~500/300)의 물질문화 현상을 가리키며, 한반
도 중서부에 위치한 표지유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Kim G.J. 1999, 2006; Kim J. 2003;
Kim, J.T. 2000; Lee J.C. 2000; Son 2005). 이 시기의 물질문화 요소로서는 주거지 바닥 중앙
에 타원형의 작업공을 가진 원형주거지와 외반구연에 장동형의 밋밋한 무문양의 토기, 그리고
유구석부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분묘 중 일부에서는 비파형동검이라든가 옥장신구, 그리고
마제석검과 같은 부장품이 발견된다.
한국의 무문시대 고고학 논문 중에서는 적어도 1990년대 이전까지 서구이론의 모델을 채용
한 연구를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오면 유적 발굴조사 자료가 급증하면서 소수의
연구자들이 인류학적 고고학의 관점을 이용하여 주거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e.g. Kim B.
2005; Kim G.T. 2002; Kim S.O. 1996). 김범철(Kim B.C. 2005)은 지표조사와 발굴 자료를 통
해 3단계의 위계조직으로 구성된 취락 체계를 입증하기도 했다. 토양의 관찰과 유적의 입지 분석
(O et al. 2005), 고고식물학(Bale 2006; Crawford and Lee 2003; Lee and Crawford 2002),
그리고 탈-과정주의 관점에서의 연구(Kim J.I. 2004; Ko 2009) 등도 볼 수 있게 된다.
무문시대의 연구에서 대평리유적의 조사가 지닌 학술적인 의의는 자못 크다. 한반도 중남지
역 안에서 이 대평리유적은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수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떤 유적에도 비교를
허락하지 않는다. 취락의 전체 면적과 주거지의 수로 보았을 때 주거의 유형을 두 등급으로 나눈
다면 한반도 중남부, 남강 상류역에서 대평리유적이 1등급 취락에 해당되고 나머지가 그 아래 2
등급에 속할 것이다(Bale 2011). 아울러 이와 같은 취락의 위계는 유적의 기능, 다중의 환호-목
책 시설, 옥을 부장한 분묘, 그리고 고상건물 등의 존재를 통해서 보강될 수 있다(Bale and Ko
2006; Ko and Bale 2008).
家口考古學 연구들 중에,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무문시대 전기 주거지에 대한 미야자토
(Miyazoto 2005)의 형식학적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수혈주거의 면적과 주거지 내부의 노지, 활
동구역, 그리고 주거지 외부의 수혈유구 등을 통계적으로 요약하면서 편년에 민감한 주거형식을
설정한 다음 3단계의 편년안을 제시하였다(Miyazoto 2005: 76~83). 사회조직의 단계적 변천
에 대한 그의 해석에 따르면 제I단계의 취락은 경작과 저장의 활동을 함께 하는 단일집단에 대응
되고, 제II단계에는 취락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 가구들이 개별적으로 노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무문시대 중기 전반에 해당되는 제III단계가 되면 주거와 저장의 공간이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취락이 재조직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Miyazoto 2005: 83~85).
그리고 일정 지역의 분묘자료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서도 복합사회로의 발전에 대한 모델이
제안된 바 있다(Choi 1984; Kang 1990; Kim J.B. 1979; Rhee 1984; Rhee and Choi 1992).
16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17
2. 경제성의 극대화
이송래와 최몽룡은 사회진화의 문제를 다루었던 영향력 있는 연구논문에서 적어도 BP 2300
년부터는 유력 개인이 등장하여 무문시대의 경제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Rhee and Choi 1992:
76~77). 이들은 경제성의 극대화를 전제로 한 프리드(Fried 1967)와 서비스(Service 1975) 및
그 밖의 연구자의 모델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 모델들은 수장들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효과적으
로 동원하고 확장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고 잉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무문시대의 행위자들이 과연 능동적으로 농업생산력을 극대화하고 자연을 과잉개
발하였을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를 통해 보면 그러한 전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무문
시대 행위자들이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단들을 개발하려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들은 지금 우리와 너무 다른 사회문화적 여건에서 살았다. 고고학 자료상에서 무문시대 행위자
들이 그들에게 소용될 식량보다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려 했다는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논과 밭 유구를 비롯하여 저장물이나 저장유구의 경우, 무문시대 농경인들
이 어떤 해에는 초과 식량을 생산했을 수도 있다는 간접증거가 될 만하다(Bale 2011). 물론 곡
물의 저장을 잉여와 직결시킬 수는 없으며 잉여는 초과생산과 직결되지 않는다. 이론상 잉여는
엘리트들이 농부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초과분의 수확물로서 엘리트 행위자들은 그들의 권력, 위
세, 그리고 추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잉여를 사용하고 재분배한다. 하지만 무문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실치 않다. 사실 그와 같은 전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통용될 법하다. 하지만 여러 민족지 자료를 통해 볼 때 비서구사회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작동
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Hodder 1982: 202~203; Ingold 1996a, 1996b).
남한 지역의 주거군 중에 1등급의 유적에서는 대단히 많은 수의 수혈유구가 대용량의 토기와
함께 발견되기도 하며 저장의 불평등성을 상정해 볼 만한 양상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들을 통해 농경민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했는지에 대해 알 수는 없으며 당시 엘리트들이 수
확기에 잉여를 확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말해 주는 것은 없다. 주어진 고고학 자료를 통해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바는 당시 때때로 초과 수확물이 생산되었고, 그래서 무문시대 중기에
잉여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양도 많지 않고 간헐적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당시 농경민
들이 정규적으로 초과 수확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아마 대용량의 토기와 같은 저장관련 유물
이나 단면 플라스크형 수혈과 같은 저장시설이 훨씬 더 많이 확인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독립된 수혈유구도 필자가 조사했던 유구보다 훨씬 더 커야만 한다(Bale 2011).
고고학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 대평리의 밭유구들은 상향식 과정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결과
여러 종류의 곡물들이 재배되었다는 사실이 고고식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고고학자들은 다른 작물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쌀농사를 강조하고는 한다(Ahn 2010; Bale
2011; Lee 2003). 쌀을 우선시하는 전제는 기장, 두류, 밀, 보리 그리고 이를테면 명아주와 같이
재배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는 식물들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
게 된다. 이경아의 고식물학적 연구에 의해 무문시대의 개시기보다 훨씬 이전 시기인 BC 3500
년이나 그 이전부터 여러 작물이 재배되었음이 분명해졌다. 이경아는 남강유역의 유적들에서 많
은 수의 표본을 추출했고 그 시료를 통해 이 지역에서 농업의 집약화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를 얻었다(Lee 2003). 그러나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진 작물재배가 모두 필연적으로
집약적인 농경으로 발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관찰된 결과
가 무문시대 남한 전역을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평리유적에서는 32ha가 넘는 면적의 밭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그 경작지가 그곳에 거주한
주민 전체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했는가 하는 문제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문시대의
논이 발굴된 다른 유적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밭유구에 비하면 논의 면적은 비교적
소규모인데 이 점이 쌀의 비중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과연 쌀은 무문시대 농경인의 식단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던가? 논과 밭 유구의 형태, 규모, 그리고 국지적인 환경 등을 분석해 보면
분명 무문시대의 농업 집약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무문시대의 모든 주거유
적에서 논과 밭 유구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거유적이 형성되는 과정의 차이나 발굴조
사의 여건에 따라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지만 발굴조사자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주의하지 않
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경작활동에 동원된 석기유물군을 통해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식량
생산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된다. 하지만 그것이 남한 전역에서 영구 경작지를 중심으로 집약적
인 농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한편 한반도 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구 경작지에서의 집약적 농경과는 반
대의 경작형태, 예컨대 화전농사이나 텃밭농사가 시행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남강 중
류역의 여러 경작지들은 인접한 구역으로 묶여 구획된 상태로 확인된다. 그중에는 텃밭 수준에
불과한 규모로 구획된 경작지도 있다. 이처럼 소규모로 구획된 밭의 존재는 개별 家口에서 자체
적인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했음을 의미할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왔던 집약적인 농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평리유적에
서 확인된 것과 같은 대규모 경작지도 개별 가구들이 자신의 식량을 생산하려고 경작했을 가능
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8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19
1991; Scarborough 1991).
3. 경제적 개발
우리가 개발이라는 용어를 고고학에서 사용하는데 그 관점이 문제시되고는 한다. 깊은 과거
의 인간집단들이 지닌 욕망을 경제이론에 맞추어 보거나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란 차원에서만 이
해하려 하는데 이는 결코 보편적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브뤽은 진화주의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
점을 비판한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자연을 역사로부터 분리시켜 객관화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제하고 조작하는 대상으로만 이해하여 인간과 경관의 사이를 일방적인 관계
로 파악하게 한다.”는 것이다(Brück 2000). 우리에게 주어진 깊은 과거에서는 인간집단의 욕망
이 경제이론에 맞추어지거나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란 차원에서만 이해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문시대의 고고학 자료를 검토할 때 당시의 개인이나 집단들이 지금 우리가 자연과 인
간(문화) 세계를 분리해 보는 것과 꼭 같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팀 인골드
(Ingold 1996b)를 빌려 말한다면, 객관화, 탐구, 개발, 정복, 순화의 대상으로 그들 소유의 세계
라는 관점은 無文時代人들의 세계관과는 다를 것이다.
4. 무문시대의 합리성
선사시대 사회의 수많은 활동들이 현대 서구적인 방식을 따라 조직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
실을 고고학자들은 인식하고 있다(Bradley 1990; Brück 2000:280). 무문시대 생활의 어떤 측면
들은 현대 경제주의 관점의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고 고고학자들이 威勢나 富의 아이템
이라고 이름붙인 것들에 대해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
어 무문토기시대 행위자들이 알려진 고고학 유적과 관련 없이 그저 강가의 어느 곳에 귀중한 청
동물품들을 묻어 놓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Lee S.K. 2000). 松竹里유적에서는 지석묘의 전
면, 유구와 수 미터 이격된 지점에 비파형동검이 꽂힌 상태 그대로 발견된 사례도 있다(KHSUM
2007).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고고학적 맥락에서는 청동유물이 상위신분의 분묘에서 일종의 위
세적인 부장품으로 출토된다.
만일 교환이나 기술, 혹은 건축기법과 같이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의 활동에서도 서로 다
른 문화적 가치를 따른다면 농업 생산이나 조직의 이면에 작용하는 논리와 이유도 현대 우리들
의 기대치와는 상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과연 무문시대의 주민들이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경
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농사일을 기획하고 조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
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엘리트의 가구와 비엘리트의 주거가 밭유구 너머에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수확과 경작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는 석기들이(이를테면 반월형석도와 밭을 일구거나 밭갈이
하는 석기 등) 대평리유적 전역에서 주거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상당히 균등하게 나오고 있어서
농사일을 하는 집단과 일부 하지 않는 집단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엘리트들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의 방식으로 중추적인 권위가 농경을 기획하고 조직하
였다면 밭유구들은 일관되고 질서 잡힌 경작행위를 반영하는 그런 구조와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의 조사 성과(Yun and Ko 2006; Bale 2011; Ko and Bale 2009)
를 보면 밭의 형태적인 변이에는 무언가 규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대평리유적에서 밭
유구들은 규모와 형태에서 서로 다르다. 수평 및 수직 발굴법으로 밭유구의 고랑과 이랑을 조사
해 본 결과 밭의 조성과 밭갈이가 장기간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Yun and Ko 2006). 고랑과 이랑의 세트들은 각각 그 길이와 폭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
문에 규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랑과 이랑을 다시 일굴 때마다 일직선으로 곧게 밭을 가
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농사철마다 밭을 일구는 방식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무문시대 일상
의 농사는 상당히 변칙적이고 일관성 없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평리유적의 밭유구가 불
규칙하고 일정한 형태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가구 수준의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결정에 의해 일
상적인 농사일이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대평리유적에서 밭을 조성하고 유지해 나간 방식을 에릭슨에 의해 소개된 볼리비아의 티티
카카湖 지역과 페루의 높게 조성된 밭(Erickson 1993)과 비교해 보면 노동력의 양에서 훨씬 미
치지 못함을 알게 된다. 랜싱(Lansing 1991)이 그 특징을 설명했던 발리의 관개시설과 비교해도
그러하다. 大平里유적의 경작지는 티티카카 호수지역의 사례처럼 단을 올려 조성한 것도 아니고
관개시설이라고 해 봐야 漁隱지구에서 확인된 밭유구를 위한 도랑 한 줄이 전부이다.
대평리유적의 밭유구에 대한 考古民族誌植物學的 연구결과는 농사는 매년 二毛作을 했
고 휴경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밭유구가 자연적으로 조성된 습지
성 수로 가까이에 있음에도 관개수로나 도랑 혹은 다른 導水施設이 없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이러한 특성은 당시 농사일은 각 가구의 수행자가 개인 혹은 집단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조직
하고 경영할 수 있는 정도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물의 자연스런 흐름에만 의존하여 경작지에 물
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경작유구가 조성되고 유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무문시대의 밭
농사는 전 세계의 고고학 자료와 민족지 사례에서 발견되는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했
을 것으로 파악된다(Crawford and Lee 2003; Kwak 2001; KNUM-MNUM nd1, nd2; Lansing
20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21
한다면 무문시대 전기 행위자들은 특정한 집, 그리고 거주 장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정
당화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극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주거지는 하나의 튼튼한 구
조물이기 때문에 무문시대 전기 행위자들은 집단들 사이의 문제보다 집단 내부의 문제와 家事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두었다. 그러므로 화전경작지나 그 밖의 국지적인 자원의 활용에 대한 권한
은 한 집에 공동 거주하는 구성원들에게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多重環濠로 둘러싸인 유적
이나 환호취락과 같은 특수 기능유적은 전기 전반(BC 1350~1100)부터 나타나지만 그 수는 극
히 한정된다.
무문시대 전기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와 화전경작지를 포함한 국지적 경관과 영속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은 그러한 유대를 통해 성립하였을 것이
다. 유적-간을 비교해 보고 유적 내부의 양상을 통해서도 어느 유적에서나 확인되는 유물은 거의
다르지 않으므로 작업 관련의 특수 유적으로는 화전경작지 정도가 있을 뿐이며 사회적 인격은
매우 정체적이고 경직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거지의 바닥, 노지, 기둥구멍 등은 아주 뚜렷한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로쿼이족이나 휴런족의 세장방형주거지처럼 주거 내
부에서 한 가구의 생활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 개별가족의 구획시설과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무문시대 전기 후반이 되면 주거지의 내부가 형태적으로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부
터 대용량의 토기를 안치해 놓은 얕은 수혈들이 주거지 한쪽에 자리 잡게 된다. 일부 수혈들은
노지에 가까운 주거지의 장벽을 따라 나란히 발견되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수혈들이 장축과 직
교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주거지의 바닥면을 서로 다른 구역으로 분할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
식으로 수혈들이 배치되기도 하는데 출입시설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주거지의 가장 안쪽 단벽을
따라 배치된 경우가 그것이다. 끝으로는 그와 같은 구덩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거나 일절 없는 주
거지도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저장, 음식의 준비와 관련된 일상적인 실천과 거주
집단 내부의 관계에 대하여 무언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 내부가 어떻게 구조화되
느냐에 따라 가구 안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보면 무문시대 전기의 행위자는 주거지 내부를 중심으로
하여 유적 내부의 수준에서, 특히 확대 가구들 사이에서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재생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특히 무문시대 전기 후반 주거지 내부의 공간 조직은 사회적 관계의
협의와 재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였음이 분명하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무문시대 전
기 후반에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규모 취락이 등장하면서 주거지 공간 내부의 구조화 정도가 증
제적인 전략을 고안해 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앞서 필자가 제시한 저장 행위나 농
업생산의 조직과 같은 증거들은 무문시대인들에게도 경제적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말해 주
지만 그것이 현대의 고고학 논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III. 무문시대 전-중기 이행에 대한 재검토
지금까지 한반도 및 다른 지역의 선사시대에서 보이는 집약화에 대한 연구관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제 관련 자료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무문시대 전기: 확대 가구
무문시대 전기 주거유적은 대체로 적은 수의 가옥으로 구성되며 주거지의 면적은 비교적 큰
편(40~80㎡ 혹은 그 이상)이다. 그리고 복수의 노지가 존재하여 다세대 복수의 가족이 거주했
음을 암시한다. 저장혈과 같은 시설은 주거지 내부에 위치하며 그 밖에 주거지 안쪽이나 그 둘레
에서는 다른 종류의 유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각 주거지마다 발견되는 유물의 수와 종류는
대동소이하고 유적과 유적 사이에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전기의 기간 동안 분기별로 앞선
시기와 다음 시기의 차이도 거의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시 인간 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주거
지, 취락, 그리고 지역의 수준에서 비교해 보면 대체로 동일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증거에
기초해 본다면 한 주거지에 공동 거주하는 집단의 구성원은 정태적이고 임무에 따른 집단의 분
화에도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들은 개별 주거 혹은 주거군을 형성
하는 성원들로 구성되고 성과 연령에 따른 구분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무문시대 전기 주거유적의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과 극소수의 다른 유구, 즉 수혈유구 및 환
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의 수혈주거지는 상당한 구조물이고 보수하고 확장하면서 적
어도 두 세대 정도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세대 이상 사용된 주거지는 바닥면이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 있어 단면상에 그 증거가 드러난다. 일부 주거지들은 집의 바닥면적을 확장한
경우가 있는데 공동 거주하는 구성원 중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주거면적을
늘렸을 것이다.
무문시대 전기 후반이 되면 대규모 주거유적들 중 일부는 같은 유적 범위 안에 새로 주거지
를 재건축 혹은 중복시켜서 오래된 주거지 위에 중첩시킨다. 브뤽(Brück 2000)을 따라 이야기
22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23
말하자면 무문시대 중기의 개별 주거군에 소속된 행위자들은 그들 자신이 사회 내 다른 집단과
그 어떤 면에서 구분됨을 강조했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무문시대 중기 수혈주거지의 평면형은 抹角方形이나 圓形이다. 주거지의 바닥 면적이 무문
시대 전기의 주거지에 비하면 훨씬 작아서 보통 30㎡ 이하에 해당된다. 노지는 보통 주거지군마
다 적어도 하나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각의 주거지에 하나의 핵가족이 거주한다고 본다면 무문
시대 전기 한 家口의 단위는 하나의 주거지가 아니라 주거지군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住居址群 內의 주거지 각각은 어쩌면 젠더, 연령, 혹은 임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거주했을 가
능성도 있다. 무문시대 전기와 중기의 가구 구성을 비교했을 때, 개별 핵가족이 집에 거주하는
방식의 측면에서는 두 시기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기 무문시대의 대형 장방형주
거지에 거주했던 다세대의 확대가구가 무문시대 중기에는 주거지군에 거주했던 것은 물론이다.
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가구의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사회진화론의 모델의 입장에서 검토한 일부 연구에서는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구의 구성이 변한 이유를 首長의 출현으로 보고 그가 농업생산의 잉여와
다른 수공품 등을 超-家口的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Deboer 1988; Rogers
1995). 하지만 무문시대 중기에 확대 가구의 구조 안에서 핵가족의 독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아마 의사결정 권한도 커지게 되는 재구조화에는 무언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이
와 동시에 개별 주거지들이 주거지군을 형성하여 아주 밀착해 있는 것을 보면 핵가족은 확대가
구의 구성원들과 강한 사회적인 유대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대가구를 단위로
하여 음식의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음식은 주어진 주거지군 내의 노지 둘레에서 나
누어 먹었을 것이다.
주거지들의 공간 조직은 사회적 협상과 재생산의 매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시의
사회관계에 대해 무언가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무문시대 중기 주거지의 내부 구조에서 시
설 한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표준화된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 없다. 가령 출입구는 고고학적으로
거의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있더라도 방향은 서로 달랐을 것이며 노지의 경우 주거지 내부
에서 발견되는 일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주거지 바닥 중앙의 타원형의 얕은 구덩이와 그에 인
접한 기둥구멍은 일관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주거지의 내부에서 이루
어진 가구내의 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분석해 보기에는 증거가 빈약하다. 다만
타원형 구덩이의 경우, 석기의 제작과 보수의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숫돌의 고운 분말이
얇은 층을 이루어 발견되고 있다. 무문시대 중기 주거지의 바닥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유물 중
에 하나는 석기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부러진 석기, 미완성 석기, 몸돌, 그리고 석기 제작용 도구
가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젠더와 연령에 따른 역할에서 경쟁관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 무문시대 중기: 주거군에 나타난 핵가족
전기와 중기의 주거유적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면 중기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두
종류의 취락 즉 1등급 취락과 2등급 취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기의 2등급 취락은 전기의 취
락과 비교해 봤을 때 기능적으로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주거지의 전체적인
수가 달라지고 그 밖의 유구들, 이를테면 수혈이나 노지, 구상유구 등이 추가된다. 이러한 유구
들은 2~6동, 혹은 그 이상의 주거지가 분포하는 마을의 어느 한 장소에 무리를 이루어 발견된
다. 음식 준비용 토기와 식량 저장용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하천에서 어로 작업에 쓰이는 토
제 어망추, 그리고 다양한 석기와 석기 가공용 도구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2등급의 취락 각
각에서는 공통적인 일상의 생활과 생산의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단도마연토기와 같
은 위세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2등급 취락과 관련 있는 분묘에서도 소량이지만 자주 출
토된다.
1등급 취락은 최대 다수의 주거지와 기타 유구들이 밀집된 주거유적으로 정의되며 흔히 볼
수 있는 유적은 아니다. 이 취락은 보통 환호와 목책과 같은 유구를 가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공간이 분리되고, 특수기능의 건축물과 영구 경작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1등급 취락은 2등급의
취락이나 무문시대 전기의 취락과는 다른 성격의 유적이다. 이 1등급 취락은 그것이 가진 경제적
그리고/또는 의례적 중요성 때문에 보통 중심취락, 혹은 거점취락이라고 일컬어진다(Bae 2009,
Kim YM 1998).
1등급 취락과 2등급 취락 모두 유구의 공간적인 배치에 따라 유적 내의 특정 공간들이 어떻
게 이용되고, 의미부여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평리, 송국리, 이금동, 초전동과 같은 1
등급 취락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 이러한 취락 안에서는 주거구역의 내부 혹은 그 둘레
에 일정한 공간들이 마련되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이 범주화되고, 정의되고, 조직됨
으로써 공간들의 기능 혹은 의미, 그리고 공간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창출된다. 물론 모든 공간들
이 울타리나 구와 같은 것으로 둘러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1등급이나 2등급 취락 모두, 주거지
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간적으로 구분된다. 가령 주거군을 에워싸는 여러 종류의 구획유구
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거군 사이에 이른바 空白을 두어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주
거군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집단의 정체성, 완결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호독립성을 나타낸다.
24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25
의 분묘군이라고 할 수 있다.
무문시대 중기의 분묘 중에는 냇돌로 축조된 장방형 혹은 원형의 석축 묘역을 가진 것이 많
다. 이 지석묘의 석축 묘역들 가운데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아주 정교하게 건축된 것이 있다. 이
와 같은 대형의 묘역식 지석묘들은 묘역과 상석의 크기가 관건이었지만 중기 후반으로 가면서
지하 매장시설의 깊이가 더욱 중요해진다. 석축묘역의 평면형에는 당시 실제 건물, 즉 원형 수혈
주거지와 장방형 고상건물의 평면형이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 무문시대 중기의 일부 분묘
에는 단도마연토기, 마제석검, 옥제 장신구, 그리고 이따금씩 비파형동검 등과 같은 威勢遺物이
출토된다. 이처럼 무문시대 중기의 행위자들이 분묘를 축조하고 부장품을 마련하기 위해 동원한
노력으로 볼 때 당시 매장의례의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마도 가까운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훨씬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구연부가 약간 외반하는 丹塗磨硏壺는 무문시대 전기와 중기에 걸쳐 가장 흔한 부장유물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봉헌행위는 공통된 의례활동을 통해 매장의례의 이벤트에서 친
족집단들 사이의 연대를 창조해 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무문시대 중기부터는 단도마연토기 외
에 다른 종류의 威勢的, 혹은 非威勢的 부장유물들의 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석축묘역의 가장자
리를 따라 목탄과 단도마연토기의 파편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확실히 제단으로 인식되었
던 것이 분명한 것 같다. 특히 大平里 3號墓의 부장양상을 보면 무문시대 중기의 葬送 이벤트에
서 단도마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해진다. 이 유구에서는 단도마연토기편과 목탄이 圓
形의 石築墓域을 가로질러 석재들 사이에서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다(GARI 2002). 마제석검과
옥제 장신구들이 부장유물로 출토되는 점을 통해서도 집단-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
한 유물들은 당시의 교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가까운 확대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遺蹟
-內, 혹은 遺蹟-間의 규모로 집단이 관계망이 형성되었음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제1등급 취락의
발생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검토해 보았지만 현재의 자료만을 가지고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청동유물들이 부장품에 추가되는 것은 마제석검이나 옥제 장신구의
교환 범위를 넘어서는 원거리 교환망의 형성과 관련될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검토
무문시대의 고고학 자료에서 파악되는 주거 및 분묘의 변화양상을 통해 우리는 소집단에서
대집단으로, 그리고 낮은 수준의 식량생산에서 영구 경작지를 통해 기반이 구축된 농업생산으로
등이 있다. 이 시기의 거의 모든 주거지에는 타원형 작업공을 가지고 있고 이 시설은 두 개의 기
둥구멍과 함께 주거지 바닥의 정중앙에 배치된다. 석기의 제작과 유지보수, 석기를 사용한 작업
등과 관련된 활동이 일상적 생활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 까닭으로 이해된다. 주거
유구의 이러한 양상은 당시 가구집단의 유지와 재생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개념과 가치 등이
사회적 담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
3. 시간과 공간상의 결합과 분리
앞서 말한 것처럼 1등급 주거유적의 한 특징은 건축물의 구축과 사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구조화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무문시대 전기의 주거유적이 만들어 낸 공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문시대 중기의 1등급 유적에서는 주거지군, 수혈유구, 환호, 목책, 대형의 고상건물과 같은 특
수건물, 그리고 공백 등의 공간적 배치는 그 안에 사는 개인과 집단들 상호간의, 그리고 환경과
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만들어 간다. 무문시대 전기 후반의 개별 주거지들은 비교적
간단히 공간적인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주거유적 자체는 공간적으로 분화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
면 무문시대 중기의 1등급 주거유적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적인 분화가 이루어지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공간에 대한 협상이 매우 복잡했을 것이다.
4. 무문시대 중기 매장의례
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분묘유구에 나타나는 변화의 뚜렷한 경향은 그 규모가
커지고 공이 더 많이 드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두 시기에 걸쳐 분묘유구가 많이 발견되
지만 무문시대 전기 분묘의 대다수는 단독으로 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른 시기의 단독 분묘
는 하나의 場所-標識物로서 혹은 記念物로서 경관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문시대 중기가 되면 넓은 묘지가 마련되고 엄청난 수의 지석묘와 석관묘가 밀집되
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 중기의 墓地에는 아무래도 친족 혹은 혈통집단의 분묘군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의 家口들은 죽은 이들을 묻어 주기 위해 자신들만의 묘지를 마련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 2등급 취락을 포함한 대다수의 일등급 취락에는 분묘군이 조성되었다. 영국
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분묘군과 같은 방식으로(Garwood 1991; Mizoguchi 1992), 대평
리, 이금동, 그리고 덕천리와 같은 유적에서는 매장유구들이 선형으로 이어지는 분포를 보여 주
고 있어서 이 유적들은 무문시대 중기의 확대 친족이 적어도 두 세대 이상 사용하였던 가족관계
26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27
있다. 무문시대 전기-중기의 이행기에 경제적인 욕구가 변동의 필연적인 主動力은 아니었을 것
이다. 브뤽의 견해(Brück 2000: 294~295)를 따라 필자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영구적 농경지
체계의 출현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문시대 중기의 취락에서는 개별 핵가족이 거주했던 소형 주거지들로 주거지군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한 가구를 구성했던 핵가족들은 주거지군 내에서 다른 구성
핵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자율성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각 개별 가구들은
집약적인 농경으로 통해서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어 갔고 어떤 면에서는 自足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 나아가 무문시대 중기의 행위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통제력을
더욱 확장하려고 애쓴 것 같다. 예를 들면 농경지 체계의 출현이 그러한 시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세계에 대한 통제력, 예측가능성, 순화(domestication)의 수준을 높여 주는 어떤
틀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낸 것이 바로 경작지 체계이며 이는 생계활동의 규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보다 긴밀히 통제하려는 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2. 고고학적 증거인가, 아니면 미묘한 그림인가?라는 상반된 입장
일상적으로 유지되는 활동들을 섬세하게 짜 나갈 수 있도록 축조된 건물은 사회의 파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Barrett 1994; Brück 2000). 무문시
대의 경우, 일상적으로 유지되는 활동은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인 핵심지대를 형성한다.
더 넓은 맥락의 자료로 나아가 주거지군에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활동에 어떤 경향
성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지속적인 사회통합이 살펴진다. 핵가족과 주거지군의 확대 가구, 그
리고 전체 취락공동체 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일상생활의 긴장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은
분해의 문제로 파악된다.
3. 사회 통합과 시간-공간의 질서
사회적 역할의 부여는 분할, 묶음,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통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
한 것은 특정한 시간-공간적인 맥락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Foucault 1077;
Thomas 1993). 무문시대 중기의 더 크고 더 外現化된 사회집단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맥락
에서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무문시대 중기에 이루어진 사회통합의 맥락
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무문시대 전기의 사회적 실천이 그 열쇠가 된다.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세대의 복수가족이 공동 거주했던 전기의 주거지는 개별가족들이 따
로따로 거주하는 주거지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주거지들이 모여 하나의 군을 형성함으로써 이
주거지군에는 다세대, 복합가족으로 구성된 가구가 거주했다. 확대 친족과 교환의 네트워크는
무문시대 중기에 접어들어 1등급 취락의 출현과 발전을 낳았다. 특히 매장의례에 표현된 혈통의
이념이 등장하는 것은 무문시대 전기 후반이며 무문시대 중기 동안 발전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다세대의 공동거주 집단은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들이 중기
로 넘어가면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은 가구 집단이 무문시대 중기에 재구
성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대규모 취락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싹트게 된다. 多重 環濠와 목책의 구축과 특수 건물의 등장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보여 주었고 나아가 집단들 사이의 관계에서 작동
하는 의식도 변화시켰다. 遺蹟-間의 수준에서 상위 계급의 행위자들 사이에 연결망과 같은 것이
성립되었다고 보는데 아마 동검의 교환은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遺蹟-內
의 수준에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무문시대 중기에 밭유구를 개간하고 경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서 복수의 가구집단들이 공동으로 노동했을 것임이 분명해진다. 물론 개별 가구들이 자신의 독
립성을 주장하려 했고 일부 경작지들은 일정구역으로 분할되는 양상이 고고학 자료상에 뚜렷이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개별 가구들은 연중 이러저러한 시기에 농업생산을 위해 협
동하였으며 서로 의존적이었던 것 같다.
1. 경제가 아닌 해석: 생업의 변동과 사회 통합의 효과
이 논문의 서두에서 필자는 무문시대 전기-중기의 이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고고학 자료
상에 더 잘 보이는 형식학적, 생태적, 경제적 측면의 변화만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잘 보존된 밭유구와 논유구와 같은 양호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문시대인의 생업에 대해 일방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가령 이 시기의 수많은 유적으로부터 확인된 경작지들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농업생
산의 극대화를 위한 의도만을 찾으려 했다. 그보다는 사회 구조화의 변동, 새로운 사회 정체성의
구축, 그리고 집단-간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식에 관해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하나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근대서구의 경제적 술책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리고 그로
부터 결정론적 설명을 끌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생업 활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의 틀을 준비할 수
28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29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그 결과 그것이 현실이든 아니면 상상일 뿐이든 일상
생활에서 가구의 독립과 통합에 대한 지각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질서잡기의 의도를 또 다른데서 찾는다면 개인이 사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일상적인 실천으로부터 작업이 일상화
된 결과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는 예측가능하고 일종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확보된다
(Giddens 1948: 51~92). 이러한 방식으로 일상화는 개인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특정
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대처법과 다루는 법을 알게 해 주었다. 공간이 분리되거나 묶이게
될 때 의미가 창조된다. 그런 다음 일상화를 거치게 되고 개인을 일상적인 실천으로 안내하고 그
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주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무문시대 개인행위자들에게 제1등급 취락 밖
의 세계는 그런대로 예측가능하고 탐험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V. 결론
무문시대의 고고학은 1990년대 중반부터 큰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 시기동안 엄청난 양의 발
굴조사 자료가 축적되었다. 무문시대의 연구는 한국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깊
은 과거의 물질문화의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
다. 우리 모두는 고고학의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사고고학이나 과정주의 고고학의
연구 방식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있지만 체계론적인 접
근과 이론적인 모델도 사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접근법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북아메리카에서는 과정주의 대 탈-과정주의의 논쟁이
식어버린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다음 고고학자들은 특정한 고고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탈-과
정주의, 혹은 해석학이라고 이름붙인 접근법을 적절히 활용하고는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가 사회적 전이의 일반과 특수한 무문시대의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일부 문제의 접근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도한 논의들은 단지
시험적인 것이라는 점을 다시 주지시키고자 한다. 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기에 사회적
인 통합이 진행되었음은 분명하지만 무언가 파편화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경향이
있음에 대해 필자는 강조하였다. 고고학 자료가 큰 흐름에 대한 증거를 보여 준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 매끈하게 한 방향으로 맞추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轉移란 여러 가지로 예증된다. 가령 丹塗磨硏土器와 함께 몇 점의 유물이 함께 나오는 분묘
에서 옥제 장신구, 마제석검, 청동검, 그리고 단도마연토기가 같이 나오는 분묘로의 전이가 있
다. 우리가 무문시대 중기와 즐문시대 후기 그리고 무문시대 전기를 비교해 본다면 즐문시대에
는 몇 점의 유물이 부장되거나 전혀 없는 등 일정한 분화가 살펴지지 않는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러나 무문시대 전기 후반이 되면서 대평리유적의 玉房 8地區 분묘와 같은 거석분묘들에서
는 분묘들 사이의 공간적인 관계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읽혀지고 사천 이금동유적과 같은 무문시
대 중기의 분묘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된다. 옥방 8지구의 분묘에서는 단도마연토
기의 부장을 통한 의례가 거의 전부였고 간단한 석관묘와 장방형의 구조물로 에워싼 2기의 석관
묘에서 보는 것처럼 분묘 건축을 통해 드러내려 한 것은 단순-복잡의 이분론에 그친 듯하다.
하지만 사천 이금동유적(GARI 2003) 및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다른 유적들에서는 거석
분묘의 석축묘역이 서로 연접되면서 100m 길이에 달하는 분묘벨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확대친족
집단의 중요도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금동유적에서 출토된 두 점의 비파형동검은
원거리의 교환망과 유적-간의 수준에서 형성된 상위계급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망의 존재를 예증
해 준다. 또한 溝狀遺構, 목책 그리고 비건축적 방식에 의해 유구들이 분리되거나 서로 묶이는
제1등급 취락유적의 출현은 사회관계에 대한 질서의 재부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
을 강화해 나갔다고 본다.
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은 구질서의 공간적인 해체 및 재조직화와 함께 家口 構造
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포함하며 이는 건축과 공간패턴의 변화에 표현되어 있다. 家口
의 권력 균형이라는 구조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위에서 시간과 공간에 질서를 부여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발전되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사회적 갈등은 아마 백석동유적에
서와 같은 대형주거지에서 분출되었을 것이다. 주거지에 따라 곡물저장과 음식 준비를 위한 공
간의 내부 분할이 있는 주거지와 그렇지 못한 주거지가 있듯이 어떤 일부 주거지에는 곡물이 저
장되고 다른 주거지는 그렇지 못할 때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무문시대 중기에 들어서면
가구 구조의 질서를 재설정하게 된다. 이때 분리를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제도적 측면의 개념을
강조해 두었으며 밀착성을 감소시켜 가까운 친족끼리의 공동생활을 해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사실 무문시대 전기 후반부터는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상적 실천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과정은 진화되어
갔다. 하지만 공동거주의 패턴으로 확인되는 가구 생활의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요소는 보다
개념적인 측면들과는 잘 결합되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무문시대 중기의 패턴에서는 가구 생활
의 제도화된 개념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전이가 발생한 이유는 공동거주의 심리적
30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31
Buldang-dong Site, Cheonan], Archaeological Site Report No. 9. CHCC, Gongju.
Crawford, G.W., 2011, Advances in Understanding Early Agriculture in Japan, Current Anthropology 52(S4):
S331-S345.
Crawford, G.W. and G.A. Lee, 2003, Agricultural Origins in the Korean Peninsula, Antiquity 77(295): 87-
95.
DeBoer, W.R., 1988, Subterranean Storage and the Organization of Surplus: The View from Eastern
North America, Southeastern Archaeology 7(1): 1-20.
Erickson, C.L., 1993, The Social Organization of Prehistoric Raised Field Agriculture in the Lake
Titicaca Basin, In Economic Aspects of Water Management in the Prehispanic New World, edited by V.L.
Scarborough and B.L. Isaac, pp. 369-426, JAI Press, Greenwich, Connecticut.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Random House, New York.
Fried, M.H., 1967,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 An Essay in Political Anthropology, Random House, New
York.
Garwood, P., 1991, Ritual Tradition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ety, In Sacred and Profane: Proceedings of
a Conference on Archaeology, Ritual, and Religion, Oxford, 1989, edited by P. Garwood, D. Jennings, R.
Skeates, and J. Toms, pp. 10-32. Oxford University Committee for Archaeology Monograph No.
32, Oxford.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GUM (Gongju University Museum), 1998, Baekseok-dong Yujeok [The Baekseok-dong Site], GUM, Gongju.
GARI (Gyeongnam Archaeological Research Institute), 2002, Jinju Daepyeong Okbang 1-9 Jigu Mumunsidae
Jibrak [The Mumun Period Settlement at Okbang Localities 1 and 9 in Daepyeong, Jinju], GARI,
Jinju.
_______, 2003, Sacheon Igeum-dong Yujeok [The Igeum-dong Site, Sacheon], GARI, Jinju.
Hodder, I., 1982, Towards a Contextual Approach to Prehistoric Exchange, In Contexts for Prehistoric
Exchange, edited by J.E. Ericson and T.K. Earle, pp. 199-211, Academic Press, New York.
Im, Y.J., 1985, Umjip-ui Bullyuwa Byeoncheon [Classification and Transition in Pithouses], Hanguk
Kogo-Hakbo [Journal of Korean Archaeological Studies] 17-18: 107-162.
Ingold, T., 1996a, The Optimal Forager and Economic Man, In Nature and Society: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ited by P. Descola and G. Palsson, pp. 12-24, Routledge, London.-------, 1996b, Growing
Plants and Raising Animals: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Domestication, In The Origins and
Spread of Agriculture and Pastoralism in Eurasia, Edited by D.R. Harris, pp. 12-24, UCL Press, London.
Kang, B.W., 1990, A Megalithic Tomb Society in Korea: A Social Reconstruction, Unpublished M.A.
thesis,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Kim, B., 2005, Ric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and Sociopolitical Development in the Bronze Age,
Central Western Korean Peninsul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oquest, Ann
참고문헌
Ahn, J.H., 2000, Hanguk Nonggyeongsahoe-ui Seongnip [The Formation of Agricultural Society in
Korea], Hanguk Kogo-Hakbo [Journal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43: 41-66.
_______, 2001, Junggi Mumuntogisidae-ui Chwirak Gujo-ui Jeoni [Characterizing Middle Mumun
Pottery Period Settlements], Yongnam Kogohak [Yongnam Archaeological Review] 29: 1-42.
Ahn, S.M., 2010, The Emergence of Rice Agriculture in Korea: Archaeobotanical Perspectives,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2(2): 89–98.
Bae, D.H., 2000, Yeongnamjibang Cheongdonggishidae Hwanhochwirakyeongu [A Study of Bronze
Age Ditch-enclosed Settlements in the Yongnam Region], Unpublished M.A. Thesis, Dong-A
University, Greater Busan.
_______, 2005, Cheongdonggisidae Yeongnamjiyeok-ui Jugeo-wa Maeul [Settlement and settlements
of the Yeongnam region], In Yeongnam-ui Cheongdonggisidae Munhwa [The Bronze Age Culture of
Yeongnam],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Yongnam Archaeological Society Meetings: 71-108,
Yongnam Archaeological Society, Daegu.
_______, 2009, A Study on the Dwellings in Southern Youngnam Region in the Bronze Ag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Dong-A University, Greater Busan.
Bale, M.T., 2006, Ulsan Gulhwa-ri Janggeom II Chwirak Yujeok Sikmulyuche Bunseok [Plant Remains
from the Janggeom Site II, Gulhwa-ri, Greater Ulsan], In Ulsan Gulhwa-ri Janggeom Yujeok II [The
Janggeom Site, Gulhwa-ri, Greater Ulsan]: 339-346, Research Report of Antiquities, Vol. 36.
Uls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Greater Ulsan.
_______, 2011, Storage Practices, Intensive Agriculture,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2903–2450 Calibrated Years B.P.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Bale, M.T. and M.J. Ko, 2006, Craft Production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Asian Perspectives 45(2): 159-187.
Barrett, J.C.,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An Archaeology of Social Life in Britain, 2900-1200 BC, Blackwell,
Oxford.
Bradley, R., 1990, The Passage of Arms: An Archaeological Analysis of Prehistoric Hoards and Votive Deposi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Brück, J., 2000, Settlement, Landscape and Social Identity: the Early-Middle Bronze Age Transition in
Wessex, Sussex, and the Thames Valley,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19(3): 273-300.
Choi, M.Y., 1984, A Study of the Yongsan River Valley Culture: The Rise of Chiefdom Society and State
in Ancient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CHCC (Chungcheong Nam-do Historical-Cultural Centre), 2004b, Cheonan Buldang-dong Yujeok [The
32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33
Ditchenclosed Settlement at Locality 1, Okbang Located in Daepyeong-ri, Jinju], In Nam-gangdaem
Sumoljigu-ui Balgulseonggwa [Results of Excavations in the Nam-gang River Dam Spillway]: 61-78,
Papers of the Seventh Academic Meetings of the Yongnam Archaeological Society, Jinju.
Ko, I.H., 2009, New Perspectives in Korean Funerary Archaeolog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2(2): 101-
121.
Ko, M.J., 2003, Nam-gang Yuyeok Mumuntogi Munhwa-ui Byeoncheon [Changes in the Mumun
Pottery Culture of the Nam-gang River Valley], Unpublished M.A.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 M.J. and M.T. Bale, 2008, Cheongdonggi Sidae Hugi Sugongeob Saengsan-ui Byeoncheon Yeongu:
Jinju Daepyeong-ri Yujeok Junsim-euro [The Daepyeong Site and Changes in Specialised
Production in the Korean Bronze Age], Hanguk Cheongdonggi Hakbo [Journal of the Korean Bronze
Age Society] 2: 1-25.
Kwak, J.C., 2001, Urinara-ui Seonsa – Godae Non Bat Yugu [Dry- and Wet-field Agricultural Features
of the Korean Prehistoric], In Hanguk Nonggyeong Munhwa-ui Hyeongseong [The Formation of Agrarian
Societies in Korea]: 21-73, Papers of the 25th National Meetings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Greater Busan.
KHSUM (Kyemyeong Hyeso University Museum), 2007, Gimcheon Songjuk-ri Yujeok: Geumneung
Guseong Gongdan Joseong Jigu-nae Yujeok Balgulbogoseo I-II.
KNUM-MNUM (Kyung Nam University Museum – Milya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nd1 Ulsan Mugeo-dong Okhyeonyujeok I [The Okhyun Site in Mugeo-dong, Greater Ulsan
I], Unpublished Site Explanation Meeting Briefs, Kyung Nam University Museum and Milya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Masan, 1998.
nd2 Ulsan Mugeo-dong Okhyeonyujeok II [The Okhyun Site in Mugeo-dong, Greater Ulsan
II], Unpublished Site Explanation Meeting Briefs, Kyung Nam University Museum and Milya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Masan, 1998.
Lansing, Stephen, 1991, Priests and Programmers: Technologies of Power in the Engineered Landscape of Bal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Lee, G.A., 2003, Changes in the Subsistence Systems in Southern Korea from the Jeulmun to Mumun
Periods: Archaeobotanical Investigation, 2 Vol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Mississauga.
_______, 2011, The Transition from Foraging to Farming in Prehistoric Korea, Current Anthropology
52(S4): S307-S329.
Lee, G.A. and G.W. Crawford, 2002, Okbang 1, 9 Jigu Chulto Sikmulyuche Bunseok Bogo [A Report
on the Plant Remains Recovered from Okbang Localities 1-9 in the Nam-gang River Basin],
In Jinju Daepyeong Okbang 1-9 Jigu Mumunsidae Jibrak [The Mumun Period Settlement at Okbang
Arbor.
Kim, G.T., 2002, A Study of the Boseong River Valley Cul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Eugene, University Microfilms, Ann Arbor.
Kim, G.J., 1999, Honamjiyeok Cheongdonggisidae Jugeoji [Residential Areas of the Bronze Age in
Honam Province], Honam Koko-Hakbo [Journal of the Honam Archaeological Society] 9: 85-126.
_______, 2006, Hoseo, Honam Jiyeok-ui Songguk-ri-hyeong Jugeoji [Songguk-ri Type Pit-houses of
Hoseo and Honam], In Geumgang: Songguk-ri-hyeong Munhwa-ui Hyeongseong-gwa Baljeon [The Origin and
Formation of Songguk-ri Type Culture], Papers of the Joint Meeting of the Honam and Hoseo
Archaeological Societies: 17-57, Honam–Hoseo Archaeological Societies, Gunsan.
Kim H.S., 2005a, Ulsansik Jugeoji-ui Jeungchuk-gwa Sahwoe-jeok Euimi [The Social Meaning in the
Enlargement of Ulsan-type Pit-houses], Yongnam Kogohak [Yongnam Archaeological Review] 36:
27-41.
_______, 2005b, Mumuntogisidae Jugeoji Naebu-ui Jeokseokhyeonsang-gwa Euimi [The Meaning of the
Phenomena of Piled Stones in Mumun Pottery Period Houses – Around Ulsan Area Data],
Yongnam Kogohak [Yongnam Archaeological Review] 37: 75-96.
Kim, J., 2003a, Chungcheongjiyeok Songguk-ri Yuhyeong Hyeongsanggwajeong [The Development
of the Songgukri Assemblage in the Chungcheong Area], Hanguk Kogo-Hakbo [ Journal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51: 35-55.
Kim, J.G., 1974, Hanguk Suhyeol Jugeoji Go (II) [A Study of Korea’s Pit-houses], Gogohak
[Archaeology] 3.
_______, 1976, Dwelling Sites from the Geometric Period, Korea, Asian Perspectives 18(2): 185-203.
Kim, J.T., 2000, Songguk-ri-hyeong Jugeoji-ui Yeongu [A Study on Songkukri Type Residences], Master
of Arts Theses Series, No. 2, Samhan Cultural Research Centre, Jinhae.
Kim, J.I., 2004, The Growth of Individuals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Bronze Ag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7(1): 31-60.
Kim, J.B., 1979, Development of Chiefdom Society, Paekche Munhwa 12: 75-87.
Kim, S.O., 1996, Political Competi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Development of Residence,
Residential Ward, and Community in Prehistoric Taegongni of Southwestern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Proquest, Ann Arbor.
Kim, S.O. and J.C. Lee, 2000, Jinan Yongdam Daem Sumoljigunae Yeoeuigokyujeok Josagaeyo [A
Summary of Excavations at the Yeoeuigok Site in the Yongdam Dam Floodway, Jinan], In 21
Segi Hangukgogohak-ui Banghyang [The Direction of Korean Archaeology in the 21st Century]: 101-
132, Papers of the Twenty-fourth National Meetings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Greater Busan.
Kim, Y.M., 1998, Jinju Daepyeong-ri Okbang 1 Jigu Mumuntogisidae Hwanhochwirak [The
34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경제만이 아니다 35
Bokwon-ul Wihan Siron-jeok Geomto [A Study of Groundstone Tools from the Gwanchang-
ri Site], In Songguk-ri Munhwa-reul Tonghae Bon Nonggyeong Sahoe-ui Munhwa Chegye [Cultural Systems of
Agricultural Societies as seen through Songguk-ri Culture], edited by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Archaeology and the Environment, pp 249-274. Seogyeong Munhwasa, Seoul.
Song, M.Y., 2001, Namhanjibang Nonggyeong Munhwahyeongseonggi Chwirak-ui Gujo-wa Byeonhwa
[Structure and Change in the Settlements of the Agrarian Cultural Formation Period in Southern
Korea], In Hanguk Nonggyeong Munhwa-ui Hyeongseong [The Formation of Agrarian Societies in Korea]:
75-108, Papers of the Twenty-fifth National Meetings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Greater Busan.
Thomas, J., 1993, The Hermeneutics of Megalithic Space, In Interpretive Archaeology, Edited by C.Y. Tilley,
pp. 73-97, Berg, Providence.
Yun, H.P. and M.J. Ko, 2006, Bat Yugu Josabeop Mit Bunseok Bangbeop [Excavating Archaeological
Dry-field Features: Methods and Analysis], Yawoe Gogohak [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1(1):
33-71.
YICP (Y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2005, Cheongdo Jilla-ri Yujeok [The Ancient Site at Jinra-
ri, Cheongdo], Research Report of Antiquities, Vol. 85, Y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Chilgok-gun.
Localities 1 and 9 in Daepyeong, Jinju]: 445-454, GARI, Jinju.
Lee, J.C., 2000, Songguk-rihyeong Jugeoji-e Daehan Yeongu [A Study of the Songguk-ri-type
Settlement], Honam Koko-Hakbo [Journal of the Honam Archaeological Society] 12: 85-124.
Lee, S.H., 2005a, Geomdan-ri-sik Togi-e Daehan Ilgochal [A Study of Geomdan-ri Type Pottery],
Unpublished M.A.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Greater Busan.
_______, 2005b, Geomdan-ri-sik Togi-ui Sigeongan Ibji-wa Seonggyeok-e Daehan Ilgochal [A Study
of the Location and Character of Geomdan-ri type Pottery], Yongnam Kogohak [Yongnam
Archaeological Review] 36: 43-72.
Lee, S.J., 2000, Segyesa-jeok Hyeonji-eso Bon Ulsan-ui Hwanho [The Ditch-enclosure Features of
Greater Ulsan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Archaeology], Ulsan Yeongu [Ulsan Studies] 2: 95-
142.
Miyazato, O., 2005, Mumuntogisidae-ui Chwirak Guseong: Jungseobu Jiyeok-ui Yeoksam-dong
Yuhyeong [Settlement Patterns of Yeoksam-dong Assemblage in Central-western Korea], Hanguk
Kogo-Hakbo [Journal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56: 49-92.
Mizoguchi, K., 1992, A Historiography of a Linear Barrow Cemetery: A Structurationist’s Point of View,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11(1): 39-49.
O, G.J, E.H. Heo, and B.B. Kim, 2005, Cheonan mit Asan Jiyeok-ui Cheongdonggisidae Chwirak-
ui Ibjibunseok (I) [An Analysis of the Location of Bronze Age Settlements in Cheonan and
Asan Areas (I)], Balgul Sarye–Yeongu Nonmunjip [Case Studies and Research in Excavation] 2: 5-30.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s, Gongju.
O, S.Y., 1997, Buyeo Songguk-ri Yujeok-ui Jugeoyangsang [Aspects of Settlement at the Songguk-ri
Site, Buyeo], In Honam Gogohak Jemunje [Problems in the Archaeology of Honam]: 159-175, Papers
of the Twenty-first National Meetings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Greater Gwangju.
Rhee, S.N., 1984, Emerging Complex Society in Prehistoric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Eugene.
Rhee, S. N. and M. L. Choi, 1992, Emergence of Complex Society in Prehistoric Kore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6: 51-95.
Rogers, J.D., 1995, Dispersed Communities and Integrated Households: A Perspective from Spiro and
the Arkansas Basin, In Mississippian Communities and Households, edited by J.D. Rogers and B.D.
Smith, pp. 81-98, University of Alabama Press, Tuscaloosa.
Scarborough, V.L., 1991, Water Management Adaptations in Nonindustrial Complex Societies: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ume 3, edited by M.B. Schiffer,
pp. 101-154,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Service, E.R., 1975,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Norton and Co., New York.
Son, J.H., 2005, Gwanchang-ri Yujeok Majeseokgi Bunseok: Saenggye Yuhyeong-gwa Sahoe Joj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