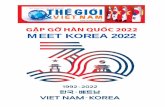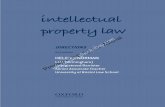Legal adaptation of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in East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
Upload
independent -
Category
Documents
-
view
0 -
download
0
Transcript of Legal adaptation of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in East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 1 -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법적수용
(Legal adaptation of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in East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윤권순*1)· 이승현**2)· 윤종민***3)
목차
Ⅰ. 서론
Ⅱ. 서구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탄생
1. ‘Intellectual property’ 용어가 가지는 힘
2.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형성
가. ‘property’
나. ‘intellectual’
3. 소결
Ⅲ. 일본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수용
1. 용어형성 배경
2. 工業所有權 용어의 형성 및 변화
가. ‘所有權’과 ‘財産權’
나. 工業所有權
3. ‘無體財産權’, ‘知的所有權’, ‘知的財産權’ 용어의 형성과 변화
4. ‘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의 창작
Ⅳ. 중국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수용
1. 용어형성 배경
2. ‘智力成果权’, ‘ 产权’ 용어의 형성과 변화
Ⅴ. 한국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수용
1. 용어형성 배경
2. ‘무채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용어의 형성과 변화
3. ‘intellectual property’의 바람직한 한국어 대응 용어 분석
가. 법적 성질
나. 권리의 내용
다. 소결
Ⅵ. 결론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제1저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저자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2 -
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와 이라크 전쟁과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쇠퇴하고 있
는 반면에,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동아시아 3국의 경제력은 세계 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3국의 협력은 세계사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관점에서 중요
하다고 할 수 있고, 최근 동아시아 3국의 민법 통일화 연구나 동아시아 개념사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intellectual property’ 라는 용어가 동
아시아 3국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발전해 왔는지를 아는 것은 향후 동 분야의 변화의 동향을
예견할 수 있으며, 개념의 차이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
약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개념이다. 용어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
으며, 이는 지적재산권2) 제도의 정당성과도 연계되어 동 분야의 근본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률3)이 현재 혼용되고 있는 ‘지적재산
권’과 ‘지식재산권’을 후자로 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큰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의 동아시아(중
국, 일본, 한국)에서의 수용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미래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통상 property와 property right를 구분 할 때, 전자를 물리적 대상으로, 후자를 권리라는 법적
관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적재산은 비법적 관념으로 권리의 대상, 지적재산권은
법적 관념으로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산이라는 용어에 이미 법적 권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재산과 재산권의 개념이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
다.4) 예컨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한국어 공식명칭은 세계지적
재산기구가 아닌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다.5) 본 논문에서는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intellectual property'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유럽의 경우 ‘유럽사전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내 여러 국민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재현하고 발전시키고, 과거의 정치
적 문화적 대립에서, 국가적 경험 차이에 토대를 둔 유럽 공동의 미래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송승철, “미래를 향한 소통-
한국 개념사 방법론을 다시 생각한다”, 개념과 소통(제4호), 2009. 12, 220면.
2) 서구의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가 2011년 2월 현재 한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용어를 비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 학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지적
재산권’으로 통일해서 사용 하고자 한다. 이때 그 의미는 ‘intellectual property’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3) 한국은 2010년 현재,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2010년 9월 29일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다. 동 법안은 정부안(의안번호
1809035, 2010. 8. 4.), 이종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1806452, 2009. 11.4.), 김영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809234, 2010.
9. 1.)등 3종류의 법안이 동시에 심의 중에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 22개의 관련법안에서 지식재산
권으로 관련 명칭이 통일화 되도록 하고 있다.
4) “법적관념과 비법적 관념은 구분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property'이다. 동 용어는 법적권리와 관련된 물리적 대상을 지
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러한 물리적 대상에 속하는 법적 이익(혹은 법적 관계들의 총체)이라는 외연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김연미 “재산권의 권리관계: 법철학적 단상들”, 공법학연구(제8권 제3호), 2008, 274면.
5) 다음과 같은 국제조약의 한국어 명칭에서 WIPO는 ‘지적소유권 기구’로 표현되었다가. ‘지적재산권기구’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79.3.1), 대한
민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의 직원파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SECONDMENT OF STAFF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07.8.2.).
- 3 -
Ⅱ. 서구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탄생
1. ‘Intellectual property’ 용어가 가지는 힘
용어가 가지는 힘은 “학문은 용어를 통해 후속세대를 복제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토마스 쿤
의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6)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의 생성과 발달과정은 언어적 측면에서의 의의와 더불어 법률
적 관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정 개념을 정의 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사항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는 저작권
과 특허권을 포괄하는 개념 또는 저작권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이후에 상표권 등이
포함되었다.7) 특성이 다른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생성되었고
내용이 상이한데도, intellectual property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임으로서 동일시되어 많은 문제
를 유발한다.8) 이는 ’property'가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속하게 되면, 물권과 같이 취급
되어야 하며, property가 가지는 동일한 구제수단을 받아야 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9)
예컨대, 상표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식별하지 못해 벌어지는 불이익을 보호한다는 법적 이
익에서 출발했으나, ‘property’의 범주에 속하게 됨으로써, 상표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어, 소비자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10)
또한 저작권의 강화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1) property 프레임워크가 가져오는
효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12) 첫 번째, property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연법 개념을 연상하게 한다. 두 번째, property는 부를 극대화하는 법경제적 분석으로
우리를 유도하는데, intellectual property는 그러한 분석의 전제인 경쟁제가 아님을 망각하게
한다. 세 번째, property는 물권과 동일시하게 되어, 마치 저작권이 물권처럼 경계가 분명하여,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동 용어로 인하여 입법자는 관련법을 점점
property와 유사하게 변화시키기 쉬우며, 이러한 변화를 원하는 기업은 동 용어를 널리 퍼지게
한다는 것이다.13)
intellectual property law의 역사는 없고 patent law 등 개별법의 역사만 있다는 시각도 앞서
설명한 용어가 가지는 힘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혹자는, 독점적 성격을 부각시
6) 노무라 마사이키/송연빈 역,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xvii 면.
7) Brad Sherman과 Lionel Bently는 1850년대 경에 저작권과 특허권, 디자인권의 경우 ‘intellectual property'의 범주에 속한다고
인식되어 있었으나, 상표권의 경우에는 당시 동 범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한다.: Brad Sherman․Lionel Bently, 「Themaking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98.
8) Justin Hughes, Copyright and incomplete historiographes of Piracy, Propertization and Thomas Jefferson, South CaliforniaLaw Review(vol. 79), 2006, pp.1055-1056.; Richard Stallman, “Did You Say ‘Intellectual Property’? It's a Seductive
Mirage“, http://www.gnu.org/philosophy/not-ipr.xhtml, 2010. 7.20. 방문.
9) William W. Fisher III, “The Growth of Intellectual Property: A History of the Ownership of Ideas in the United States,
p.22, http://cyber.law.harvard.edu/people/tfisher/iphistory.pdf, 2011. 2. 14. 방문.
10) Felix Cohen, "Transcendental Nonsense and the Functional Approach," Columbia Law Review(vol. 35), 1935, pp.814-817.
11) Justin Hughes, supra note 8, pp.1055-1056.
12) Ibid. p.1056.
13) Justin Hughes, supra note 8, p.1002.
- 4 -
킨 intellectual monopoly가 더 적절한 명칭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4) 또한 근래에 들어와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채권적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intellectual liability'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15) 이와 같이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는
현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사를 분석하는 것은 동 분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2.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형성
서구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경우 1818년16), 영국의 경우 1840년17),
미국의 경우 1845년18)에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 독일의 경우 1867년 “Geistige
Eigentum”이라는 용어20)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세기 초 ‘immaterialgüterrecht’로 대체되었다
가, 1967년 WIPO 출범을 계기로 해서 다시 “Geistiges Eigentum”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
고 있다.21)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7년 WIPO 설립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을 통칭할 명칭의 필요성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언어체계로는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없을 때,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다.22) 전문
용어는 구체적이며, 압축된 개념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 언어에서 길게 풀어서 설명할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용어이다. 용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조어는 대체로
기존의 단어에서 파생한 것이거나 기존의 단어를 조합하여 복합명사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23)
14) Glyn Moody, "What Does "IP" Really Mean?", http://www.linuxjournal.com/node/1005736, 2011. 2.14. 방문.
15) Daniel A. Crane, "Intellectual Liability", Texas Law Review(vol. 88), 2009, p.253.
16) Benjamin de Constant de Rebecque, Collection complète des ouvrages publiés sur le gouvernement représentatif et laconstitution actuelle de la France: formant une espèce de cours de politique constitutionnelle, P. Plancher, 1818, p. 297.
17) Brad Sherman과 Lionel Bently는 “Thomson's A Letter to the Right Honourable Sir Robert Peel (1840)”라는 책 부록의
제목이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ed by Law in England’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개념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작곡, 순수미
술, 공예(literary property, musical compositions, fine arts and industrial arts)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Brad Sherman․
Lionel Bently, supra note 7, p.95.
18) 1845 10월 연방 순회재판소 판결에서 Woodbury판사는 “특허권자는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발명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
이 의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청구항을 관대하게 해석하는 방식이 정신노동, 즉 ‘intellectual property'를 보호하는 방
법”이라고 판결문에서 기술하고 있다. : Davoll et al v. Brown (Circuit Court, D. Massachusetts, 1845.10.). 다음 논문은 동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Peter S. Menel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operty Rights Movement, University of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2007, p.37.
19) 각 국가별 용어사용 연도는 각 국가의 법제도상 동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단지 필자가 문헌 등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다. 예컨대, 다음 논문에서 Laura Moscati는 프랑스 법학자 Pardessus가 1811년 출판된 “Elémens de
jurisprudence commerciale”라는 책(pp.88-93)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필자
가 원본을 본 결과 동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Laura Moscati,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uropean
Legal Context: Tools and Perspectives, School of Law-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p7.,http://journal.juridicum.at/loadattachment.php?attachmentid=145_2281_89, 2011년 2월 24일 최종방문.
20) Rudolf Klostermann은 1867년 ‘Geistige Eigentum’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책을 출판하였다.
“Das geistige Eigentum an Schriften, Kunstwerken und Erfindungen, nach preussischem und internationalem Rechte”:
http://www.datenbanksystem.com/article/Rudolf_Klostermann. 2011. 2. 24. 방문.
21) Wikipedia.“Geistiges Eigentum",
http://de.wikipedia.org/wiki/Geistiges_Eigentum#Begriff_des_.E2.80.9Egeistigen_Eigentums.E2.80.9C, 2011. 2. 24. 방문.
22) 김석근, “19세기말 “individual(個人)” 개념의 수용과정에 대해서“, 세계정치(제23집), 2002, 397면.
23) 남현숙, “경제 불어에 나타난 복합명사 어휘 구조 분석”, 불어불문학 연구(제37집), 1998, 697면.
- 5 -
‘intellectual property’는 ‘intellectual’이라는 형용사와 ‘property'라는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
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복합명사를 이루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 ‘property’
영국의 존 로크는 1690년 발간한 ‘정부론’에서 노동을 한 자는 자신의 육체적 노동에 의한 산
물에 대해 ‘property’라는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근대민
법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24) 또한 그의 노동에 기초한 ‘property’의 정당화 이론은 정
신노동에 대한 법적 권리인 저작권과 특허권이 ‘property’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저작권이 먼저 ‘literary property’라고 불림으로써, property라는 용어가 저작권에 연관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존 로크의 노동에 기초한 property의 논거를 근거로 저작권이 제일 먼저
property의 범주에 속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고,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공통적
으로 제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793년 저작권법에서 이를 명시
하였다. 그 당시 저작권은 literary property 또는 artistic property라는 용어로 불렸다. 문예 분
야에서의 ‘property’ 또는 예술분야에서의 ‘property’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허권을 ‘property’
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1791년 프랑스 특허법이다.25) 특허권의 경우 디자인권을 포함하여
industrial property라는 용어로 통칭하게 되었는데, 역시 산업분야에서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1811년 프랑스 문헌26)에 나타나는 ‘propriété industrielle’ 의 경우 1883년 파리조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국제적 법률용어로 활용되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property가 아닌 권리(right)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콜러는 19세기말 무체물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소유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종래설은 잘
못된 것이며, 이것과 다른 새로운 권리, 즉 무체상품권(“Immaterialgüterrecht”)27)으로 파악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8) 특허권은 시간적으로 유한하며, 각 국에서 별개의 권리가 부여
되고, 외형상의 소재지를 갖지 않고, 형체상의 존재가 없어서 점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
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법을 충실히 따르려는 판덱텐 학파가 지배하던 19세
기 중반 이후, 무체물을 eigentum에 포함시키는 "Geistiges Eigentum"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
다는 비판에서 나온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나. ‘intellectual’
복합명사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게 특수한 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29) 이때 종속된 단
24) 윤권순, 특허권 재해석을 통한 특허괴물 현상 분석과 ‘지식권’의 제안,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8), 55면.
25) 1791년 프랑스 특허법 전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모든 신규사상은 원래 그것을 생각해낸 자에게 속하는 것인데, 만
약 공업적인 발상이 그 것을 제작한 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것은 인권을 그 본질에서 무시하는 것이다”’: 吉蕂
辛朔/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특허법개설(제13판)」, 대광서림, 2005, 29면.
26) Pardessus, Elémens de jurisprudence commerciale, Paris, 1811, p.88.
27) 독일의 ‘Immaterialgüterrecht’를 일본은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대응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통상 무체재산권으로 불리
우고 있다. 그러나 콜러가 eigentum 이라는 단어 대신에 recht 라는 단어를 쓴 것은 소유권 또는 재산권 보다는 광범위한 일
반적 권리라는 개념을 담고자한 의도이가 때문에 필자는 이를 우리말로 대응시키는데 있어서 ‘무체상품권’이라고 직역에 가
깝게 표현하고자 한다.
28) 吉蕂辛朔/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앞의 책 각주 25, 489면.
- 6 -
어는 장소나 시간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제 분야 복합명사의 종
속 단어로서 industriel이 자주 쓰이는 단어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30) 이는 1883년 파리조
약에서 ‘propriété industriel’이라는 복합명사가 사용된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님을 말해주고,
‘propriété intellectuelle’라는 용어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임을 말해준다. 영미법에서 property는
real property와 personal property로 분류 되었는데,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property를 구분하
고 있음은 프랑스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literary property, artistic property, industrial property
에서 앞의 수식어는 각각 문예분야, 예술분야, 산업분야를 의미한다. 즉 각각의 수식어가 분야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intellectual property의 수식어는 각각의 분야를 포괄하여, 공통점을
가지는 속성 즉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이 property의 영역에 속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권리의 특성
을 표현할 적합한 형용사로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상의 특징 가운데 유체물과 대비된다는 관점에서 무체물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세기 초 ‘immaterialgüterrecht’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두 번째, 존 로크가 property를 육체노동의 산물로 정당화 한 것과 대비하여, 정신노동의 산물
이라는 의미를 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spiritual property’ 또는
‘mental property'라고 할 수 있고, 독일어로 표현하면 ‘geistiges eigentum’에 해당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mental property act라는 표현이 발견되며,31) 독일의 경우 현재 동 용어가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창조적 정신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이다. 이에 적합한 단어로서는 영어
의 'intellectual', 프랑스어의 ‘intellectuelle’ 독일어의 ‘intellektuell’을 들 수 있다.32)
'intellectual'의 사전적 의미는 ‘of or relating to the intellect or its use’이며, intellect의 사전
적 의미는 ‘the capacity for knowledge’ 또는 ‘the capacity for rational or intelligent thought
especially when highly developed’를 말한다.33) 즉 ‘인지능력에 관련된’이라고 볼 수 있다
어원에 의해 intellectual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면, 라틴어 어원인 intellectualis는 ‘정신의’ 또
는 ‘이해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라틴어 어원인 intellegibilis는, ‘정신에 의해 감상
이 가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34) 영어의 intellect는 라틴어의 의미, 이해, 인지라는 뜻을
가진 intellectus가 어원이다.35) 따라서, intellectual은 사람 중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을 생각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보다 중시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또한 ‘생
각하는 능력’은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서구에서는 대부분 세 번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독
일의 경우 두 번째 방식(‘geistiges eigentum’)이 주로 사용되면서 세 번째 방식(intellektuelles
29) 남현숙, 앞의 논문(각주 23), 700면.
30) 위의 논문, 702면.
31) 1870년대에 "Mental property Act"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 Brad Sherman․Lionel Bently, supra note 10, p.161.
32) 독일에서는 ‘geistiges eigentum’과 ‘intellektuelles eigentum'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33) Merriam-Webster Dictionary(2011),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intellect?show=0&t=1298777839
2011.2.27. .
34) University of notre dam Archives, http://lysy2.archives.nd.edu/cgi-bin/wordes.exe?intellectual, 2011.2.25. 방문.
35) University of notre dam Archives, http://lysy2.archives.nd.edu/cgi-bin/wordes.exe?intellect, 2011.2.25. 방문.
- 7 -
Eigentum)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6)
3. 소결
'intellectual'이라는 단어가 다른 경쟁단어를 물리치고 채택되었던 원인으로서는 특허권, 저작
권 등 전통적인 property 범주에 속하지 않는 대상을 강한 법적 권리인 property에 포함시키는
것을 정당화 하는데 있어서, ‘창조적 지적 노동’이라는 의미를 담은 동 단어가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19세기 전반기에 ‘intellectual property’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1967년 설립된 UN 산하 관련 조직의 명칭이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채택됨
으로써, 사실상 동 용어가 서구권에서 통용되게 되었다고 보여 진다.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는 권리의 본질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200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Ⅲ. 일본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수용
1. 용어형성 배경
일본은 1854년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서방국가와의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동 조약
은 서방국가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면서, 일본의 관세 자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조약이었
다.37) 1868년 明治시대38)가 시작되고, 서방국가와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
었고, 이를 위해 유럽과 같은 근대적인 법전의 편찬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39) 이에 따라,
서방의 법률용어가 빠르게 번역되어 일본어로 수용되었다.40) 따라서 ‘intellectual property’ 및
그와 관련된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그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일본식 용어를 만드
는 데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지적소유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공업소
유권이라는 용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각각 그것을 구
성하는 개별법의 개념과 함께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871년 전매략규칙, 1885년 전
매특허조례, 1884년 상표조례, 1888년 의장조례를 제정하였다.41) 1899년 파리조약 가입을 위해
위 3개 조례를 각각 개정하여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으로 만들고, 동 년 말에 파리조약의 가입
을 완료하였다. 저작권의 경우 1869년 출판조례, 1887년 판권조령, 1893년 판권법, 1899년 저작
36) 독일의 경우 intellektuelles eigentum 보다 geistiges eigentum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당시 기술선진국 이었던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동 용어를 도입하면서, 라틴어가 아닌 게르만어를 선호하던 당시의 법학풍토에 영향을 받아 후자가 처음부터
채택되어 사용하여 왔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7) 정종휴, “일본민법전의 편찬”, 법사학연구(제36호), 2007, 106면.
38) 明治시대는 일본의 시대 구분의 하나로서 1868년 10월 23일부터 1912년 7월 30일까지를 가리킨다. 이후 大正시대는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를 가리킨다.
39) 정종휴, 앞의 논문(각주 37), 106면.
40) 당시 제도국 장관을 맡은 에토신페이는 선진법제로 알려진 1804년 프랑스 민법을 “오역도 상관없다, 그냥 속역만 하라‘고 서
둘러 번역하여, 이를 그대로 입법화 하려 했을 정도로 서둘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종휴, 앞의 논문(각주 37), 107면.
41) 中山信弘(한일지재권연구회역), 「공업소유권법(상) 특허법」, 법문사, 2001, 47-48 .
- 8 -
권법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899년 베른협약(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Convention de Berne pour la protection des œuvr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에 가입하였
다.42) 이 과정에서 서구의 copyright에 대응되는 용어가 초기에는 판권이었으나, 나중에는 저작
권으로 변화되었다. 전자는 영미법, 후자는 베른협약 명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세기 말에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 개별법과 그 명칭이 현재의 수준으로
정비되어,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2. 工業所有權 용어의 형성 및 변화
가. ‘所有權’과 ‘財産權’
일본에서는 서구의 ‘industrial property’와 ‘intellectual property’가 각각 ‘공업소유권’과 ‘지적
소유권’으로 대응 시켜오다가 ‘산업재산권’과 ‘지적재산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property
(rights)’를 ‘소유권’에서 ‘재산권’으로 명칭을 변환시켰다. 따라서 서구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roperty의
수용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明治 정부는 법전편찬을 하는 방법으로 프랑스 법전을 번역하고, 이를 그대로 일본 법률로 한
다는 계획 하에, 1871년 프랑스 민법을 번역하였다. 프랑스 파리대학 교수 보아소나드가 프랑
스법에 기초하여 1890년 ‘구민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민법초안을 만들었다.43) 그러나 동 민법이
신 앞에 평등이라는 개인주의 사상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충효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비
판에 부딪쳤고, 이에 다시 독일법의 외관을 갖춘 明治 민법을 1896년에 제정하였다.44) 두 법에
서 서구의 물권에 대한 일본의 대응 용어와 개념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890년 법에서는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와 같은 물권의 본원
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민법의 ‘propriété’의 대응어로서의 의미이
며, 이것은 권리의 객체가 유체물과 무체물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었다.45) 따라서 표현
은 ‘소유권’ 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재산권’과 유사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
다.46)
그러나 1896년 明治 민법에서는 ‘물권’의 본원적 권리로서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며, ‘물권’과 ‘채권’을 통합한 ‘재산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동법은 소유권, 지
상권 등의 물권과 임차권 등을 채권으로 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규정하였다.47)
여기서, 두 법률의 용어 사용을 비교하면, 매매에 관련한 규정에서, 구민법은 “물건의 소유
권”48)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明治 민법은 “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49)
42) Wikipedia, http://ja.wikipedia.org/wiki/%E8%91%97%E4%BD%9C%E6%A8%A9, 2011.2.28. 방문.
43) 정종휴, 「일본법 입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4면
44) 위의 책, 19면.
45) 中山信弘, 앞의 책(각주 41), 18면.
46) 1879년 일본에서 발간된 다음과 같은 법률용어집에도 所有權, 財産은 나오나, 財産權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 司法省, 「法律語彙初稿」, 1879, 76면, 841면. : http://kindai.da.ndl.go.jp/info:ndljp/pid/786206/, 2011. 2. 24. 방문.
47) 정종휴, 앞의 책(각주 43), 24-25면.
48) 구민법(1890) 제24조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지분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
른 일방 또는 제삼자가 그 정한 대금의 변제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 9 -
‘明治민법’을 기초했던 학자들은 독일의 1865년 작센민법의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당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판덱텐 체제에 영향을 받아 이를 법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입법
자료인 ‘민법개정을 위한 법전조사회’가 발간한 ‘법전조사회 규정’은 “물권편에는 ‘물권 및 그
득상(얻고 잃음), 행사 및 물상담보 등에 관한 규칙’을 두고 채권편에는 ‘채권 및 그 득상(얻고
잃음), 행사 및 대인담보 등에 관한 규칙’을 두기로 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서50) 일본에서는 두
권리를 대칭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독일의 판덱텐 법학자들은 재산권을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하고, 이
를 통합하여 재산권이라는 이론을 정립하였으나51), 정작 독일의 민법에는 일본법의 ‘채권’에 대
응되는 용어52)나, ‘재산권’에 대응되는 용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이 독일보다도 더욱 판
덱텐 체제를 완벽하게 민법상에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이라는 용어는 영
미법에는 없는 법률용어로서53), 일본법의 재산에 관한 법적 용어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민법의 경우 ‘eigent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물권의 본원적 권리를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54), 헌법에서는 물권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에서 재산권과 유사한 용어로서 ‘Vermögensrecht’라는 용어가 있으며, 사전적 정의로는
재산법 또는 재산권을 의미하고 있으나55), 민법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민
법은 ‘Vermögen’을 ‘재산’ 혹은 ‘자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권리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소유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프랑스 민법의 ‘propriété’ 보다 한정된 개념인
독일법상의 ‘eigentum’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1890년과 1896년 사이에 변화되었으며, 재산권
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포괄적 의미를 가지게 되어 후에 ‘property rights’라는 용어의 대응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프로이센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56) 동 법에
서는 제27조에 ‘소유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당시 헌법에서는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57) 2차대전 후 1946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은 1889년 제정된
대일본제국 헌법과는 달리 소유권 대신에 재산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영미법의
“property”를 “재산”, “property rights”를 “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대응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구의 경우 property 또는 eigentum이라는 용어가, 물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
49) 明治민법(1896) 제555조: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50) 정종휴(2009), 특집 : 동(東)아시아에서의 近代(근대) 민법(民法)의 전개(展開) ; “한국민법(韓國民法)의 편찬(編纂)과 비교법
적(比較法的) 위치(位置)”, 법학사연구(제40호), 2009, 21면.
51) 이상태, 「물권·채권 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82면.
52) 독일법상 채권 개념은 없으며, 한국민법에서 채권 개념은 독일과 다르다. : 서봉석, 「로스쿨 민법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2008, 178-180면.
53) Kitagawa Zentaro(박인환역), “일본민법학의 역사와 이론”, 법사학연구(제36호), 2007, 318 .
54) 독일민법 제433조 “매매계약에 기하여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물건을 인도하고 또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das
Eigentum an der Sache)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 양창수, 「2008년판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8, 227면.
55) Vermögen은 자산 또는 재산, Vermögenrecht는 재산권 또는 재산법으로 정의되어 있다. eigentum은 소유권 또는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허형근원저(서울대 독일학연구소 개편),「에센스 독한사전」, 민중서관, 2006.
56) 정종휴, 앞의 책(각주 43), 44면
57) 大日本帝国憲法(1889년) 제27조 제1항.: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받지 않는다.(日本臣民ハ其ノ所有權ヲ侵サルヽコトナシ)
- 10 -
라는 개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대상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어 발전한 것과는 달리, 일본에
서는 1896년 이후부터 소유권은 물권의 주요 권리로,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을 포괄한 일반적
권리로 분리해서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본은 ‘재산권’이라는 독자적인 용어를 창출해 냄으로써,
서구의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가 가지는 절대적 권리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
었다고 생각된다.
나. 工業所有權
일본의 명치유신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공산품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며, 공산
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괄하는 용어인 'industrial property'는
서방국가들과 통상조약을 맺을 경우 필요로 했던 용어이다. 일본은 영국과 1894년 日英通商航
海条約을 체결 할 때,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동 조약은 일본
제국의 전매특허, 상표 및 판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특허, 의장, 상표에 대한 내국민 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59)
이와 같이 ‘industrial property’의 대응 용어인 ‘공업소유권’은 소유권이 프랑스의 ‘propriété’에
대응하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시기에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
었다. 엄밀하게 말해서 industrial property'의 일본식 번역은 명치민법이 제정된 1896년 이전까
지는 ‘工業所有權’, 그 이후에는 ‘工業財産權’이라는 표기가 법률용어로서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있
어 왔다. 즉 파리조약에 따르면 ‘industry’라는 용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를 포
괄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이라는 표현이 협소 하다는 지적이다.60) 또한 property를 소유권으로
번역하는 것도, 소유권이 민법상의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
다는 것이다.61) 즉 property는 더 넓은 재산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영어의 industrial
property, 불어의 propriété industrielle, 독일어의 gewerblicher Rechtsschutz는 일본의 민법에
서 말하는 소유권 개념과 다르며, intellectual property도 지적소유권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해
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62) 일본정부는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공업소유권 대신에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널리 활용되고 있
다.
3. ‘無體財産權’, ‘知的所有權’, ‘知的財産權’ 용어의 형성과 변화
58) “明治 27년 日英通商航海条約에서 파리조약에 가입하기로 약속했을 때, 明治 32년 파리조약 가입시, 파리조약 공식번역문등
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전에도 외국에서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상표도용에 대한 항의에 대한 공문서상에 공업소유권이라
는 용어가 쓰여졌다. 明治초기에 공업소유권이라는 번역이 정착된 것으로 보여 진다.”: 中山信弘, 앞의 책(각주 41), 3면, 7면.
59) 필자가 日英通商航海条約 협약서를 확인 한 결과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협약자체에 공업소유권이
라는 용어가 담겨져 있지는 않으나, 협상과정에서 동 용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60) 中山信弘, 앞의 책(각주 41), 5면.
61) 위의 책, 5-6면.
62) 위의 책, 6면.
- 11 -
동아시아 3국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개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선도적인 역할
을 수행한 것은 다른 법률용어의 도입과정과 유사하다. 즉 1868년 明治維新을 계기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개념도 제일 먼저 도입 된 것
으로 보여 진다.
일본은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1871년부터 1873년까지 미국 및 유럽
각국을 시찰 한 바 있다. 또한 1885년 ‘전매특허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학자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자료 수집을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63), 19세기말 일본에서도 서구의 관련 용어를 접했
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1873년에 열린 만국박람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동 박람회에서 특허통일화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으며, 동 회의가 발전되어
1883년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明治시대 당시 工業, 知的, 所有權, 財
産權, 工業所有權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응 용어를 만들어 낼 환경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겠다.64) 그러나,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19세기 일본 문헌에서 사용된 사례를 필
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65)
일본에서 ‘intellectual property’ 용어가 수용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19세기말 영국 및 프랑스의 영향으로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으로 수용되
거나, 독일의 영향으로 ‘精神所有權(geistige eigentum)’이라는 용어로 수용되다가, 독일 법학자
인 콜러의 영향으로 ‘無體財産權’으로 대체되다가, 1945년 전쟁 이후에 다시 미국 등의 영향에
의해 ‘知的所有權’으로 정착되게 되었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는, 19세기에는 대응 용어의 필요성이 적어서 용어가 생성되지 않았다가, 20세기 초
독일의 영향으로 ‘無體財産權’으로 수용되었으며, 1967년 WIPO의 명칭에 영향을 받아 ‘知的所
有權’으로 정착되었다는 가설이다.
서구에서와 같이 일본에서도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가 법조문
이나, 관련 관청, 국제조약, 사회 경제적 환경 등에 의해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른 근대화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번역되거나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필자는 두 번째 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이 ‘intellectual property’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明治 초기에는 프랑스의 영향이 컸으나, 1871년 보불전쟁으로 프
랑스의 국력이 쇠퇴하고, 프로이센의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독일법의 영향이 커지게 되었다.66)
독일에서는 Rudolf Klostermann이 1867년 “Geistige Eigentum”라는 용어가 책 제목에 포함된
단행본을 저술하였다. 그의 이론은 그 후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Josef Kohler의
63) 전매특허조사의 입안을 맡은 교고시청은 일본이나 유럽에 자료수집을 하러다니고 이를 책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아, 일본특
허법은 미국과 유럽의 특허법을 충분히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 吉蕂辛朔, 앞의 책(각주 26), 48면.
64) 일본 국회도서관의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明治 및 大正 시대 문헌 자료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2010년 2월 24일 기준) 工
業所有權 40건, 知的 53건, 知的活動 2건, 知識 516건, 財産 2,241건이 검색되었다. : http://kindai.ndl.go.jp/index.html.
2011. 2. 24. 방문.
65) 明治 大正시대 문헌에 대해 일본국회도서관을 검색한 결과,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에 대한 검색어로는 결
과가 나오지 않고, 공업소유권은 40건이 검색되었다.
66) 정종휴, 앞의 논문(각주 37), 129면.
- 12 -
‘Immaterialgüterrecht’ 이론에 의해 비판 받는다. 일본이 1899년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1890년
구민법과 달리 1896년 명치민법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유체물에만 한정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위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독일에서의 관련 논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다.67) 20세기 초는 독일에서 ‘Immaterialgüterrecht’이라는 용어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시기이므
로, 일본이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를 건너뛰고 바로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로 intellectual
property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일본에서 어느 시기에 ‘지적소유권’이 나타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최소한 1967년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기 전이라고 보여 진다. 조약의 공식 문서에 “世界知的所有權機關”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일본이 1967년에 공식적으로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했음을 보
여주고 있다.68) 1967년 일본잡지에도 ‘知的所有権’이라는 용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69)
당시 industrial property라는 용어가 維新 이래로 공업소유권으로 정착된 상황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채택하는데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知的所有権’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1982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미국의 피
해가 55억달러, 13만 1천명의 고용상실을 가져 왔다고 발표하였다.70) 1980년대 미국의 지적재
산권 정책 강화의 직접적인 동기가 대일 무역적자이고, 그 원인이 일본의 미국 기술탈취에 있
다는 진단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은 미국의 ‘intellectual property’ 정책변화에 중요한 역할
을 했다고 하겠다. 1985년 9월 엔고의 계기가 된 선진5개국(G5) 장관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
고, 레이건 대통령이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하고 ‘intellectual property’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신문․방송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71)
한편, 1980년대 후반 지적소유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72)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권의 본원적 권리가 소유권이므로, 물권이 아닌 지식에 대한
권리에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2003년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책정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에서 industrial
property는 産業財産權으로, intellectual property는 知的財産權으로 통일화 할 것을 제안하였
다.73) 또한 지적재산기본법에서 ‘지적재산’을 정의하고 있다.74)
2010년 9월 1일 현재 일본어 구글의 검색결과 知的財産權 166만건, 知的所有權 1,030건, 無體
財産權 11,100건으로 知的財産權이 지배적인 용어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7) 中山信弘, 앞의 책(각주 41), 49면.
68) 法庫, http://www.houko.com/00/05/S50/001.HTM, 2011. 2. 24. 방문.
69) 落田 実, “BIRPIをめぐる最近の国際動向--特許協力協定案,ストックホルム知的所有権会議”, パテント(20巻, 9号), 1967.9 p.52.
http://opac.ndl.go.jp/articleid/873664/jpn, 2011. 2. 24. 방문.
70) 竹田和彦/김관식외 역, 「특허의 지식」, 명현, 2002, 26 .
71) 위의 책, 26면.
72) 이상정, “지적재산권법의 나아갈 방향”, 지적소유권법연구(제3집), 1998, 134면.
73) 日本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の創造、保護及び 活用に関する推進計画, 2003年7月8日, p.66.
74) 日本 知的財産基本法(2002)제2조
- 13 -
결론적으로 일본은 서양의 intellectual property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유럽의 영향
하에 ‘無體財産權’과 ‘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로 수용하였으며, 1967년 WIPO 설립 협약의 명칭
에 영향을 받아 ‘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가 정착 되었으며, 이를 다시 ‘知的財産權’으로 변화시
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채권과 물권의 상위개념인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후에 ‘지적소유권’을 ‘지적재산권’으로 대치함으로써, 서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intellectual
property'의 물권적 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4. ‘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의 창작
일본 언어는 한자로부터 유래되었다. 한자의 초서체로부터 히라가나를 만들었고, 자형의 부분
적인 약자체 및 획의 생략에 의해 가타카나를 만들었다.75)
일본은 국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대부분 중국의 번역서에 의존했는데, 네덜란드에게 독점적
으로 교역을 허용함으로서 난학이 발생하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서양과의 직교를 통한 번역
이 시도되어, 1774년 “해체신서”가 발간되었다.76) 이로써, 서양의 용어는 18세기 말 이후 중국
과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상호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일본은 당
시 지식인들이 서구문명보다 중국문명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서양지식의 권위를 높
이기 위해 서양법률용어를 한문으로 수용하였다.77) 서양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복합명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뜻에 합당한 한자어를 대응 시켰다. 예컨대, Airport를 空港으로
번역하였는데 Air를 空으로, port를 港으로 대응시켰다. ‘intellectual property(rights)’가 ‘지적소
유권’으로 번역되는 과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tellectual이 ‘지적’으로 번역되고,
property(rights)가 ‘소유권’으로 번역된 후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복합명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property rights가 소유권으로 대응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유는 맹자에 나오는 “以基所有, 易基所無者(있는 것, 없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78) 한편,
1860년대 중국에서 간행된 萬國公法은 right를 ‘權’ 또는 ‘通義’라고도 번역되어있다. 일본의 경
우 이에 영향을 받아 ‘權’ 또는 ‘通義’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868년 문헌에서는 權利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79) 일본은 맹자에 나오는 所有라는 용어와, 중국에서 right를 ‘權’으로 번역
한 것에 영향을 받아 ‘所有權’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intellectual을 知的으로 번역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두 낱말 사이의 수식관계를 나타내거나 체언구조를 만들 때 쓰는 구조조사로서, 송
75) 노무라 마사이키/송연빈 역, 앞의 책(각주 6), 15-16면.
76) 정하미,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 살림, 2005, 56면.
77) 정근식외, 「현행 법률용어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2, 13면.
78) 강현철, “재미로 풀어보는 법령용어의 어원(v)”, 법령정보, 2007년 1월호, 33면.
79) 최경옥, “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Right의 번역어 ‘권리’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제8권 제1호), 2007,
285면.
- 14 -
대 이후 底가 쓰이다가, 발음이 비슷한 的과 혼용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底는 페기되고
的만 쓰이고 있다.80) 중국에서 的의 쓰임에 힌트를 얻은 일본에서는 영어접사 ‘tic’의 일본 발
음과 ‘的‘의 일본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중국에서의 ’的‘과는 다른 기능을 갖는 하
나의 접미사로서 ’的‘을 사용하게 되었다.81) 的에 대한 사전적 풀이를 보면, ‘…에 대한, …에
관한’으로 되어 있다.82)
또한 知的은 ‘지성 또는 지식이 풍부한’, ‘지성 또는 지식에 관한’이라고 정의되어 진다.”83)
따라서 일본어에서 知的은 知識보다는 포괄적 개념이며, 지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능력 및 활동에 가까운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영어의 intellectual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明治維新 시대에 知的活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이는 intellectual activity의 번역어
인 것으로 보아 영어의 intellectual은 당시 ‘知的’으로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
양의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일본에서 접했을 때, 지적소유권으로 번역됨은 자연스러
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는 industrial property를 工業所有權이라는 용어로 대응시킨 것에 영
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한자어인 ‘知的所有權’
에 대응시켰으며, 이는 서양의 개념을 동양의 언어로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Ⅳ. 중국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수용
1. 용어형성 배경
중국은 전통적으로 명칭을 중시하였다.84) 중국의 법령정비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
저 서구의 법령체계를 도입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만주국’이 일본의 사실상의 속국이었으므
로 滿洲國民法典은 일본 법령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中華民國民法典도 일본민법의 영
향을 받았다.85)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는 중국 스스로 만든 것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
데, 所有权 및 物权과 같은 용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산권 관련 용어의 경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86)
서구문물의 영향을 받은 중국 維新파의 건의에 따라, 청나라는 1898년 “공예 진흥 장려 장정”
80) 김용석, “접미사 ‘ -적 (的) ’의 용법에 대하여”, 배달말(제1권 제11호), 1986, 73면.
81) 그 사용 시기는 明治시대 초이다. : 위의 논문, 74면.
82) 네이버 일어사전
83) 다음 일본어사전: ちてき [知的] [형용동사] 지적. 1 (사람의 느낌이) 지성·지식이 풍부한 모양. 知的ちてきな顔立かおだち 지
적인 얼굴 생김새. 2 (어떤 일이) 지식과 관계 있는 모양. 知的ちてきな能力のうりょく 지적 능력 知的ちてき労ろうどう 지
적 노동 ; 네이버 일일사전 : ち‐てき【知的】[形動]1 知識 知性の豊かなさま また、知性の感じられるさま。「―な
人」「―な生活」2 知識・知性に関するさま。「―な仕事」「―好奇心」.
84) 중국은 1964년 簡化漢字總表가 공표되어 2,236자의 간화한자가 공표되었는데, 1986년 두 번째 簡化漢字總表를 공표하면서 한
글자를 삭제할 정도로 문자표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리소테츠/이동주 역, 「한·중·일 한자문화, 어디로 가는가」, 기파랑,
2010, 249면.
85) 정종휴, 앞의 논문 (각주 37), 146면.
86)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1986)과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82.12.4.) 제13조에서 동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15 -
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에 의해 특허제도가 만들어졌다.87)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에는 '발명
특허 보호에 관한 잠행규정'이 만들어져 1950년 8월에 시행되었다.88) 그러나 문화혁명
(1966-1976) 등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을 하지는 못하였다.
1978년 등소평 체제가 들어서고, 1979년 미국과의 무역이 정상화 되면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적재산권법이 정비되었다.89) 중국은 1979년 전리법(專利法) 초안을 만들었으며, 1984년 전리
법(專利法)이 발표될 때까지 동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90) 이 시기 등소
평은 “중국은 특허제도 설립이 필요하고,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격론을 정지하며,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중요한 일보를 밟는다.”라고 지시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중국은 1982
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1984년 專利法, 1990년 저작권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또한 1980년
WIPO 조약, 1985년 파리조약, 1989년 마드리드협정, 1992년 베른조약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WTO 가입에 따라 TRIPs 규정에 맞추어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을 크게 손질하게 되었다. 따라
서 중국의 경우 1980년 WIPO 조약 가입 시 ‘intellectual property’를 어떻게 중국어로 대응시
킬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智力成果权’, ‘ 产权’ 용어의 형성과 변화
중국의 경우 ‘智力成果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6년 반포한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
則’91) 제5장 제3권에서 “ 产权”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92) 한편, 홍콩은 智力産
權, 대만은 智慧財産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93) 1986년 이래로 중국 법학계에서는 통일
적으로 ‘知识产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智力成果权’을 대체하게 되었다.
intellectual의 사전적 의미는 ‘智力的’이며, intellect는 ‘智力’을 의미한다.94) 영어의 intellectual
creation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智力創造, 일본어는 知的創造, 한국어로는 지적창조이다95) 또한
중국어의 智力活動은 일어의 知的活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는 intellectual의 의미에 가까운
중국어가 智力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property’는 ‘财产’을 의미하며, ‘property rights'는
’财产权‘ 또는 ’产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intellectual property를 대응시키는 어휘로서
서구의 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智力产权 또는 智力财产权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하겠
다. 홍콩과 대만이 각각 智力産權, 智慧財産權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리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여 진다.
중국의 학자도 ‘知识产权’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知识’이 “일반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니
라 인간의 지력(智力) 창조물에 대하여 법에 따라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가리키며, 그 의
87) 서지영· 김인권, 「중국 특허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6, 14-15면.
88) 은종학,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제 - 문제점, 구조적 원인, 정책적 함의-”, 지식재산논단(제1권 제1호), 2004, 2-3면.
89) 韓大元외,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298-299면.
90) 서지영· 김인권, 앞의 책(각주 87), 18면.
91) 석수길,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시간의 물레, 2005. p250.
92) 장봉문,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발전 방향」, 법무부, 2006, 」,; 임통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체계」, 법제처, 2004,
7-8면.
93) 韓大元외, 앞의 책(각주 89), 297면.
94) nciku, http://www.nciku.com/search/all/intellect, 2011.2.28. 방문.
95) 知財飜譯硏九所, 「日中韓英 知的財産用語辭書」, 日刊工業新聞社, 2007, p310.
- 16 -
미는 ‘지력재산권(智力財産權)’ 또는 ‘지혜재산권(智慧財産權)’96)을 뜻한다”라고 기술하고 있
다.97) 이에 따르면, 서구의 intellectual property의 의미에 적합한 용어는 ‘지력재산권(智力財産
權)’ 또는 ‘지혜재산권(智慧財産權)’이며, ‘知识产权’이라는 용어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는 빈약함
을 말해주고 있다. 근래 사회가 변천하고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知识产权’ 이라는 용어를 개량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98) “intellectual property”를 知识产权으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는 중국학자들의 비판도 있다.99) 즉 “intellectual”은 “智慧” 또는 “智力”을 의미하며, ‘知
识’은 “knowledge”를 의미하므로, “智力产权”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智力成果权과 ‘知识产权’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产权’과 ‘权’의 차이점이다. ‘产权’이라 함은 중국에서 일종의 재산권으로, 그 소유자가
법에 따라 그 재산의 권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소유자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소유자의 허
가 없이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100) 이에 대해서 ‘权’은 권리 일
반을 나타낸다. 따라서 智力成果权은 일반적 권리를, 知识产权은 재산권을 나타낸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중국에서 지적활동의 생산물에 대해서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서, 서방세계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智力成果’와 ‘知识’의 차이이다. ‘智力成果权’의 문자적 의미는 ‘지적능력에 의해 만들어
진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라고 하겠다. ‘智力成果’는 ‘지적활동’을 중시하는 용어인 반면에
‘知识’은 지적활동의 결과물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용어가 중국에서 교체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유추 할 수 있는 것은 홍콩이 이미 智力産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이를 피하고, 독자적인 용어를 선택하려는 시도로서 知识产权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일본에서 사용한 知的財産權이라는 용어는 중국어의 知的이라는 뜻이 ‘이미 알
려진’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101)
두 번째로 intellectual property의 주된 대상이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에 대한 재산권이라
는 의미로 ‘知识产权’이라는 용어를 채용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WIPO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대상이 지적능력이 아니라 지적산물이므로, 지식이라는 표현이 더욱 합리적이고, 따라서
영문표기도 knowledge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102) 지식기반경제라는 시대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해석도 할 수 있으나, ‘知识产权’이라는 용어가 1986년 민법에
등장하였고, 지식기반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용된 용어임을 감안하면, 무리한
96) 智慧의 사전적 의미가 分析判断、发明创造、解决问题的能力 이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보아 智慧도 인간의 능력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intellectual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汉汉词典
http://www.nciku.cn/search/cc/%E6%99%BA%E6%85%A7 2011.2.24. 방문.
97) 장봉문, 앞의 책(각주 92), 5면에서 다음 문헌을 재인용함 : 程開源, 「知識産權法」, 南開大學出版社, 1983, 1면.
98) 임통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체계, 법제처, 2004, 8면.
99) 刘春田, 知识财产权解析, 中国社会科学(2003年, 第4期),
http://www.cmr.com.cn/SubjectChannel/law/active/famt-6-1.htm 2011. 2. 24. 최종방문
100) 장봉문, 앞의 책(각주 92), 5면 : 다음 문헌을 재인용함 程開源,, 「知識産權法」, 南開大學出版社, 1983, 1면.
101) 중국어의 ‘..的’은 우리말의 ‘...의’의미를 가지고 있다.
102) 刘春田, 앞의 논문(각주 99).
- 17 -
해석이라고 하겠다.103)
서구의 ‘intellectual property’가 지식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보다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된 산물
을 보호하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새로운 용어인 知识产权은 서구의 전통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104) 이를 영어에 대응시키자면 ‘knowledge property’
또는 ‘property in knowledge’라고 하겠다.
Ⅴ. 한국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수용
1. 용어 형성의 배경
우리의 법제는 전통과 단절된 채 일본을 통해 강제된 서구법에 토대를 가지고 형성되었다.105)
법률용어도 서구의 용어에 기반 하면서도 19세기 일본과 중국에서 형성된 법률용어가 그 근원
인 경우가 많다. 일본법을 계수하는데 있어서 법률을 그대로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용어
까지 그대로 옮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겠다.106) 독자적으로 서양지식을 수용한 중국식 용어와
경합이 벌어지다가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점차 일본 용어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107)
예컨대, ‘所有權’이라는 용어의 경우도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가 아닌 일본에
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소유와 관련된 용어로서, ‘執持’가 사용되어 왔
으며,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동 용어의 사용이 줄어들고 ‘次知’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108)
‘執持’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권을 나타내는데 비해 ‘次知’는 ‘담당하다’, ‘주관하다’라는 뜻
으로 보다 추상적인 용어라고 하겠다.109)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가 국내에 도입되어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보여 진다. 그러나 동 용어가 포괄하고 있는 개별법에 대한 도입은 19세기부터 이루어졌다. 특
허권과 관련해서는 지석영이 1882년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을 따라 일본에 방문하여 우두종계소에서 두묘의 제조법을 배우고
종두법을 국내에 보급하였다.110) 1880년 당시 일본에서는 출판조례(1869년) 및 전매략규칙
(1871년 제정, 1872년 폐지) 이후의 시기이면서, 실질적인 최초의 특허법인 ‘전매특허조례(1885
년)’가 제정되기 전의 시기로서 지적재산권 도입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석영은 1882년
103) OECD 보고서의 개념정의를 시작으로 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는 간단히 말하자
면, 지식이 성장의 새로운 엔진역할을 하는 경제(OECD, 1996)이다.: 추기능, 「지식기반경제의 이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1면.
104) ‘ 产权’이라는 용어가 1980년대 초 미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번역자의 오류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생겨났다는 설을 전한
설도 있으나, 그 근거가 불확실 하고 설사 실수라고 하더라도, 동 용어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널리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작아지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105) 정근식외, 앞의 책(각주 77), 6-7면.
106) 김동욱, “민법 법률용어의 짧은 음절의 한자 어휘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과 개선 방안”, 일어일문학연구(제56집), 2006. 21면.
107) 정근식외, 앞의 책(각주 77), 17면.
108)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174면.
109) 우병창, 「조선시대재산법」, 세창출판사, 2006, 168면.
110) 신용하, “지석영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한국학보(제30권 제2호), 2004, 92-93면.
- 18 -
고종에게 시무소라는 일종의 상소문을 올려 “기계를 만들어 내는 사람에게는 傳賣권을 허가하
고 책을 발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飜刻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을 진흥시킬 것
을 건의하고 있다.111) 만약 고종이 지석영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허법을 제정하였다면, 오히려
일본에 앞서서 특허제도를 운영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시대를 앞선 생각이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그런데 구한말인 1908년에 대한제국특허령(칙령 제196호)이 공포·시행되었으나, 1910년 한일
합방과 함께 대한제국특허령(칙령 제196호)이 폐지되고, 칙령 제355호에 의하여 일본의 산업재
산권제도가 국내에 시행되었다.112) 1912년 제령 7호로 ‘조선민사령’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민법’이 한국에서 의용 되었다.113)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에서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한국에서의 수용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일본의 용어가 그대로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동 개념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는 불
분명하나, 20세기 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적소유권 보다는 무체재산
권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세기 초 민간차원에서 새로운 법률용어와 제도를 소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1915
년 편찬된 新文社編, ‘最新實用 朝鮮百科大全’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 책의 法律大義에는 財産
權, 物權, 占有權, 所有權, 地上權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114) 동 사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용
어 중 ‘意匠’115) 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본 식민지하에서는 지적재산권 용
어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후 1946년 미군정법령 제91호로 일본의 특허제도와 미국의 특허제도를 반영한 특허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허관련 내용으로만 구성된 현대적 특허법이 1961년 제정 공포되었다.116)
2. ‘무채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용어의 형성과 변화
한국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수용하는 과정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도입한 과
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한 과정을 밟아왔다. 이미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념과의 고투’가 없었다고 하겠고,117) 1998년에서야 독자적인
용어를 만들어 내게 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한일합방 당시 일본의 영향을 받아 무체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18).
두 번째, 해방 이후 일본의 ‘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한국은 1978년 12월 22일
111) 위의 논문, 95면: 동 논문은 다음의 출처를 이용해 번역함 : 高宗實錄, 고종 19년 8월 23일
112) 송영식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8, 89-91면.
113) 정종휴, 앞의 책(각주 43), 18면.
114) 정근식외, 앞의 책(각주 77), 23면.
115) 最新實用 朝鮮百科大全(1915)에서 意匠을 ‘新奇의 工夫를 發明하는 意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책, 50면.
116)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7, 85면.
117) “일본의 경우 서양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후쿠자와 유키찌 등 많은 사상가들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후
쿠자와 유키찌는 individual 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人人 各各 등의 용어를 사용하다가 個人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석근, 앞의 논문(각주22). 401-402면.
118) 이상정, 앞의 논문(각주 72), 134면.
- 19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가입하였으므로119), 한국에서 intellectual property를 지적소유권
으로 번역한 시기는 최소한 1978년 이전 임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이 이미 사용한 지적소유권이
라는 용어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80년대에 intellectual property가 지적소유
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120), 1980년 중반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신문지상에서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었다.121)
세 번째, 1980년대 후반 일본이 ‘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를 비판하고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자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하였다.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변리사 등 관련단체에게 사용을 권장하였다.122) 그 결과 1998년 기준 지적소유권
과 지적재산권이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123)
네 번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
력은 1998년에 나타나게 된다. 1998년 4월 28일 특허청의 민간자문기구인 ‘특허행정정책자문위
원회’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였
다.124) 그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지식기반경제라는 시대정신
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 지적재산권이 일본식 표기라는 점, 地籍이라는 용어와 혼동된다는
점, 한자권인 중국의 경우도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125)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IMF 외환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서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벤처육성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지적재산권 보다
는 지식재산권이 지식기반경제라는 상황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다. 중국은 이미 1986년 민법통칙을 제정하면서 ‘知
识产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중국어의 ‘产权’은 ‘재산권’이라는 뜻이므로, 결국 지식재산권
은 중국의 intellectual property의 번역어인 ‘知识产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한 대만의 경우
도 지혜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은 1998년 4월 1일자로 기존의 전리
국을 知识产权局으로 확대 개편하고 영어 명칭을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라고 칭하
는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펴고 있었다.126) 당시 특허청장은 1998년 4월 13일부터 17
일까지 중국 지식산권국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127)으로 볼 때 중국의 당시 움직임
119)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공식 표기는 ‘세계지
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1979.3.1)’이다.
120) 이상정, 앞의 논문(각주 72), 134면.
121) 이상정, “우루과이라운드와 지적소유권”,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제4권 제1호), 1994, 35면.
122) 위의 논문, 35면.
123) 이상정, 앞의 논문(각주 72), 134면.
124) 특허청 1998년 4월 29일 보도자료,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개최”,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7&pg=39&npp=10&catmenu=m02_01
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056 2011. 2. 24. 방문.
125) 1998년 4월 28일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 배석했던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의 새 정부의 지식 중시 국정 방
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지적(知的)재산권이라는 어휘가 지적(地籍)과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국이나 대만 등 한자권 국
가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새로운 용어가 제안되었으며, 참석자 찬반 투표로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고 한다.
126) 특허청 1998년 4월 9일 보도자료, “중국,지적재산권청발족”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8&pg=39&npp=10&catmenu=m02_01
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036 2011. 2. 24. 방문.
- 20 -
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은 일본에서 들여온 용어로서, 地籍128) 이라는 말과 혼동될 수 있어서,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다. 우리말로는 知的이나 地籍이나 같은 발음이어서 혼
동의 소지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 발음이 달라서 그런 문제는 없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intellectual property'의 수용은 1998년까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
해 오다가 1998년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그 적합성에 대한 논쟁이 벌
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기준 구글의 경우는 각각 반 정도, 그 외의 다른 주요 사이트
인 경우는 약 80% 내지 90%가 지적재산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약
의 경우 WIPO 설립조약 당시는 ‘지적소유권’으로 표기하다가, 그 이후에는 대부분 지적재산권
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판례와 학술문헌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보다는 ‘지적재산권’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빈도 (2010.7.23 기준)
용어/검색사이트 한국학술정보 구글 네이버 다음
지적재산권 432 117만 4,802,537 1,339,101
지식재산권 53 107만 501,726 178,729
합계 485건 224만 5,304,263 1,517,830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비율 89.1/10.9 52.3/47.7 90.6/9.4 88.3/11.7
3. ‘intellectual property’의 바람직한 한국어 대응 용어 분석
2010년 국회에 제출된 ‘지식재산기본법’의 부칙에 따르면, 향후 관련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이
라는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용어는 궁극적으로 사전에 등재됨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받게 된다.129) 법률용어의 경우 법전에 수록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승인라고
할 수 있다.
용어가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적절성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용어의 적
정성은 그 용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고 하겠다.130) 아래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에 대응하는 용어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법적 성질에 관련된 사항과 권리의 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27) 특허청 1998년 4월 17일 보도자료, “중국, 현지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협력키로”,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10&pg=37&npp=10&catmenu=m03
_01_02&sdate=&edate=&searchKey=0&searchVal=&c=1003&seq=1043 2011. 2. 24. 방문.
128) 네이버 국어사전 : 지적1 [知的] [관형사·명사] 지식이나 지성에 관한. 또는 그런 것. 지적3[地籍] [명사]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 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129) 정근식외, 앞의 책(각주 77), 8면.
130) “전문용어는 사용목적이 정확한 의사소통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어휘와 차별성을 나타난다. 또한 전문용어 연구는 일반어
휘 연구와 비교하면, 개념이 그 중심에 놓여 있으며, 형태론적 문제나, 통사론적 문제에 비교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엄태
현, “1989년 혁명 이후 나타난 루마니아 전문용어의 변화상”, 동유럽연구(제10권 제2호), 2002, 78-80면.
- 21 -
가. 법적 성질
법적 성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intellectual property’를 물권의 본원적 권리인 소유권으로
보느냐, 재산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광의의 일반적 권리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먼저, ‘소유권’이라는 명칭은 물권적 권리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가장 협의의 법적 성질을 가
지고, 지식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현재 구미의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의 ‘property’가 물권적 성질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점도 ‘소
유권’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기존의 독일의 ‘Immaterialgüterrecht’라는 명칭과 같이 ‘일반적 권리’로 보는 관점이
다. 일본이 동 용어를 무체재산권으로 번역하고 한국에서 이를 그대로 도입한 것은 본래의 의
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Immaterialgüterrecht’라는 용어의 독자성은 독
일어의 eigent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recht(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있다는 점에
서 ‘무체상품권’이라는 역어가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중국의 智力成果权, intellectual liability131), ‘지식권’132) 이라는 용어가 ‘일반적 권리’라는 관점을 반영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나타내는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있다.
필자는 지식의 속성이 유체물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물권적 용어가 타당하지 않
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물권’에서 사용하는 ‘소유권’과 포괄적 용어로서의 ‘재산권’
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후자는 채권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이 반드시 물권적
용어와 동일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재산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는 않는다. 또한 법적 용어라고 하면 권리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산권’이라
는 명칭이 동 권리의 핵심이 되는 법적 성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에
서 용어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의 경우 재산
적 권리와 인격적 권리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이 아닌 일반적인 ‘권’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식’의 특성이 ‘재산권’이라는 범주에 가두어 두기에는 다
각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용어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권리의 내용
권리의 내용은 다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질과 가
치와 관련된 역사적․철학적 배경, 둘째, 범주적 차원에서의 법적 명확성, 셋째, 시대적 의미와
관련된 사항, 넷째, 용어의 독창성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이들 분석에 앞서 먼저, ‘지식’이라는
단어와 ‘지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적’ 또는 ‘지식’이라는 용어의 의미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복합명사로서 ‘재산권’에, 지성 내지 지식의 속성을 부
여하는 복합명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은 ‘지’와 관련
되거나, 지식의 성격을 띠는 지식의 속성을 갖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보
131) Daniel A. Crane, supra note 18, p.253.
132) 윤권순·윤종민, “특허괴물의 현상분석과 특허제도의 본질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제58호), 2010. 3, 31면.
- 22 -
다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133)
지식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이며, ‘지적’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이나 지성에 관한 또는 지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134) 여기서 다시 ‘지성’의 사전적 의미는 ‘지각된 것을 정리․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는 정신작용’이다.135)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지식’과
‘지적’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는 ‘무형적 결과물’과 관
련이 있으며, 후자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知的’이라는 말을 더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즉 知라는 의미는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
하는 정신의 작용” 또는 “사물을 인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36) -적(的)
은 일제침략시대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사람들이 일본말이나 글을 흉내 내어 쓰기 시작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137) ‘적(的)’에 대한 사전적 풀이를 보면, “그 말이 나타내는 그 것에 관련된, 그
런 상태로 된, 그것의 성질을 띤 등의 뜻으로 명사와 관형사를 만드는 한정어”라고 되어 있
다.138) 적(的)의 뜻으로는 “어기(語基)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정도라는 것이다. 즉 知的은 명사
이며, 뒤의 내용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며, ‘지’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지의 속성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고, 지가 정신적 능력의 의미를 가지므로, 정신적 능력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라고 풀이 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식’은 정신활동의 ‘무형적 결과물’을, ‘지적’은
‘정신활동’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2) 권리의 내용적 측면 비교
먼저, 본질과 가치와 관련된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검토해 본다. 특허권, 저작권 등이
property에 속함을 주장하는 논거는 존 로크의 노동에 기초한 재산권 이론이었다. 따라서 동
용어를 만들 당시 property에 속한다는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다. 로크가 'property'의 개념을 정당화 할 때‘노동’을 중
시하였으며. 이것이 정신노동에 까지 미치게 된 것을 볼 때, 관련 용어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
신노동’이라는 개념을 중시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정신노동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정
신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지적 노동에 관련된 재산권’이라는 명칭이 더 무체물의
재산권 포섭을 정당화하는데 호소력이 있는 어휘라고 하겠다. intellectual property는 바로 정
신노동 및 창작성을 중시한 용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intellectual property"의 용어 및 개념
이 형성될 초기에 “intellectual labour"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878년 미국에서
133) intellectual은 식자를 뜻하는 man of letters에서 출발한 단어로서, knowledge에 비해 그 의미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우리말
的과 유사하다: 추기능, 앞의 책(각주 103), 46면.
134)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78, 3132면.
135) 위의 책, 3125면.
136) 위의 책, 3109면; 네이버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C%A7%80&kind=all&x=19&y=12
2011. 2. 24.방문.
137) 김용석, 앞의 논문(각주 80), 73면.
138) ‘- 的’은 한자어 명사를 앞에 두고 만들어지며, 명사형식을 취하면서도 의미상으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어학자
는 보고 있다.: 김창섭,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的의 경우-”, 진단학보(제58권), 1984,
159면.
- 23 -
발간된 책자에는, 당시 미국의회가 특허법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입법 움직임을 보해을 주에 우
려를 표시하면서, "intellectual property"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intellectual labour"를
여러 번 언급법의 있다.139) WIPO 설립조약에서 ‘intellectual property’를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포괄하는 범ts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ulti표현lle은 결국 동 용어의 핵심Ðroproperty
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어치른 대가인 “창조적 정신노동”이 근본임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140)
‘intellectual’이나 ‘지적’이라는 용어에서 지식노동이 먼저 떠오른다면, knowledge나 지식재산
권을 말 할 경우 그 결과물인 지식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겠다. 즉 property in knowledge에 대
응하는 용어로서 지식재산권이 대응 되며, intellectual property는 지적재산권이 더 가까운 의
미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라는 용어는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의
존재의 근거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둘째, 범주적 차원에서의 법적 명확성이다. 동 용어가 포괄하는 권리들이 인간의 창조적 정신
노동의 결과물인가, 일반적 정신노동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지식 또는 무체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정신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경우 데이터
베이스나 상표 등이 과연 창조적 활동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했을 경우 즉 ‘정신재산권(Geistiges Eigentum)’이라는 용어는 업무상의 신용보
호인 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까지 포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용어이다.
마지막으로 지식 또는 무체물에 대한 권리를 담은 용어로서 중국의 지식산권, 한국의 지식재산
권, 독일의 ‘Immaterialgüterrecht’, 일본의 ‘무체재산권’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의 ‘지식산
권’이나 한국의 ‘지식재산권’의 경우 가령 음악이나 미술이 동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너무 작은 범주를 나타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체재산권의 경우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표현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을 포함 한다고 볼 수 도 있어서, 동 용어의 의미를
희석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범주적 차원에서 평가해 본다면, 지적재산권
또는 정신재산권이 지식재산권 등 타 용어에 비해서 적절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셋째, 시대적 의미와 관련된 사항이다. 18세기와 19세기에 intellectual property를 정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신노동과 창작성이다. 즉 지적재산권을 논하는데 있어서 창작성의 과정이 핵심
이었다고 하겠다.141) 그러나 정작 19세기 후반 현대적 의미의 intellectual property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무게 중심이 정신노동 및 창작성에서 보호의 대상 그 자체로 이동하였다.142) 현대
지적재산권은 보호객체에 화체된 노동의 가치가 아닌, 객체자체의 가치 즉 객체가 사회에 미치
는 공헌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경제적 실용주의적 관점이 우세하게 되었다.143) 또한
지식기반경제라는 사회구조를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지식산권’이라는
139) Nathaniel S. Shaler, 「Thoughts on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importance to the State」, J.R. Osgood
& Co., 1878, p.2.
140) 세계 지적소유권 설립조약(1970.3.1) 제3조 제8호에서 ‘intellectual property'에 포함되는 권리를 나열하면서, 포괄적으로 ‘산
업, 과학, 문학, 예술분야에서의 지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라고 기술하고 있다.
141) Brad Sherman․Lionel Bently, supra note 7, p.173.
142) Ibid., p.173.
143) Ibid., pp.173-174.
- 24 -
용어가 보다 시대적 가치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다시금
‘창조’에 대한 가치가 높게 부각 되고 있으며, ‘창조’라는 의미는 인간의 활동을 강조한다는 점
에서 ‘지적’이라는 의미와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넷째, 용어의 독창성에 관련한 사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ntellectual property'라는 법적
개념과 관련하여 일본이 수용한 법률용어를 그대로 답습해 왔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식민지
용어를 주체적으로 청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동 용어가 중국의 ‘지식산권’
이라는 용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동
용어를 만들면서, 지식기반경제라는 현 시대의 특징을 표시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는 점에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으로는 북한의 경우 지적소유권 혹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144)는 점에서 남북 간의 용어 통일화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이란 명칭이 적절한 반
면에, 지적(地籍)이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다. 소결
언어의 변화는 자연현상처럼 시간을 두고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을 가진 의식적인 개혁에 의해 바뀔 수 있다. 특히 전문용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
본적인 단어와는 달리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 할 수 있다. 변화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단어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145)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노동을 중시한 ‘과정적 용어’이며, 보호의 철학
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을 적절하게 나타내준다는 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용어라
고 하겠다. 반면에,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대상을 강조한 ‘결과적 용어’로서, 식민지배하의 영향
으로 수동적으로 답습해 오던 용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며, 지식기반경제라는 시대정신을 반영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는 용어라고 하겠다.
필자는 ‘intellectual property’가 가지는 핵심가치가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창조
활동을 중시하고,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조류를 반영 할 수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
을 벗어난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 용어로서 ‘창조재산권’이라는 용어도 대응 한국어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Ⅵ. 결론
용어는 이해의 강을 건너는 나룻배이다. 법적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
하는 법률용어라는 도구의 모습에 유의해야 한다.
144)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16권」, 백과사전출판사, 2000, 17면.
145) 노무라 마사이키/송연빈 역, 앞의 책(각주 6), .xviii면.
- 25 -
지적재산권 제도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주도하에 보호
대상과 권리가 강화되던 추세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eBay 판결에서 특허권자에게 부여 되던 ‘물권적 청구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제도와 그 용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
한 용어 중의 하나를 적절하게 자국의 언어와 법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지난 100년간 지속적인
투쟁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를 ‘知的財産權’으로 의미 있는 변화
를 이루어냄으로써,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intellectual property’용어의 적절성 논쟁에서 벗
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 기존의 ‘智力成果权’이라는 용어를 1980년대에 ‘ 产权’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반적 권리’에서 ‘재산권’으로 권리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구의
intellectual이라는 의미가 아닌 knowledge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기존의 일본이 사용하던 용어에서 벗어나 지식경제기반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반영한 ‘지
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3국이 서구에 비해서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에 대한 역사적인 무게를
덜 느끼고, 능동적으로 용어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는 서구에서나 동아시아에서나 현재 역동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으며, ‘인간의 지적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현재 진행형의 과제라고 하겠다. 동 분야에서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용어를 창출해서 서구 국가들에게 제시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하겠다.
법률용어의 생성과 수용에 대한 이해는 법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
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며, 국가 간 협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
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용어, 개념사 intellectual property, propriété
intellectuelle, Geistigem Eigentum, Immaterialgüterrecht.
- 26 -
참고문헌
<한국문헌>
강현철, “재미로 풀어보는 법령용어의 어원(v)”, 법령정보, 2007년 1월호.
김동욱, “민법 법률용어의 짧은 음절의 한자 어휘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과 개선 방안”, 일어일문학연구,
제56집(2006).
김석근, “19세기말 “individual(個人)” 개념의 수용과정에 대해서“, 세계정치, 제23집(2002).
김연미 “재산권의 권리관계: 법철학적 단상들”,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2008).
김용석, “접미사 ‘ -적 (的) ’의 용법에 대하여”, 배달말, 제1권 제11호(1986).
김창섭,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的의 경우-”, 진단학보, 제58권(1984
년).
나종갑, “특허권의 역사적 변화와 자연권적 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의 변화,” 지식재산논단, 제1
권 제1호(2004).
남현숙, “경제 불어에 나타난 복합명사 어휘 구조 분석”, 불어불문학 연구, 제37집(1998).
배대헌, “지적재산권 개념의 형성․발전,” 지적재산권법연구, 제2집(1998).
서봉석, “사법 : 불법행위의 민법체계상 법제도적 지위 -독일 민법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
-”,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2007).
서봉석, 로스쿨 민법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2008.
서지영· 김인권, 중국 특허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6.
석수길,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시간의 물레, 2005.
송승철, “미래를 향한 소통- 한국 개념사 방법론을 다시 생각한다”, 개념과 소통, 제4호(2009. 12).
송영식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8.
신재호, “지적재산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17호(2005년).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78.
신용하, “지석영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한국학보, 제30권 제2호(2004).
양창수, 2008년판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8.
엄태현, “1989년 혁명 이후 나타난 루마니아 전문용어의 변화상”, 동유럽연구, 제10권 제2호(2002).
윤권순, 특허권 재해석을 통한 특허괴물 현상 분석과 ‘지식권’의 제안,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2010.8).
윤권순·윤종민, “특허괴물의 현상분석과 특허제도의 본질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제58호(2010. 3).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우병창, 조선시대재산법, 세창출판사, 2006.
은종학,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제 - 문제점, 구조적 원인, 정책적 함의-”, 지식재산논단, 제1권 제1
호(2004)
이상정, “지적재산권법의 나아갈 방향”, 지적소유권법연구, 제3집(1998).
- 27 -
이상정, “우루과이라운드와 지적소유권”,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4권 제1호(1994).
이상태, 물권·채권 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임통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체계, 법제처, 2004.
장봉문,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발전 방향, 법무부, 2006.
정근식외, 현행 법률용어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2.
정긍식, 조선총독부 법령체계분석(I), 한국법제연구원, 2001.
정문식, 독일헌법 기본권 일반론,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정상조,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정종휴, 일본법 입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정종휴, “일본민법전의 편찬”, 법사학연구, 제36호(2007).
정종휴, “특집 : 동(東)아시아에서의 近代(근대) 민법(民法)의 전개(展開) ; 한국민법(韓國民法)의 편찬(編
纂)과 비교법적(比較法的) 위치(位置)”, 법학사연구, 제40호(2009).
정하미,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 살림, 2005.
조선대백과사전 제16권, 백과사전출판사, 2000.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7.
추기능, 지식기반경제의 이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최경옥, “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Right의 번역어 ‘권리’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제
8권 제1호(2007).
韓大元외,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한지영, “지적재산의 철학에 관한 연구 -로크의 노동이론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20호(2006).
허형근원저/서울대 독일학연구소 개편, 에센스 독한사전, 민중서관, 2006.
노무라 마사이키/송연빈 역,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리소테츠/이동주 역), 한·중·일 한자문화, 어디로 가는가, 기파랑, 2010.
吉蕂辛朔/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특허법개설(제13판), 대광서림, 2005.
竹田和彦/김관식외 역, 특허의 지식, 명현, 2002.
中山信弘/한일지재권연구회 역, 공업소유권법(상) 특허법, 법문사, 2001.
Kitagawa Zentaro/박인환 역, “일본민법학의 역사와 이론”, 법사학연구, 제36호(2007).
<동양문헌>
知財飜譯硏九所, 日中韓英 知的財産用語辭書, 日刊工業新聞社, 2007.
日英通商航海条約(1894).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の創造 保護及び 活用に関する推進計画(2003.7.8.).
司法省, 法律語彙初稿(1879)
<서양문헌>
Adam Mossoff, “Rethinking the development of patents: an intellectual history,
1550-1800”, Hastings Law Journal, vol. 52(2001).
- 28 -
Andrew Beckerman-Rodau, "Patents are property: A Fundamental but important
concept, Journal of Business & Technology Law, vol. 4(2009).
B. Zorina Khan. An Economic H istory of Patent Institutions, Bowdoin College,
2010.
Boudewijn Bouckaert, "What is property?",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 13(1990).
Brad Sherman․Lionel Bently, The making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Christophe Geiger, "Intellectual ‘property’ after the treaty of Risbon: Towards a
different approach in the new european legal order?",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vol. 32 no. 6(2010).
Christopher May and Susan K, Se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ritical
history, Lynne Rienner Publisher, 2006.
Christopher May, Susan Sell, “Forgetting History is Not an Option! Intellectual Property, Public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ontext”, Birkbeck College, University of
London(2006.9.15).
http://www.dime-eu.org/files/active/0/MaySell.pdf, 2011. 2. 14. 방문.
Benjamin de Constant de Rebecque, Collection complète des ouvrages publiés sur le gouvernement
représentatif et la constitution actuelle de la France: formant une espèce de cours de politique
constitutionnelle, P. Plancher, 1818.
Daniel A. Crane, "Intellectual Liability", Texas Law Review, vol. 88(2009).
Felix Cohen, "Transcendental Nonsense and the Functional Approach," Columbia Law
Review, vol. 35(1935).
Francesco Parisi, "The fall and rise of functional property", Donatella Porrini
editor, Property Rights Dynamics, Routledge, 2007.
Glyn Moody, “What Does "IP" Really Mean?”, http://www.linuxjournal.com/node/1005736, 2011. 2.14.
방문
Henry E. Smith, Institutions and Indirectness in Intellectual proper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57(2009).
Jerry L. Anderson, "Comparative perspective on property rights : the right to
exclude", J ournal of Legal Education, vol. 56(2009).
Justin Hughes, Copyright and incomplete historiographes : of Piracy, Propertization and
Thomas Jefferson, South California Law Review, vol. 79(2006).
Laura Moscati,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uropean Legal Context: Tools and
Perspectives, School of Law -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http://journal.juridicum.at/loadattachment.php?attachmentid=145_2281_89, 2011.2.14. 방문.
Machlup and Penrose, "The Patent Controversey in the Nineteenth Century",
- 29 -
The Journal of Economic H istory, vol. 10, no. 1 (1950).
Mersino, Paul M., Patents, trolls, and personal property: will EBay aution away a
patent holder’s right to exclude?, Ave Maria Law Review, vol. 6(2007).
Nathaniel S. Shaler, Thoughts on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importance to
the State, J.R. Osgood & Co. 1878.
OECD, Knowledge Based Economy, OECD, 1996.
Pardessus, Elémens de jurisprudence commerciale, Paris, 1811.
Peter S. Menel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operty Rights Mov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2007.
Richard Stallman, “Did You Say ‘Intellectual Property’? It's a Seductive Mirage”
, http://www.gnu.org/philosophy/not-ipr.xhtml, 2010. 7.20. 방문.
William W. Fisher III, “The Growth of Intellectual Property: A History of the Ownership of Ideas in
the United States”, http://cyber.law.harvard.edu/people/tfisher/iphistory.pdf, 2011. 2. 14. 방문.
- 30 -
Abstract
Legal adaptation of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in East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Yoon, Kwon-Soon*146)/Lee Seung-Hyun
**147)/ Yoon, Chong-Min***148)
This article studies on the Legal adaptation of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in East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ese. This article also evaluates the corresponding terms and
considers the roles they do and adequacy of them.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the rights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the industrial,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fields. The economic and cultural importance of
this concept and term are increasing rapidly. Locke's theory that the fruit of his own
labour should belong to the individual was extended in the 18th century to intellectual
product. Locke's theory had justified to consider intellectual product as property rights. The
term has been widespread since establishment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 1967.
The debate over whether liability rules or property rules are preferable for intellectual
property has extended to the term itself. There are some critics that "Intellectual property"
is a misnomer since the right to exclude is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property and
incentives to engage in creative activity are increasingly being granted in the form of
liability rights rather than property rights. Some suggests that intellectual liability is more
proper term than intellectual property.
Instead of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the new term 'knowledge property' has been
used in China and South Korea.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is more proper than
'knowledge property' in respect of justify intellectual product as a property because the
word 'intellectual' indicate intellectual labour and activity.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has also advantage to include music and arts as subject matter because it indicate
intellectual activity. On the other hands the term 'knowledge property' well reflect the
importance of knowledge as the term knowledge-based economy.
The dynamism and complexity of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has a semantic
dimension. The time has comes to consider an accurate term for the legal right for the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 Research Follow,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 Senior researcher,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 Professor, Ph.D. in Law, School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