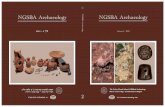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 -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Transcript of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 -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79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
-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
고민정*·Martin T. Bale**
- 요 약 -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로의 이행은 대형 장방형주거지에서 소형의 방형·원형주거지로의 변화와 함께
지석묘, 환호, 농경지 등을 수반한 취락이 각지에서 나타난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이러한 취락의 형태와 여
러사회구성요소들의변화와함께대규모취락을중심으로하여집약농경과사회적위계가출현하게된다.
진주 대평리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남강-경호강유역의 중심취락으로, 집약 농경과 사회조직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 정황으로 볼 때, 대평리 사회는 집단 지향적인 사
회전통에기반을둔사회 다. 또한수공업생산을비롯한생산활동의집중화가이루어지면서, 권력과특권
을 모색하려고 했던 엘리트들에 의해 공동의례가 공동 전략의 한 부분으로 이용되었다. 대평리유적의 밭의
형태가정형화되거나획일화되지못한점과자연적인환경을이용한밭의입지는청동기시대후기에대평리
유적의집약농경형태가다수의개별가계들의공동결정에기인한결과로설명될수있을것이다. 대평리유
적의 밭의 조성과 사용, 유지 등에 관한 고고학적 정황들에서는 bottom-up 경향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집약 농경과 관련하여 취락 내에서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 저장용 수혈이나 대형의 호형토기, 고상
건물등과같은농경잉여물의저장형태등을살펴볼때, 몇가지증거들은 top-down 과정과더욱일치한다.
주제어 : 청동기시대 후기, 밭, 저장유형, 농경 집약화, 사회조직, bottom-up관점, top-down관점
Ⅰ. 머리말
Ⅱ. 연구사및이론적모델
Ⅲ. 대평리취락의밭과수확형태
Ⅳ. 대평리취락의저장유형
Ⅴ.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
Ⅵ. 맺음말
목 차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연구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80 경남연구_제1호 2009
Ⅰ. 머리말
청동기시대의 생계는 농경, 수렵, 어로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들 중 농경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청동기시대의밭과논에관한발굴조사가많이이루어지게되면서보다더활성화시키게되었
다(郭鐘喆 2001; 李炅娥 1998; 李相吉 1999, 2000, 2002; 윤호필·고민정 2006). 청동기시대 농
경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동기시대 조기는 신석기문화와의 교체기에 해당하고 새
로운농경문화는중국동북지방의색채가강하다. 전기는조기의문화에서한반도화된농경문화로,
후기는 사회 전반의 대변혁이 일어난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安在晧 2006: 3). 청동기시대 전기는
화전농경과함께대가족체로이루어진대형장방형주거지로이루어진취락을특징으로한다. 그리
고전기에서후기로의이행은대형장방형주거지에서소형의방형, 원형주거지로의변화와함께환
호와 무덤, 농경지를 수반한 대규모의 취락이 각지에서 나타나고, 이와 함께 사회복합성의 출현에
의해 특성화된다. 이처럼 취락의 형태와 여러 사회구성요소들의 변화와 함께,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러대규모의취락을중심으로한집약농경과사회적위계가출현한것으로보인다.
진주 대평리유적은 경남 서부지역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규모 취락유적으로써 집약 농
경과 사회조직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기존 연구에서 대평리유적에서 조사
된 청동기시대 대규모의 밭유구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집단이 공동으로 경작한 것으로 파악
하고있다. 대평리유적과같이대규모밭유구의경작은소수개인의힘만으로경작한다는것은불
가능한 일이고, 이는 집단적인 협업에 의한 공동의 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대평리유적의농경사회는집단노동력이집약된공동생산체제로유지되었던것으로보고있
다(國立晉州博物館 2002: 57-58; 李相吉 2000).
이 논문에서는 취락의 구조와 함께 경작지와 관련된 수로나 배수시설 등의 부수적인 농경 관련
시설과같은고고학적유구에투자된노동력의사회적의미에대해서중점적으로다룰것이다. 밭
유구의조성과유지는어떠한역할을통해서이루어졌는가? 또한엘리트집단의구역안쪽과주변
에서 발견된 저장관련 유구와 유물을 검토함으로써, 엘리트 집단이 농경 잉여물의 관리와 통제에
있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가? 이외에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 관리 등이 어떠한 특별한
관리 조직이 없이 개별 가계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밭 농경과
함께, 도작 농경 또한 청동기시대 집약 식량 생산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도작 농경의 집약
화에관한기술적·사회적상황은많이다르기때문에, 본고에서는밭농경의집약화에초점을맞
추어논의하고자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한반도 선사시대의 집약 농경에 관한 기존 연구와 함께 서구의 고고학적 이론
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은 대평리 취락의 구조와 밭의 형태와 특징을 알아보고, 어떻게 밭
이 조성되고 사용되고 유지되었는가, 수확형태와 곡물의 종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수확형태와곡물의종류에대해서도살펴본다. 또한밭유구와더불어대평리취락에서집약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81
농경에 관련된 잉여곡물의 저장유형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약 농경과 사회조직에
관해구체적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Ⅱ. 연구사 및 이론적 모델
농경 집약화에 대한 연구는 흥미있는
연구주제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대부
분은 다른 주제에 부수적으로 거론되거
나, 논의가되더라도구체적으로이루어
지지 못하 다. Rhee and Choi(1992:
80)는 복합사회 발달과 한국 청동기시
대의농경집약화에대해처음으로검토
하 는데, 청동기시대 전기의 구릉지에
서의 화전경작이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
르러 강변 충적지에서의 집약농경으로
대체되어졌다고 논의하 다. 또한 그들
은집중화된정치체의지도자들이, 집약
농경을 포함하여“계획과 통제가 요구
되는모든문제들을관리하는데에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 다”라고 설명하
다. 하지만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의 고식물학적 연구 결과(Crawford
and Lee 2003: 94)에 의하면 집약 농
경의 개시는 Rhee and Choi(1992)가
이전논고에서제시했던것보다더이른
시기인 BC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고하 다.
한국 선사시대 초기의 집약 농경은 도
작농경과같은새로운농경기술의채택
과 확산, 밭이나 논과 같은 경작지와 관련시설들의 구축과 유지, 多作物 農耕體系(multiple-
cropping system), 새로운 지역으로의 농경지 확장 등 장기간의 여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Crawford and Lee 2003; Kim 2005; Lee 2003; Rhee and Choi 1992). 또한다작물농경체계
와같은집약농경의한형태가청동기시대전기에이미이루어진것으로보고있다(Crawford and
<도면 1> 대평리유적의 밭과 수공업 생산유구의 분포(고민정·Bale 2008에서 수정)
82 경남연구_제1호 2009
Lee 2003). 李炅娥(2005)는 집약농경의 특징을 재배종·야생종의 관리와 농경시설의 유지가 주된
생계경제활동이고, 자원의관리와자연환경에대한이해등이집단의정체성과상징체계까지본질
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 다. 한편 청동기시대 후기의 중서부지역 취락체계의 특징과 수도 경작의
집약화에 대한 연구에서, Kim(2005: 197)은 당시 집약 농경과 사회조직의 관계가‘bottom-up’
과‘top-down’과정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논의하 다. 하지만 청동기시대의 기술적, 사회정치적
정황은고고학적자료를통해각지역별로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발전하기때문에, 그의조사결과
는중서부지역이외의한반도의다른지역모두를대표하지는못한다고할수있다.
농경 집약화라는 것은 경작 방법에서의 기술적 변화를 통한 생산력의 증가를 가리킨다
(Morrison 1994: 115; Thurston and Fisher 2007: 2; Fisher 2007: 92-93).
Chambers(1980)와 Scarborough(1991: 120)는 농경 집약화를 설명하는 두가지 대조적인 이론
적 모델을 소개하 다. 그것은 바로‘top-down’과‘bottom-up’모델이다. 이러한 이론적 모
델은 생산과 관련된 관점으로서 누가, 그리고 어떠한 자본을 가지고 경작지를 비롯한 농경 관련
諸시설을 구축하고 조직하 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top-down’과
‘bottom-up’모델과 관련하여, 한국의 집약농경과 사회조직에 관하여 체계적인 사례검토를 통
한 연구가 이루어진 金範哲(2006: 42-43)은 체계적인 사례검토를 통해 한국의 집약농경과 사회
조직을 연구하 는데, 그 논의에서 각각‘착취적 지도권의 관점(exploitative leadership)’과‘관
리자적 지도권의 관점(managerial leadership)’으로 이해하 다. 尹昊弼(2008: 8)은‘top-
down’과‘bottom-up’모델을 각각‘하향식 관점’과‘상향식 관점’으로 해석하여 논의하 는
데, 사회조직의변화와관련하여잉여물의생산, 관리, 통제를중요한요소로파악하 다.1) top-
down 관점으로집약농경의발전을설명하는데에는농업기반의창출과관리에 있어서권위적인
엘리트들의 관점에서 사용되어졌다(Boserup 1965; Earle 1977, 1997; Kirch 1984; Kolata
1993; Steward 1955; Wittfogel 1957). 즉, 집약농경을포함한농경에대한모든계획에서중요
한역할을하는사람이있었다는것을나타내는이론적모델이바로 top-down 관점이다. 이러한
이론적관점에서강력한엘리트계층은단지농업기반을조직, 구축하고유지하는직접관리자적
역할보다는농경과식료품의잉여물의수집과통제에더욱집중하게된다.
집약농경에관한 bottom-up 관점은관리자적수장층의역할이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관리
자적 수장층의 계획과 가계의 경제자치와는 접한 관련이 있다(Wilk 1983, 1988). 집약 농경을
위한 대규모의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조직된 노동력과 개별 가
계에 의한 정책 결정 만으로도 충분하 다는 것을 증명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Erickson 1993,
1) ‘top-down’과‘bottom-up’관점은 한국 청동기시대 보다 사회발전 정도가 다소 높은 단계에 주로 적용된 생산관련 이론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경작지와 사회구조 등을 직접 대입시키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고고학적 정황들을 이러한관점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한국 청동기시대의 집약 농경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석된 용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top-down’과‘bottom-up’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83
2006; Miller 2006; Ur 2004). Erickson(1993: 399-407)은 실험고고학적연구를통하여남아
메리카의 티티카카(Titicaca) 호수 지역의 두둑을 높이 쌓아올려 만든 밭(raised field)의 조성에
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논의하 다.
만약경작지조성에많은노동력이필요하지않는다면, 이는가계의노동력만으로도충분히가능
하다는것을말한다. 이러한예는 BC 3,000년경북부메소포타미아지역의주요한도시중심지
던, 시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하모우카르(Hamoukar) 유적의 집약 농경 형태와 유사하다(Ur
2004: 291). 또 다른 한 예는 발리의 워터 사원(water temple)의 민족지적 예가 있다. 이곳은 혈
연적 소규모 공동 집단들이 의례적 맥락에서 도작농경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관개 체계를 조성하
고유지한경우로써, 국가권력의관리없이이루어진것이다(Lansing 1991).
하지만, 위의 두가지 관점은 집약 농경을 극단적으로 너무 단순화한 것으로써 비판을 받게 된다
(Janusek and Kolata 2004). 서로 배타적인 개념의 top-down과 bottom-up 관점 대신에, 몇
몇 고고학자들은 실제에서는 양자가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Scarborough 1991; Janusek and Kolata 2004; Kim 2005; Thurston and Fisher 2007:
13). 단순히 한가지 모델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학적인 관점을 통하여 고고학적 증거를
해석하고 있다. Kim(2005: 14-15)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농경 집약
화를 순수하게 개별 가계의 자치적인 정책결정의 결과로 보는 것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
다. 지역적 수준에서의 복합성의 출현과 농경 집약화는 단순히 개별 가계의 자발적이고 동시적인
참여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 하지만 개별 가계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생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또한 金範哲(2006: 59)은 사회·정치적 맥락 그 자체에서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도작농경과지도권형성의관계에대해수자원관리의측면과논토양의분포를통해서분석을시
도하 다. 분석내용을보면, 금강중류역의두정치체(B정치체와 C정치체)는유사한환경적배경
과 조직상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도작 농경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이한 양상을 보 다. 즉, B
정치체의 상위중심지는 잉여수집에 유리한 위치를 지향하여 입지하고, C정치체의 중심지들은 도
작농경에유리한지점에입지하고있다. 이를통해볼때, 관리자적지도권과착취적지도권이혼
합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중서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엘
리트 계층은 관리자적 역할 보다는 잉여의 수집에 더욱 주목했던 착취적 지도권을 행사했던 존재
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2) 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대평리 취락에
서 top-down과 bottom-up 관점의 고고학적 증거를 추출해내고, 집약 농경과 사회조직에 대한
접근은개별가계(비엘리트계층)와엘리트계층모두의입장을고려하여내용을전개하고자한다.
2)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북아메리카의 미시시피강 하류의 저평한 대평야와 저습지가 분포하는 아칸소주(Arkansas) 분지의 작은 취락의 예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다(Rogers 1995: 83).
84 경남연구_제1호 2009
Ⅲ. 대평리 취락의 밭과 수확형태
1. 취락의 구조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대부분 하천변의 범람원에 입지해 있으며, 대평리 유적 역시
남강이 사행하며 형성한 弧狀의 범람원에 입지한다. 취락은 자연제방을 따라 列狀으로 분포하며,
크게 어은 지역과 옥방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취락이 입지하는 곳은 자연제방 내에서도 高燥한 지
대이다(崔憲燮 1998: 24). 산지의사면과자연제방사이에발달한배후저지는주로경작지로이용
되고있다. 자연제방의정상부와배후사면바닥의레벨차는 1.2m 정도로자연제방외곽의강쪽은
급한사면을이루고있어보통의홍수때에는강물이이자연제방을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李相吉·李炅娥 1998: 99-110). 또한현재논으로이용되고있는배후습지에는당시에도논으로
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평리유적 옥방지역의 지형환경과 취락구성요소도 어은지역과 유사
하다. 한편, 어은1지구와옥방4·5지구에서방형주거지내부의수혈에서꼬막을비롯한鹹水産패
류의 패각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유적에서 반경 15km 정도의 거리인 곤양만을 통한 교통로의 상
정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崔憲燮 1998: 118).
대평리유적은 위와 같은 지형적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의 취락구성요소들이 입지해 있다.
자연제방에는 취락과 무덤들이 조성되어 있고, 배후저지에는 경작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자연제방들이 반복적으로 연속해 있다(李相吉 2002: 43-72). 주거지나 무덤의 장축방향도 대체
적으로강의흐름방향과일치하며, 列狀으로길게늘어서있는양상이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평리유적은 주거지, 수혈, 야외노지, 집석, 무덤, 환호, 경작지 등의 다수
의유구로구성된취락이발달하 다. 또한대평리유적을중심으로 1km 정도반경이내에는각각
의 공간을 점유한 4개의 핵심취락이 분포한다. 북쪽에서부터 소남리유적, 대평리 어은지역, 옥방
지역, 상촌리유적이 이에 해당된다. 다수의 주거지와 다른 유구들로 구성된 이들 취락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인접해 있어, 각기 개별적인 취락이라기 보다는 각 취락간 긴 한 혈연관계를
갖고, 공유된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된다(Bale and Ko 2006). 남
강유역과 그 외의 다른 지역의 취락들과 비교해 볼 때, 대평리 취락의 규모는 청동기시대의 경제
적, 정치적 권력의 초기 복합적 중심지 중의 하나로써 그 중요성을 나타낸다. 대평리유적은 청동
기시대후기전반의옥방지역과어은지역은주거지의수로볼때거의같은규모 던것으로파악
된다. 환호는 옥방1·7지구와 4지구에 설치되었다(최종규 2002: 51-54).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어은지역과 인접한 옥방4지구에서도 환호가 조사되었다.<도면
1> 하지만 어은지역에서는 원형주거지와 송국리형 외반구연토기가 포함된 청동기시대 후기 후반
의수혈주거지가거의확인되지않는것으로볼때, 청동기시대후기후반에이르러어은지역에서
는취락이소멸했다고볼수있다(高旻廷 2004).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85
아래에서 논의될 밭유구는 대평리유적에서 발굴조사된 유구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청동기시대 후기의 생계에 있어서 농경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 조합상에서 볼 때에는 어로용 도구나 수렵용의 도구들도 많이 출토되고
있어, 농경과더불어어로와수렵활동도지속적으로행해지고있음을말해준다. 최근밭유구는대
평리유적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지점인 수몰지구의 아래쪽에 위치한 진주 평거3지구(Ⅰ구역) 유
적에서도대규모로확인되었는데, 밭의형태와구조뿐만아니라주거지등취락을구성하는여러
요소들이대평리유적과흡사하다(慶南發展硏究院 2006, 2007, 2008).
토기와 석기, 옥 장신구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들 또한 대평리유적에서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들로 볼 때, 옥 장신구를 비롯하여 마제석검, 적색마연토
기 등은 반전업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민정·Bale 2008: 92-
102). 그리고 옥 장신구 혹은 적색마연토기 등과 같이 대평리유적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특정유물들-예를들면횡침선문적색마연토기-은남강-경호강유역과그외지역의취락에서
출토되는양상을나타내기도한다(고민정 2005).
대평리 취락에서 2~10기로 이루어진 수혈주거지군은 몇몇 관련된 가계들로 구성된 단위로 생
각된다. 이러한단위중에서비교적규모가큰수혈주거지군일부는옥방지역의환호내에위치하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호 안쪽과 주변은 엘리트가 거주하는 지역의 복합체로 상정될 수 있다
(Bale and Ko 2006). 이를 뒷받침하는 몇몇 증거 중의 하나는 대평리유적에서 2기의 토기 가마
중 1기는환호안쪽에서확인되었고, 나머지 1기는환호에근접하여위치해있다.<도면 1> 또한남
강-경호강유역의 취락체계에 있어서 규모가 큰 지석묘는 몇 기의 석관묘와 함께 이들과 같은 위
치에서확인되었다(慶南考古學硏究所 2002). 다양한종류의적색마연토기또한주로환호안쪽에
서 출토되었는데(國立晋州博物館 2001), 이는 당시의 축제나 의례활동 등 집단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가리킨다.
2. 밭의 특징과 수확형태
한국에서는 산악, 구릉 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초기농경이 화전을 비롯한 밭농사가 중심을
이루어 전개되었다. 전통적으로 밭농사 주체 거나 혹은 밭농사와 논농사의 혼합 농형태로서
유지되어 왔다(郭鐘喆 2001). 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호필·고민정 2006). ‘작물재
배에 필요한 지형 및 토양조건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물을 상시적으로 대지 않고 작물
을 재배할 수 있다.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며, 혼작이 가능하다. 논에 비해 재배가 간단하며, 단기
간에수확이가능하다.’밭은비교적자유로운입지조건과간단한재배기술만으로경작이가능하
고, 단기간수확이가능하므로식용작물의생산지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
밭 유구, 밭작물의중요성은선사~고대유적출토의곡물유체의대부분이밭작물이며, 논 토양
의 plant opal 분석과 화분분석 결과에서도 벼 이외에 기장, 피, 보리류 등이 확인되고 있어, 논
주변에서 밭 농사도 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郭鐘喆 2001). 밭에서 재배된 작물은 식
물규산체와 토양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보리와 , 조, 기장, 들깨, 콩과 등이 알려져 있다(李炅娥
1998; 李相吉·李炅娥 1998: 102-104; 國立中央博物館 2003: 26).
기존의 밭 유형 분류는 주로 형태학적인 측면에서 이랑의 구조와 형태분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李相吉(2000)에 의해처음으로밭유형분류가시도되었다. 그는대평리유적에서조사
된 밭을 고랑의 유무(有無)와 이랑의 형태에 따라서 모두 7개 유형으로 분류하 다. 이후, 郭鐘喆
(2001)은 이상길이 분류한 진주 대평리유적에서 확인된 밭 유구는 홍수범람 모래층에 의해 최종
적으로매몰되기직전의모습이고, 따라서밭경작과정상에나타나는여러가지요소들을배제한
채 단순히 최종 매몰직전의 밭의 이랑 형태에 기초한 그의 해석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다. 이에 따라 한국(남한)에서 조사된 밭의 평면형태와 區劃, 소형의 원형 수혈군, 불규칙한 列狀
의 구군(溝群) 등을 분류요소로 삼아 모두 6개의 밭 유형을 구분하 다. 또한 밭의 평면형태와 두
둑고랑의 크기, 두둑 부분과 고랑 부분의 전환 이용, 두둑고랑의 방향 전환 등은 이미 청동기시대
무렵부터농경민들에게습득된경지운용관리기술의하나로써, 이는선택의문제 다는것을주
장하 다. 이후 구획시설, 고랑 두둑의 형태, 고랑의 조성형태에 따라서 밭의 유형분류를 시도한
연구도있다(金炳燮 2003).
최근,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밭은 경작과정에 따라 두둑과 고랑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형태분류의기준으로삼아세분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 밭의유형을크게 3가지
로 대별한 연구가 있다(윤호필·고민정 2006). 밭의 유형구분은 이랑의 형태, 구획 여부, 소형 수
혈의 유무 등에 따라서 이랑밭(A형), 소구획밭(B형), 소형수혈밭(C형)으로 크게 분류하 다. 이랑
밭(A형)은 가장기본적이고보편적으로사용되는형태인이랑(고랑과두둑)이 병렬적으로길게늘
어선 형태이다. 소구획밭(B형)은 평면이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가장자리를 溝로서 소구획한 형태
이다. 소형수혈밭(C형)은 소형의 원형수혈이 집중된 형태이다. 이랑밭(A형)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진주 대평리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양 살내유적 등이 있다. 소구획밭(B형)은 춘천 천전리유적,
대구 동천동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등이 있으며, 소형수혈밭(C형)은 대평리 어은 1지구 유적과 춘
천천전리유적등에서조사된예가있다.
86 경남연구_제1호 2009
유적명 형 태 입 지 참 고 문 헌유구성격
진주 대평 옥방진주 대평 어은진주 평거3지구진주 이곡리함안 명덕고등학교내
밭밭밭밭
밭
이랑밭이랑밭, 소형수혈군이랑밭소구획밭
소구획논?
충적지(대하천)충적지(대하천)충적지(대하천) 선상지
구릉말단부 곡저
경상대학교박물관 1999, 2001이상길 1999, 2002경남발전연구원 2006, 2007, 2008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경남발전연구원 2005
<표 1> 청동기시대 논과 밭 유적(윤호필·고민정 2006 표3 일부 수정)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87
지금까지확인된밭유구의입지는중소하천과대하천변의충적지, 선상지, 구릉사면, 구릉말단
부 곡저 등에 위치하며, 대부분 중소하천과 대하천의 범람원과 자연제방상에 위치한다(郭鐘喆
2001; 윤호필·고민정 2006). 대평리유적과같은강변충적지의경우는홍수범람에의해모래층
이 퇴적되어 뚜렷하게 밭 유구가 확인되고, 밭의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있다. 대평리유적의 밭유
구는해발 36~39.5m의배후저지에남강의흐름에따라이랑이조성되어있다. 대개의경우이러
한 입지는 자연제방의 안쪽에 강의 흐름에 따라 길고 낮게 형성된 미저지에 해당된다. 밭은 모두
15개소에서 확인되었고 면적은 총 40,000㎡로, 밭유구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형태는 다
양한편이다. 청동기시대밭은상층밭아래에중층밭, 하층밭이중복되어있어계속해서반복적
으로 경작하 음을 알 수 있다(國立晉州博物館 2002: 57). 미저지의 경사면에 형성된 밭 이랑의
방향은 대부분 등고선에 직교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평탄면에서는 구획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나타나기도한다.
대평리유적에서는 주거지에 부속된 소규모 밭의 형태와 자연제방 사면에 대규모로 조성된 밭이
확인되었다. 밭 고랑의 폭은 28~60cm, 두둑의 폭은 20~60cm, 깊이는 10~20cm이다(東亞大學
校博物館 2002: 44). 옥방 1지구에서 확인된 소규모의 밭(면적 100㎡)은 1기의 주거지에 딸린 菜
유적명 형 태 입 지 참 고 문 헌유구성격
함안 도항리마산 진동양 금천리양 살내
대구 동천동대구 서변동대구 동호동대구 진천동
울산 백천 장검
울산 야음동
울산 옥현
울산 화정동울산 발리보령 관창리
논산 마전리
부여 구봉리전주 여의곡춘천 천전리
밭밭논밭밭밭밭밭
논
논
논
논논논
밭논
논밭밭
소구획밭
방형 구획논이랑밭이랑밭, 소구획밭
소구획밭이랑밭
床面溝계단식 소구획논
계단식논
방형구획논
계단식소구획논계단식논
밭-이랑밭논-계단식, 소구획논
소구획논이랑밭소형수혈군, 소구획밭
구릉말단부 곡저강변충적지충적지(소하천)충적지(소하천)충적지충적지충적지선상지?
구릉말단부 개석곡저
구릉말단부 개석곡저
구릉말단부 개석곡저
구릉말단부 개석곡저구릉사면 말단부 곡저
구릉사면 말단부 곡저
충적지(소하천)충적지충적지
경남발전연구원 2006경남발전연구원 2005, 2006경남대학교박물관 2003경남발전연구원 2005남문화재연구원 2002남문화재연구원 2002남문화재연구원 2003남문화재연구원 200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2, 2006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양대학교·동의대학교 2001
경남대학교박물관· 양대학교박물관 1998, 1999
울산문화재연구원 2004 울산문화재연구원 2003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1김도헌 2005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88 경남연구_제1호 2009
田(텃밭)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가장 면적이 넓게 조사된 밭은 어은1지구에 위치한다.<도면 2>
이처럼 옥방지역과 어은지역에서 확인된 대규모의 밭은‘집단농장(集團農場)’과 같은 것으로, 노
동이나수확의분배, 나아가소유권의문제가집단공동에게귀속되어있었을가능성이높은것으
로 본다(李相吉 1997: 187). 이는 옥방1·7지구와 옥방4지구에서 확인된 2단위의 환호취락을 중
심으로경 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대평리유적에서 조사된 밭유구의 형태는 오늘날의 밭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밭 이랑의 길이
가다양하고경계가동일하지않고불규칙하게나타나는것은밭이조성된지형적특징에따라밭
이랑의형태가결정된것임을알수있다. 이외옥방3·6·8지구의밭은전체를경계구에의해소
규모로 구획된 것도 확인되는데, 밭의 면적은 35~625㎡ 정도이다. 한편, 삼국시대 밭은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밭 이랑
의 형태가 다소 직선적이고 더욱 정연
하게되어있다.
대평리유적 밭 유구의 조성시기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高旻廷
2004; 國立晉州博物館 2002; 李相吉
2000). 주거지, 야외노지, 수혈유구
등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구 내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시기의
유물들이 밭 유구에서도 출토된다. 반
월형석도, 부리형석기, 보습 등과 같
은 굴지구나 수확용 도구 외에도 무문
토기편과 부리형석기를 모방한 토제
품도많이출토되었다.<도면 2>
옥방2·3지구와 어은1지구의 예로
볼 때, 밭이 조성된 경사면 위쪽인 미
고지의 상면에 수혈주거지들이 집되
어 있으며, 밭의 경사면 위쪽 경계부에
는청동기시대무덤들이일정한간격으
로 배치되어 있다. 대평리유적의 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청동기
시대 후기 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
나, 일부 밭은 옥방지역에서 주거지를<도면 2> 어은1·옥방5지구의 청동기시대 후기 유구배치도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89
비롯한다른취락구성요소들과함께후기후반까지경작되었던것으로생각된다.
다음은밭의용수공급문제에대해서살펴보자. 대평리유적의밭의용수공급은밭의형태와지
형양상으로볼때, 비교적최소한의노동력이투자된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앞서언급한남아
메리카의 티티카카(Titicaca) 호수 주변의 밭에서 살펴볼 때, Erickson은“ … 농경 생산을 향상
시키기위해서수로바닥흙을양쪽에서파올려크고높게조성한형태의밭…”으로서‘raised
field’라고 묘사하고 있다(Erickson 1993: 379).3) 이러한 형태의 밭의 조성에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밭의 형태와 규모로 볼 때, 아마도 취락 주변의 환호나 지석묘 축조 등
과같은공동의노동력을필요로하는대규모의공사 을것이다.
반면에대평리유적의밭은두둑을그다지높게조성한형태는아니며, 또한당시지형과밭토양
을 그대로 이용하여 고랑과 두둑을 만든 형태이다. 유적 내에서 밭 유구가 조성되는 곳은 지형에
따라 결정되고, 이러한 밭의 경작은 강수와 주기적인 하천 범람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대평리
유적의어은1지구와옥방2지구에서는남강에면한자연제방에소규모의주거지가조성되어있고,
그 배후저지에 밭 유구가 조성되어 있
다. 이와 연결되어 다시 자연제방에는
주거지, 수혈, 야외노지, 무덤등의유
구가 집 분포해 있는 유구 배치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밭 유구와 그
외 취락구성요소들은 유동적인 흐름
의 특성이 있는 물의 이점을 이용하여
조성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
면, 옥방2지구의 밭유구는 배후저지
의 평탄면과 경사면에 위치하는데, 배
후저지에 위치한 밭의 이랑방향은 하
천이 흐르는 방향과 직교되게 되어 있
어, 이러한 밭 이랑의 조성방향은 배
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어은1지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띤다.<도면 3>
청동기시대에농경활동의모습에관
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만한
민족지고고학적, 실험적 고고학적 연
3) 이는 비록 시기 차는 많이 나지만, 일본의 大阪府 이케지마·후쿠만지(池島·福萬寺)유적에서 조사된 平安~鎌倉時代의‘島畑’과 유사한 형태의 밭으로 생각된다(日本考古學協會 2000: 271).
<도면 3> 대평리유적 어은 1지구(1), 옥방 3지구 밭(2)
90 경남연구_제1호 2009
구는없다. 다만선사인들의농경활동모습은대전괴정
동유적에서 출토된 농경문 청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國
立中央博物館 2003: 156).<도면 4> 崔德卿(2002: 4-
10)은 대평리유적에서 조사된 밭과 농경문청동기에 묘
사된 그림을 토대로 청동기시대 밭 경작과정을 구체적
으로 연구하 다. 농경문청동기에 묘사된 노동방식은
한 사람이 앞에서 기경하여 이랑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즉시 파종하여 복토하는 형태이다. 또한 대평리유적의
밭은 2명이 1조(組)가 되어 기경하거나, 하나의 도구로
왕복하면서기경, 또는한사람이기경하고다른한명이
파종하는형태 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밭 경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발굴조사 과정 중
에 밭유구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조사과정 중에 있는 밭의 모습은 매몰되기 직전의 모습이므로 파종단계인지, 작물관리단계
인지, 폐기 이후의 모습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밭 경작과정은 정지 및 파종(1단계)
→작물관리(2단계)→수확 및 잔여물 처리(3단계)로 이루어진다. 어느 과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밭의이랑형태와경작과정에서나타나는경작흔의양상도달라진다. 특히 1단계의정지과정중에
이랑(고랑과 두둑)짓기는 작물의 종류, 태양의 위치, 지형 등 작물성장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밭의 형태에 따
라 기경방법도 차이가 있다(윤호필·고민정 2006). 이러한 흔적들에 대해 면 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자료가축적되면구체적인경작양상도파악이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마지막으로작물의수확후에잔여물을처리하는방법은잔여물을땅에서제거하여모아서퇴비
로 활용하거나 불태워 버리는 경우와, 잔여물을 땅에 그대로 둔 채로 불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밭유구의일부지역에서만집중적으로목탄이검출되는경우이고, 후자는밭유구의
전 지역에서 골고루 목탄과 재가 검출되는 경우이다(윤호필·고민정 2006). 이러한 흔적은 대평
리유적어은1지구에서확인된예가있는데, 밭고랑과두둑에서草本科의식물을태운것으로보이
는작은목탄알갱이가전면에섞여있는것들이확인되었다(李相吉 1997: 185). 또 조선시대기록
인『農事直設』에 수수, 콩, 조, 메 등을 1년 2작할 경우, 앞 작물을 밭에 깔고 태워서 비료로 활
용한예가있다고한다(李春寧 1989: 79).
밭은작물을심을때마다새로고랑을내고두둑을만드는데, 이전의고랑을두둑으로, 이전의두
둑을 고랑으로 바꿔서 만든다. 이는 地力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랑 방향이 서로 교차되기도 한
다. 밭이“×”자상으로 직교되게 중복된 경우는 옥방3·6지구에서 확인되며, 이랑이 같은 방향으
로 중복된경우는어은1지구, 옥방3·6지구에서확인된다. 이러한 밭의규모, 구획, 두둑고랑의형
<도면 4> 농경문청동기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91
태와경작흔, 시료분석등을토대로재배작물의종류와계절, 수확량등도추정해볼수있다.
대평리유적에서 출토된 작물 종류는 쌀, , 기장, 조, 보리, 콩, 팥, 들깨 등을 들 수 있고, 주로
주거지나밭에서출토된흙에서탄화된상태로발견되었다(國立晉州博物館 2002: 58). 이는 야외
노지와주거지내의저장공, 수혈, 밭 등에서주로출토되었는데, 다양한종류가확인되었다. 특히
작물 중에서는 조와 기장이 기타 작물에 비해 높은 출토량을 나타내지만, 각 유구별로 다른 특정
종류의작물이더많이출토되기도한다(이경아·Crawford 2002: 446-447).
이처럼 다양한 작물이 출토되는 것은 유적의 입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구릉지에 입
지한유적에서는충적지에입지한유적에비해작물의종류가다양하지못하다. 그리고근대한국
농촌에서의 작물재배 형태를 보면, 조와 보리와 같은 곡물들은 다른 계절에 재배가 되고, 한편 쌀
이 재배되는 논의 고랑 사이에서 콩이 재배되기도 한다. 선사시대에 조와 기장이 많이 출토되는
것은 조와 기장은 생육기간이 짧고 물의 공급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토양에 적응
이가능하므로초기농경기에부담이적은작물이다. 하지만, 쌀이나 , 콩류는발달된기술과노
동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쌀이나 과 같은 생육주기가 다른 다양한 작물들이
출토되는 것은 농경기술의 발달을 시사하고, 농경민은 일년 내내 농경에 종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아·Crawford 2002: 448).
Ⅳ. 대평리 취락의 저장유형
청동기시대후기집약농경의성격을살펴보는데에있어서남강-경호강유역의각유적내에서,
그리고유적간의취락체계의변화에대해서검토하고자한다. 특히, 대평리유적에서환호와관련
하여 마제석검·옥장신구·적색마연토기와 같은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 대형토기, 식료의 저장방
법등에대해서살펴본다. 청동기시대후기에는저장시설이주거지외부에위치하게되는데, 이는
농경 잉여물이 사적 소유물에서 공공재로 전환된 것이며, 저장시설의 변화와 함께 정치경제적 위
계형성간의관계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김장석 2008). 엘리트의거주지로추정할수있는고
고학적증거들의상관관계는일반공동체구성원과비교할때, 규모가가장크거나출토유물이많
은 주거지를 비롯하여 거대한 무덤이나 위세품의 존재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시에, 엘리트가
집약 농경 생산을 관리한다고 가정하 을 때, 다량의 잉여곡물의 저장 또한 엘리트의 관리 체계
하에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량의 잉여 곡물을 저장하는 수혈유구나 고상창고와 같은 유구
들은엘리트가거주하는곳과가까운곳에인접해서위치할것이다.
bottom-up 시나리오에서, 엘리트들은 그들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지지자들을 얻기 위한 방법
으로써위세품의전문화된생산과같은방법으로농경잉여물을이용하게된다(Earle 1997). 또한
그들의 권력과 명성, 상징적 자본,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써 통제와 과시,
위세품의 교환 등을 이용하 다(Bourdieu 1977: 52; Clark and Blake 1994; Wesson 1999).
92 경남연구_제1호 2009
이전 논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동기시대에 마제석검과 옥장신구는 주된 위세품이었다. 대평리유
적옥방1지구의환호안쪽과그주변에는옥장신구가부장된무덤들이위치하지만, 청동기시대후
기 후반에 옥장신구가 부장된 무덤들의 대부분은 대평리유적 이외의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정교하게 제작된 마제석검의 경우, 대평리유적에서 마제석검 제작과 관련된 유구들이 확인되기는
하 지만, 대부분 옥방1지구의 환호 바깥쪽에 위치한 유구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어은1지구의 밭
주변에는 수혈주거지들이 위치하는데, 이들 주거지에서는 옥을 생산했던 흔적들이 확인된다. 옥
원석, 옥 파편, 미완성품, 옥 지석 등 옥장신구의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들
이있다. 완성된옥장신구들은어은1지구에서도일부출토되었지만, 주로 옥방1지구의환호내의
주거지와 무덤 등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는 엘리트에 의해 소비되어졌음을 말해준다(고민
정·Bale 2008).
저장시설은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생계의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에 대비해서 갖추
게 되는데, top-down 관점에서 엘리트들은 저장된 잉여곡물의 관리 및 통제에 집중하게 된다.
한편, 집중화된 관리조직이 없는 공동체에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가계들은 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비 스런’저장용 시설에 잉여곡물을 저장하기도 한다(DeBoer 1988: 9-10;
Wesson 1999: 153). 청동기시대에 곡물류, 물, 그 외 다른 식료품의 저장은 저장용 수혈, 대형토
기, 고상창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裵德煥 2000, 2005; 國立晉州博
物館 2002: 70; 金度憲 2005).
1. 대형토기
대형토기-주로 호형토기-의 기능에 대해서는 좁은 저부에 비해 동체부가 매우 크고 둥근 형태
를 띠고, 토기의 기고가 50cm 내외로 다른 기종에 비해서 비교적 큰 기종이기 때문에 주로 저장
용으로생각된다. 형태적인특성으로만보면여타기형에비해저장성이한층고려된기종이라할
수 있으므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분위기를 반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朴淳發 2001:
125). 태토면에 있어서도 조리용 토기인 심발형토기와는 달리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한 예가
많이 보인다. 특히 대평리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후기의 조리용 토기로 사용된 심발형토기
의경우에는모래가많이함유되고비교적거친태토인것이다수인데반하여, 대형호형토기에는
적색마연토기 제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선된 점토가 사용된 것들이 많이 확인된다
(慶尙大學校博物館 1999, 2001; 國立晉州博物館 2001). 또한 조리용토기와는달리, 저장용토기
에는일상생활에서조리시에화기에노출된흔적이확인되지않는다. 예를들어조리용토기의내
외면에서관찰되는탄착흔, 그을음, 변색화등의흔적이관찰되지않는다는것이다.
대평리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대형 호형토기는 구경부의 형태와 직립·외반정도, 동최
대경의 위치와 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4가지 형식(Ⅰ~Ⅳ식)으로 분류된다. 이 중 Ⅰ식은 청동기시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93
대 전기의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고, Ⅱ~Ⅳ식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지와 집석, 수혈 등에서
출토된다. 특히, Ⅳ식인외반구연토기는청동기시대후기후반에편년된다(高旻廷 2004: 38-41).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주거지의 한쪽 모서리 부근에 대형의 호형토기를 바닥에 반쯤 묻은 형태로
그 안에 곡물을 저장하 다. 토기 내부에서는 조와 쌀 등의 곡물이 출토되어 이것이 저장용 토기
임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國立晉州博物館 2002: 79). 또한 후기에는 주거지 내부나 주변 수혈
에서도 출토되기도 하지만, 환호 내부에 수혈을 파고 내부에 목탄이나 소토를 채워 습기를 막는
시설을마련하여저장한형태도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國立晉州博物館 2002: 70).
이와 같은 대형토기는 top-down 유형에서 볼 때, 엘리트들은 저장용의 대형토기에 쉽게 접근
할수있었을것이다. 그리고저장용대형토기들은엘리트가거주하는공간이나혹은공동의례공
간 주변에 집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Blitz 1993; Wesson 1999). 역으로 bottom-up
유형에서 볼 때에는, 엘리트와 비엘리트계층 사이에 저장용 대형토기들이 더욱 고르게 분포할 가
능성이 있다. Blitz(1993: 93)는 미시시피강 유역에 관한 연구에서, 토기의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
게나타나는이유에대해서언급하고있는데, 그는이러한토기의다양성이사회집단의규모뿐만
아니라, 공동의 축제 혹은 대량의 저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식량 처리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제시하 다.
<표 2>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남강-경호강유역에서 대형토기
의 대다수가 대평리지역에서 출
토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대평
리유적 옥방지역의 예를 볼 때,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에는 다수
의 대형 호형토기(52%)가 환호
바깥쪽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보
인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후기
후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대형 호형토기는 옥방지역의 환호 안쪽에서 출토된다.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에 호형토기가 환호 바깥쪽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은 옥방지역의 대규모의 밭 근처에 거주하
고있던가계집단과관련된것으로생각된다.
2. 저장용 수혈
수혈 중에서‘비 스런’저장유구로서 기능하 다고 생각되는 유구가 있는데(DeBoer 1988;
Wesson 1999: 153-155), 이러한 저장용 수혈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몇몇 취락유적에서 확인된
다. 저장용 수혈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구들은 용적은 극대화하고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
유 적 후기전반 후기후반
옥방 환호 內 15점 (33%) 20점 (46%)환호 外 24점 (52%) 12점 (28%)
어은 5점 (11%) -상촌리 - 3점 (7%)대대평평리리 합합계계 4444점점 ((9966%%)) 3355점점 ((8811%%))
사월리 배양 - 3점 (7%)사월리 새터 2점 (4%) 5점 (12%)합 계 46점 (100%) 43점 (100%
<표 2> 청동기시대 후기 남강-경호강유역의 대형토기 출토량
94 경남연구_제1호 2009
해서 깊고 더 크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수혈은 종단면형태가 원통형과 플라스크형을 띠는 구덩이
들로써, 식료품을 저장하는 구덩이로 기능하 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석기시대의 유적 중에도
이처럼 종단면형태가 플라스크형이거나 둥근 형태의 벽을 가진 원통형의 수혈들이 조사된 예가
있다. 대평리유적에서 조사된 수혈 중에는 깊이가 1.5m 정도이거나 혹은 규모가 더욱 크고, 위와
같은 형태의 것들로서 저장용 수혈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있다.<표 3> 대평리유적에서 대부분의
수혈유구들은특히, 옥방2·9지구의밭주변에서확인된다.
남강-경호강유역에서, 청동
기시대 후기 전반의 수혈유구
4기와 후기 후반의 수혈유구 5
기는 그러한 수혈유구 중에서
다시 판 흔적들이 확인되고, 옥
방1지구 16호 수혈(慶南考古學
硏究所 2002) 만이 플라스크
형태를 띤다.<도면 5> 이 수혈
유구는 청동기시대 후기 후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옥방1지구의 환호 안쪽의 특별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이것
은마제석검과같은위세품이출토된주거지와수혈유구, 대형호형토기가출토된수혈유구, 그리
유 적 후기전반 후기후반
옥방 환호 內 93기 (33%) 85기 (53%)환호 外 180기 (64%) 58기 (36%)
어은 10기 (3%) -대대평평리리 합합계계 228833기기 ((110000%%)) 114433기기 ((8899%%))
사월리 배양 - 7기 (4%)사월리 새터 - 11기 (7%)합계 283기 (100%) 161기 (100%)
<표 3> 청동기시대 후기 남강-경호강유역의 수혈유구
<도면 5> 1 : 어은2지구, 2 : 옥방9지구 11호 수혈, 3 : 옥방9지구 22호 주거지, 4. : 옥방1지구 16호 수혈,5~8 : 고상건물(환호內 - 5 : 76호, 6 : 77호, 환호外 - 7 : 377호, 8 : 388호)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95
고옥을생산했던흔적들이확인된주거지들과인접해있다. 옥장신구가출토된석관묘와지석묘4)
또한이지역에인접하고있다. 16호 수혈과함께, 이들주거지와수혈유구, 무덤들은이중환호(제
3환호)의안쪽에위치해있다.<도면 6>5) 이러한패턴은엘리트가농경잉여물의저장과같은집약
농경의어떠한측면을통제하고관리한다는 top-down 관점과일치하는것으로볼수있다. 게다
가, 이러한 경우에 엘리트들이 수혈유구와 같은 저장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위한 잉여
물을따로비축해두려고한행위의결과로보여진다.
3. 고상건물
청동기시대 고상건물은 중서부 지역과 남부지역의 대규모 취락들에서 종종 확인된다. 고상건물
은 지상에 축조된 유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고상건물과 관련된 유물은 찾아보기가
4) 지석묘의 경우에는 이중환호(제3환호)의 內환호와 중복되어 있어 이보다 늦게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석관묘의 경우에도 환호와의 시기적인 선후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이중환호(제3환호)의 안쪽에 이러한 유구들이분포해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5) 제1환호~제4환호의 명칭은 최종규(2002: 51)의 도1. 옥방1·7지구 환호 배치에서 인용.
<도면 6> 옥방1·7지구 환호와 16호 수혈 주변 유구의 분포와 대형토기 출토유구(음 부분)
96 경남연구_제1호 2009
어렵고, 내부 매몰토와 주변 취락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주로 시기를 파악한다. 기존의 연구
들을통해볼때, 대부분의연구자들은 4주식, 6주식 등의고상건물을주거지와관련된곡물보관
창고로해석하 다(裵德煥 2000, 2005; 國立晉州博物館 2002: 70; 김권구 2005). 대평리유적에
서 조사된 가장 빠른 시기의 고상건물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裵德煥
2005; 國立晉州博物館 2002). 이러한 고상건물은 남강-경호강 일대에서 대평리유적에 집중되어
있다.<도면 5>
대평리유적에서 고상건물은 옥방1지구의 환호 안쪽에서는 모두 8기가 확인되었고, 환호 바깥쪽
에서는 4기가 확인되었다. 옥방1지구의 고상건물들은 가장 외곽의 환호(제4환호) 안쪽에서 주거
지 주변에 위치한다. 환호 안쪽과 주변에 이러한 저장시설이 집중된 것은 엘리트가 집약 농경을
통제하고관리했던 top-down 유형과더욱일치하는내용으로파악할수있다.
Ⅴ.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 조직
Ⅲ장에서 살펴 본 대평리유적의 밭유구는 대부분의 고고학적 정황들이 bottom-up의 결과라는
것을가리킨다. 하지만, 대평리유적의초기집약농경에서 top-down 과정의증거도전혀배제할
수없다는것은명백하다. 이하에서는먼저대평리유적의여러정황들에서 bottom-up 경향에대
해살펴보고, 다음으로 top-down 경향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대평리 취락 내에서 엘리트가 집약 농경을 직접 통제하고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
다. 예를 들면, 비엘리트 가계의 주거지들이 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밭을
조성하고곡물을수확하는데에사용했던것으로추정되는반월형석도, 부리형석기, 곰배괭이, 보
습, 돌낫, 가래 등과 같은 석제 도구들이 대평리유적의 주거지 내에서 비교적으로 고르게 출토되
기때문이다(高旻廷 2004: 65). 이러한증거들로볼때, 대평리취락에서농경활동은특정집단에
의해서이루어진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만약 대평리유적의 대규모의 밭이 집중화된 권력에 의한 조직과 계획을 통해 조성된 것이라면,
밭의 형태나 구획 등에서 어떤 정연한 형태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평리유적의 밭은
형태와규모가비교적다양하게나타나고이러한다양성이아래에서논의될사항중의하나이다.
먼저, 대평리유적에서는밭의규모와종류가매우다양하다. 밭의두둑과고랑은매년혹은계절
별로 다시 이랑짓기가 이루어졌다. 이랑의 길이와 폭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또한 모든 이랑이
정연하게 직선적인 형태로 조성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밭의 형태는 청동기시대 집약농경 형태가
완전히 정형화된 것은 아니며, 불규칙적이고 우연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평리유
적의 밭이 정형화되거나 획일화되지 못한 점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 지역의 집약농경의 형태가
다수의개별가계들의공동결정에기인한결과라는하나의모델로설명될수있을것이다.
또한 고식물학적 연구에 따른 재배작물의 종류의 다양성을 통해 볼 때, 대평리유적의 밭은 1년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97
에 두번의 작물 재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휴경상태로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밭에물을공급해주는수로나배수시설, 그 밖의다른관련유구들이없고, 또한자연적으로
배수가잘되는입지에밭이조성된맥락은개별가계가농경활동을충분히할수있었다는생각에
더욱무게감을실어준다. 게다가, 대평리유적의청동기시대밭은물흐름의이점을이용하여언제
나 쉽게 배수와 용수가 가능하도록 밭이 조성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 도작 농경과 비교할 때, 그
리고전세계의고고학적이고민족지적농경예에서볼때, 대평리유적의밭조성과관련된시설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Crawford and Lee 2003; 郭鐘喆 2001; Lansing 1991;
Scarborough 1991).
대평리유적에서 청동기시대의 밭의 조성과 유지는 북아메리카의 티티카카(Titicaca)호수 주변
에 있는 밭(raised fields)(Erickson 1993)이나 혹은 발리의 도작 농경과 관련된 관개시설
(Lansing 1991)과 같이많은노동력을필요로하지는않았던것으로보인다. 즉, 대평리유적의밭
은 많은 양의 흙을 파올려 높게 조성된 것도 아니고, 도작 농경과 같이 상당한 관개시설이 필요했
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 밭 경작은 지형과 토양조건에 있어서 도작 농경과 비교할
때, 비교적 다양한 환경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작물의 재배와 수확 주기도 도작 농경보다는 짧고
단순하다(윤호필·고민정 2006).
이상의대평리유적의밭의조성과사용, 유지등에관한고고학적정황들에서는 bottom-up 경
향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Ⅳ장에서 살펴 본 대평리유적의 집약 농경과 관련하여 취락
내에서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 또한 잉여 곡물의 저장 등을 살펴 볼 때, 몇가지 증거들은 top-
down 과정과 더욱 일치한다. 그중 한가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소 집중화된 권력을 가진
엘리트계층이밭경작과수확된곡물을통제하거나관리, 소유할수있었다는증거로, 대평리유적
에서는 엘리트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호 지역 가까이에는 밭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수있다.
또한저장용수혈이나대형의호형토기, 고상건물등은옥방1지구의환호안쪽에서주로확인된
다는 점이다. 만약, 밭의 조성과 유지, 농경에 이용된 노동력 등이 비엘리트 집단의 개별 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왜 대부분의 저장용 시설들이 이중환호(제3환호) 바깥쪽에 집중되어 있을
까? 이것은 또한 엘리트의 주거지도 이중환호(제3환호)의 안쪽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평리지역에서 농경 잉여물을 저장하는 데에 있어서 엘리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 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위에서 소개했던 고고학적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집약 농경에 의해서 생산된 잉여물에 대한 엘
리트의통제와개별가계사이의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선사시대의정치, 경제는교
환을 위한 위세품을 생산하기 위해 엘리트가 잉여물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엘리트 집단 자체가 위세품의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평리지역의 엘리
트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옥 장신구와 마제석검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98 경남연구_제1호 2009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대평리유적의 환호 주변에서는 대형토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고, 또한 환
호안쪽에서도남강-경호강유역의취락체계중에서가장다양한종류의대형의호형토기와의례
용 적색마연토기, 소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대평리유적의 환호 안쪽에서 출토된 대형토기나 소
형토기들은 환호 내부의 깊숙한 장소가 공동의 의례와 축제를 위한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옥방2지구의 대규모의 밭 주변 주거지에서 저장용으로 추정되는 대형토기와 수혈유
구들이많이출토되었다는것또한중요한사실이다.<표 2와 표 3> 하지만, 고상건물은환호의안
쪽과 바깥쪽 모든 곳에 위치하는데, 그것은 대평리유적에서 대부분의 잉여물의 저장이 공동의 의
례와축제활동에서사용되었다는것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청동기시대대평리사회는위의여러가지고고학적정황으로볼때, 집단지향적인사회전통에
기반을둔사회 다고볼수있다. 하지만청동기시대후기에수공업생산과생산활동의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의례와 축제활동과 같은 공동의례가 권력과 특권을 모색하려고 했던 엘리트들에
의해이용된공동전략의한부분이었다는것이다(고민정·Bale 2008). 또한 엘리트들은옥방1지
구 16호 수혈과 같은 저장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엘리트가 그들 자신을 위한 잉여물을 수혈 내부에
따로비축해두려고했던증거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청동기시대후기경남서부지역의대규모취락인진주대평리유적의취락구조와밭의
특징, 수확 형태, 저장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집약 농경과 사회 조직간의
상관관계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대평리취락은집단지향적인사회전통에기반을둔사회 다.
대평리 취락에서 경작지 조성과 관련 시설 등 농경활동의 구축과 유지는 지도자들의 출현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평리유적의 밭이 정형화되거나 획일화되지 못한 점과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되는 입지에 밭이 조성된 맥락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집약농경 형태가 다수
의 개별 가계들의 공동 결정에 기인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처럼 대평리유적의 밭의 조성과 사용,
유지등에관한고고학적정황들에서는 bottom-up 경향을띠는것으로볼수있다. 즉, 대규모의
밭을공동으로경 하고, 장기간사용하고다시재조성하는등개별적가계들의활동에의해농경
활동이유지된것이라는것을보여준다.
하지만, 엘리트계층이 밭 경작과 수확된 곡물을 통제하거나 관리, 소유할 수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다. 집약농경과관련된농경잉여물을저장했던저장수혈, 대형토기, 고상창고등과같은다수
의 저장시설이 옥방지역의 환호 안쪽에서 확인된다는 점과, 엘리트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호 지역 가까이에는 밭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취락 내에서
혹은취락간의위세품의생산과분배등과함께 top-down 관점과더욱일치하는것으로파악된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99
다. 이는 공동의례 혹은 개인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농경 잉여물의 일부를 당시
엘리트들이어느정도통제했을가능성을말해준다.
이상의논의는사회적관점으로부터집약농경의복합성을인정하는사람중심적인접근법을제
시하고자하 다. 비록충분한논의는이루어지지못했지만, 개별가계의농경민중심적인관점과
엘리트중심적인관점에서이들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논의하 다. 하지만金範哲(2006: 59)이
제시했던 것처럼, 청동기시대의 집약 농경과 사회정치적 맥락에 관하여 엘리트계층의 형성과정이
나 존재양태, 도작 농경의 시작(혹은 확대)과의 관계 연구는 개방형 연구주제로서, 다양한 측면의
고고학적정보를이용하여더욱깊이연구되어야할과제이다.
100 경남연구_제1호 2009
<<참참고고문문헌헌>>
慶南考古學硏究所, 2002,『晉州大坪玉房 1·9地區無文時代集落』.
慶南發展硏究院歷史文化센터, 2006·2007·2008,「晉州平居洞遺蹟」, 현장설명회자료.
慶尙大學校博物館, 1999,『晉州大坪里玉房 2地區先史遺蹟』.
慶尙大學校博物館, 2001,『晉州大坪里玉房 3地區先史遺蹟』.
高旻廷, 2004,「南江流域無文土器文化의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_______, 2005,「무문토기시대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 고찰」『咸安 鳳城里遺蹟』, 慶南發展硏究院
歷史文化센터.
고민정·Martin T. Bale, 2008,「청동기시대후기수공업생산과사회분화」『韓國靑銅器學報』2.
郭鐘喆, 2001,「우리나라의 선사·고대 논밭유구」『韓國農耕文化의 形成』, 제25회 韓國 考古學
全國大會發表要旨.
國立中央博物館, 2003,『겨레와함께한쌀: 새천년특별전도작문화 3000년』, 통천문화사.
國立晉州博物館, 2001,『晉州大坪玉房 1地區遺蹟』Ⅰ·Ⅱ.
國立晉州博物館, 2002,『청동기시대의대평·대평인』, 국립진주박물관특별전도록.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2001,『晉州大坪里漁隱 2地區先史遺蹟』Ⅰ.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2003,『晉州大坪里玉房 8地區先史遺蹟』.
김권구, 2005,『청동기시대 남지역의농경사회』, 학연문화사.
金度憲, 2005,「청동기시대 남지역의 환경과 생업」『 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남고
고학회발표요지, 남고고학회.
金範哲, 2006,「중서부지역靑銅器時代水稻生産의政治經濟」『韓國考古學報』58.
金炳燮, 2003,「韓國의古代밭遺構에대한檢討」『古文化』62.
김장석, 2008,「송국리단계저장시설의사회경제적의미」『韓國考古學報』67.
東亞大學校博物館, 2002,『晉州玉房遺蹟』.
朴淳發, 2001,「‘南漢地方農耕文化形成期聚落의構造와變化’에대한토론요지」『韓國農耕文化
의形成』, 제25회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배덕환, 2000,「청동기시대굴립주에대한일고찰」『제1회문화재보호재단학술세미나발표요지』.
裵德煥, 2005,「청동기시대 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남고
고학회학술대회발표요지.
安在晧, 2006,「靑銅器時代聚落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文學博士學位論文.
尹昊弼, 2008,「靑銅器時代의 農耕과 社會」『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발표요지, 韓國靑銅器學會.
윤호필·고민정, 2006,「밭유구조사법및분석방법」『야외고고학』1(1),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101
李炅娥, 1998,「古民族植物學의硏究方法과韓國에서의展望」『嶺南考古學報』23.
_______, 2000,「송국리유적 11차조사식물유체보고」『松菊里Ⅵ』, 國立夫餘博物館.
_______, 2001,「옥방1지구식물유체분석」『晉州大坪玉房 1地區遺蹟』, 國立晉州博物館.
_______, 2004,「마전리유적식물유체분석」『麻田里遺蹟: C地區』,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硏究所.
_______, 2005,「植物遺體에 基礎한 新石器時代‘農耕’에 대한 觀點의 再檢討」『韓日新石器時代
의 農耕問題』, 第6會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韓國新石器硏究會·
九州繩文硏究會.
이경아·Gary W. Crawford, 2002,「옥방 1,9지구 출토 식물유체 분석보고」『晉州 大坪 玉房
1·9地區無文時代集落』, 慶南考古學硏究所.
李相吉, 1997,「진주 대평리 전작지의 구조와 의의-어은 1지구를 중심으로」『호남고고학의 제문
제』, 제21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_______, 1999,「진주대평어은1지구선사유적」『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동아대학교박물관.
_______, 2000,「南江流域의農耕-大坪地域밭을中心으로-」『南江南江遺蹟과古代日本-고대한
일문화교류의제양상』, 경상남도·인제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_______, 2002,「南部地方 初期農耕의 現段階-遺構를 中心으로-」『韓日 初期農耕 比較硏究』, 韓
日合同심포지움및現地檢討會, 大阪市學術員等共同硏究韓半島綜合學術調査團.
李相吉·李炅娥, 1998,「大坪 漁隱1地區 遺蹟과 植物遺體」『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제7회
남고고학대회발표요지.
李春寧, 1989,『韓國農學史』, 民音社.
李亨求, 2001,『晉州大坪里玉房 1地區先史遺蹟』, 鮮文大學校.
崔德卿, 2002,「古代韓國의旱田耕作法과農作制에對한一考察」『韓國上古史學報』37.
최종규, 2002,「옥방환호」『청동기시대의대평·대평인』, 國立晉州博物館.
崔憲燮, 1998, 「韓半島中·南部地域先史聚落의立地類型」, 慶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문문>>
Bale, Martin T. 2001 Archaeology of Early Agriculture in Korea: An Update on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1(5): 77-84.
Bale, Martin T. and Min-jung Ko 2006 Craft Production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Asian Perspectives 45(2): 159-187.
Blitz, John H. 1993 Big Pots for Big Shots: Feasting and Storage in a Mississippian
Community. American Antiquity 58(1): 80-96.
102 경남연구_제1호 2009
Boserup, E. 1965 The Conditions of Agricultural Grow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Chambers, Robert 1980 Basic Concepts in the Organization of Irrigation. In
Irrigation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sia, edited by
W.E.Coward Jr., pp.28-50.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Clark, John E. and Michael Blake 1994 The Power of Prestige: Competitive
Generosity and the Emergence of Rank Societies in Lowland
Mesoamerica. In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edited by E. Brumfiel and J. Fox, pp.17-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Crawford, Gary W. and Gyoung-Ah Lee 2003 Agricultural Origins in the Korean
Peninsula. Antiquity 77(295): 87-95.
DeBoer, Warren R. 1988 Subterranean Storage and the Organization of Surplus: The
View from Eastern North America, Southeastern Archaeology
7(1):1-20.
Earle, Timothy 1977 A Reappraisal of Redistribution: Complex Hawaiian Chiefdoms.
In Exchange Systems in Prehistory, edited by T. Earle and J.
Ericson, pp.213-232. Academic Press, New York.
________________ 1997 How Chiefs Come to Power: The Political Economy in
Pre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Erickson, Clark L. 1993 The Social Organization of Prehistoric Raised Field
Agriculture in the Lake Titicaca Basin. In Economic Aspects of
Water Management in the Prehispanic New World, edited by V. L.
Scarborough and B. L. Isaac, pp.369-426. JAI Press, Greenwich,
Connecticut.
____________________ 2006 Intensification, Political Economy, and the Farming
Community. In Agricultural Strategies, edited by J. Marcus and
C. Stanish, pp.334-363.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UCLA,
Los Angeles.
Fisher, Christopher T. 2007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in the Lake P?tzcuaro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103
Basin: Landesque Capitalas State craft. In Seeking a Richer
Harvest: The Archaeology of Subsistence Intensification,
Innovation, and Change, edited by T. L. Thurston and C. T.
Fisher, pp.91-106. Springer, New York.
Janusek, John W. and Alan L. Kolata 2004 Top-down or bottom-up: Rural
Settlement and Raised Field Agriculture in the Lake Titicaca
Basin, Boliv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3:
404-430.
Kim, Bumcheol 2005 Ric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and Sociopolitical Development
in the Bronze Age, Central Western Korean Peninsul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oquest, Ann Arbor.
Kirch, Patrick V. 1984 The Evolution of Polynesian Chiefdo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Kolata, Alan L. 1993 The Tiwanaku: Portrait of an Andean Civilization. Blackwell,
London.
Lansing, Stephen 1991 Priests and Programmers: Technologies of Power in the
Engineered Landscape of Bal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Lee, Gyoung-Ah 2003 Changes in the Subsistence Systems in Southern Korea from
the Jeulmunto Mumun Periods: Archaeobotanical Investig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Miller, Heather M.-L. 2006 Water Supply, Labor Requirements, and Land
Ownership in Indus Floodplain Agricultural Systems. In
Agricultural Strategies, edited by J. Marcus and C. Stanish,
pp.92-128.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UCLA,
LosAngeles.
Morrison, Kathleen D. 1994 The Intensification of Production: Archae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1:111-159.
Rhee, S. N. and M. L. Choi 1992 Emergence of Complex Society in Prehistoric Kore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6:51-95.
Rogers, J. Daniel 1995 Dispersed Communities and Integrated Households: A
104 경남연구_제1호 2009
Perspective from Spiro and the Arkansas Basin. In Mississippian
Communities and Households, edited by J. D. Rogers and B. D.
Smith, pp.81-98. University of Alabama Press, Tuscaloosa.
Scarborough, VernonL. 1991 Water Management Adaptations in Nonindustrial
Complex Societies: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ume 3, edited by M.
B. Schiffer, pp.101-154.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Steward, Julian H. (editor) 1955 Irrigation Civilizations: A Comparative Study. Pan
American Union, Washington.
Thurston, Tina L. and C.T. Fisher 2007 Seeking a Richer Harvest: An Introduction
to the Archaeology of Subsistence Intensification,
Innovation, and Change. In Seeking a Richer
Harvest: The Archaeology of Subsistence
Intensification, Innovation, and Change, edited by
T. L. Thurston and C. T. Fisher, pp.1-21.
Springer, NewYork.
Ur, Jason A. 2004 Urbanism and Society in the Third Millennium Upper Khabur
Basi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Proquest,
Ann Arbor.
Wesson, Cameron B. 1999 Chiefly Power and Food Storage in Southeastern North
America. World Archaeology 31(1):145-164.
Wilk, Richard R. 1983 Little House in the Jungle: The Cause of Variation in House
Size Among Modern Kekchi May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2): 99-116.
1988 Maya Household Organization: Evidence and Analogies. In
Household and Community in the Mesoamerican Past, dited by R.
R. Wilk and W. Ashmore, pp.135-151.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Albuquerque.
Wittfogel, Karl A. 1957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청동기시대후기농경집약화와사회조직_105
<Abstract>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in the Late Bronze Age
Min-jung Ko* & Martin T. Bale**
In the late Bronze Age, small-sized, square or round shape houses emerged along with large
scale settlements involving the ditch-and-palisades, tombs, and agricultural areas. Besides,
intensive agriculture and social differences appeared centering on large scale communities in
many parts of the countries. Daepyeong was the centre of a two to three-tier settlement
system in the Nam-Gyeongho-gang River Basin that was composed of six villag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archeological context, Daepyeong society was underpinned by
traditions of group-oriented society. Also, It is said that as production activities including
manual industry were concentrated, the public formality was used by elites as a strategy to
gain authority and privileges. Variability in the size and kind of dry-fields is apparent in
Daepyong. The irregularity and lack of uniformity in the Daepyeong dry-fields are more
consistent with a model in which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intensive agriculture resulted
from thousands of decisions of individual households. If we consider all the lines of evidence
germane to intensive agriculture, bottom-up trends define the building, use, and maintenance
of the dry-fields.
But, some trends are more in line with top-down processes. Evidence that a managerial
authority such as a chief controlled or planned or could have owned the fields and the
harvested grains, most of the dry-fields in Daepyeong were not built close to the area where
elite resided: the ditch-and-palisade area. A significant amount of storage capacity in the
form of pits, large-capacity pottery, and raised-floor buildings is found in the ditch-and-
palisade area of Okbang.
Key words: Late Bronze Age, dry-fields, patterns of storag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social organization, bottom-up trends, top-down trends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Historical Cultural Center**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Toronto,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