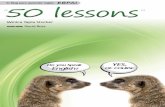한국어에 과연 관계절이 존재 하는가: 분사절 분석 (Are There Relative Clauses in...
Transcript of 한국어에 과연 관계절이 존재 하는가: 분사절 분석 (Are There Relative Clauses in...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분사 분석*1
채희락
(한국외국어 학교)
Chae, Hee-Rahk. 2012. Are There Relative Clauses in Korean?: A Participle
Clause Analysi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7-4, 1043-1065.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Korean adnominal clauses, most of which ar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relative clauses. However,
they have properties which cannot be attributed to relative constructions. Firstly, the gaps in them are different from those in relative clauses: they have the properties of null anaphors. Secondly, the adnominal clauses do not require
gaps: there are some sub-types of adnominal clauses which do not contain any gap associated with the head noun syntactically. Based on these observations, we propose that Korean adnominal clauses should be analysed
as a clausal unit participle construction. This approach is a development of those in Matsumoto (1988, 1997) and Comrie (1996, 1998a, 1998b, 2003), on the one hand, and those in Na and Huck (1993), Yoon (2011) and Yeon (2012),
on the other. These approaches are emphasizing the role of semantics and/or pragmatics in analyzing adnominal clauses in such languages as Japanese and Korean. Major contribu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e have provided a unified analysis of Korean adnominal clauses, which deals with “non-regular” adnominal clauses as well. Secondly, we have established a theoretical basis on captu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ystematically between relative clauses and participle clauses in analyzing other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adnominal clauses, relative clauses, gaps, null anaphors, island constraints, participle clauses, Korean
1. 도입
계 구문은 세계 여러 언어에 존재 하는 표 인 구문으로 이에 한 선행
연구는 수 없이 많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일반 으로 형 이 “ 계 (relative
*1이 논문은 2012년 10월 27일 한국언어학회 가을 학술 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수정한 것으로
2012년도의 한국외국어 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완성되었다. 학술 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분들, 특히, 김창섭 교수님과 이정민 교수님 임홍빈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투고 논문에 해 좋은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 원들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린다.
채희락1044
clauses)”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이에 한 선행 연구가 일일이 나열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형 은 형 인 계 로 보기 힘 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일본어를 심으로 이에 한 지 이 있어 왔으며 (Matsumoto 1988, 1997;
Comrie 1996, 1998a, 1998b, 2003), 한국어에 해서도 형 인 계 과는 달리
의미-화용 인 속성이 매우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Comrie
1989: 151-3, Song 1991, Na/Huck 1993, 연재훈 2012). 그 지만 한국어에 계 이
정말 존재 하는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어떤 구문으로 분석 되어야 할지 등에
한 구체 인 논의는 별로 없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에 한 답을
찾아 보려고 한다.
논문의 반부에서는 한국어 형 을 계 로 분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속성들을 객 으로 살펴 볼 것이다. 2.1 에서는 먼 계 구문이 유형론 으
로 어떤 책략들을 사용 하는지 간단히 정리 하려고 한다. 그리고 2.2 에서는 한국어
형 의 속성을 형 속에 나타나는 “공백(gaps)”의 특성을 심으로 살펴
보고 형 의 여러 유형에 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후반부
에서는 형 을 계 구문이 아니라 분사 구문으로 분석 하는 것이 합리 임을
보이려고 한다. 3.1 에서는 분사 구문이 그 작용역의 범 에 따라 단어 단 와
구 단 단 로 나 어 짐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3.2 에서는 한국어
형 이 단 분사 구문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2. 계 구문과 한국어 형
한국어 형 을 계 로 분석 하게 되는 가장 요한 근거는 형 속에
이 형 이 수식하는 “핵어(heads)” 명사에 상응하는 공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공백이 형 인 계 속에 들어 있는 공백과 동일한 유형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계 이외의 여러 문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백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 제약(island constraints)”을 수 하지
않아도 문법성에 문제가 없는 들이 많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공백을
포함 하고 있지 않는 형 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속성들을 살펴 보기 에
먼 계 구문이 어떻게 정의 되며, 계 속에서 핵어 명사에 상응 하는
요소를 나타내기 해 유형론 으로 어떤 책략들이 사용 되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2.1. 계 구문: 유형론
계 은 종속 의 일종으로 상 문의 특정 명사, 즉 핵어 명사를 수식 하는
기능을 한다.1 Lehmann (1986: 664)은 “ 계 구문(relative constructions)”을 의미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45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고 한다.
(1) A relative construction is a construction consisting of a nominal (which
may be empty) and a subordinate clause interpreted as attributively
modifying the nominal. The nominal is called the head and the subordinate
clause the relative clause. The attributive relation between head and relative
clause is such that the head is involved in what is stated in the clause.
계 구문에서 핵어 명사와 계 의 “수식 (attributive)” 계는 핵어 명사가
계 이 나타내는 바의 진술 내용에 여가 되어 있다는 정도도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명사 수식의 기능만으로 계 을 정의 할 수는 없다.2 왜냐하면 “수식”
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지, 명사를 수식 하는 모든 을 계 이라고
할 수 있을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3 이런 의미에서, 세계 여러 언어의 계 에
서 어떤 형태-통사 인 장치를 사용 하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 요하다.
계 은 수식을 받는 핵어 명사가 계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에 따라
크게 “외부/외핵 계 (external/head-external relatives)”과 “내부/내핵 계
(internal/head-internal relatives)”로 나 어 진다 (Keenan 1985: 141-3).
(2) a. I picked up two towels [that were lying on the floor].
b. [Tl’eedaa’ hastiin yalti’-ee] alhosh.
last night man spoke-Rel sleep
‘The man who spoke last night is sleeping.’
어 문장 (a)에서는 핵어 명사 towels가 계 바깥에 있으며, Navajo 문장 (b)에서
는 핵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 hastiin이 계 내부에 있다.
Keenan (1985: 146-55) 등에 따르면, 핵어 명사에 상응하는 요소가 계 내부에
서 표시 되는 방식을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 수 있다: 인칭 명사(personal
pronouns), 계 명사(relative pronouns), 명사 구(full NPs) 혹은 공백(gaps)을
활용하는 방식 (Lehmann 1986, Nikolaeva 2006; Comrie 1989: 147-53, Tallerman
2011: 257-9 등).
1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상을 “제한 계 (restrictive relative clauses)”로 한정 하고자 한다.
2 실제로 Lehmann (1986: 666)도 통사 “운용자(operations)”의 다발로 계 구문의 형성을 설명
하고 있다.
3 명사 수식이라는 기능만 생각할 때는 “분사 (participle clauses)”도 계 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cf. 연재훈 2012: 414).
채희락1046
(3) a. the paper [(which) we discuss __ next week]
b. This is the guy [who my cat is smarter than __/him].
c. [Peeme coqtsee waa-la turka thii-pe] coqtse the na noo-qi yin
Peem table under cross write table the I buy-Pres be
‘I will buy the table under which Peem made a cross.’
문장 (a)에서는 which가 핵어 [(the) paper]에 상응하는 명사로 사용 되었다.
이처럼 핵어를 표시 하기 해 계 내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종류의 명사를
계 명사라고 한다. 어에서는 계 명사가 생략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핵어에 상응 하는 표 이 명시 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생략된 요소, 즉 공백이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문장 (b)에서는 핵어에 상응하는 요소로 일반 인칭 명사가
나타난다. 이런 명사를 일반 으로 “회생 명사(resumptive pronouns)”라고
한다. Tibetan 문장 (c)에서는 핵어 coqtse가 계 속에서 (속격 형태의 명사구로)
그 로 반복 되어 나타난다.
2.2. 한국어 형 의 속성
한국어 분석에서 부분의 학자들이 계 로 보고 있는 형 인 형(사) 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4) 나는 [친구가 __ 사 주-ㄴ] 책을 어제 다 읽었다.
핵어 명사 ‘책’이 형 외부에 있으며 형 내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백이
있다. 그리고 형 의 동사는 형형 어미 의 하나인 ‘-ㄴ’을 가지고 있다.
그 외 한국어 “ 계 ”의 특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구문들이 분석의
상이 되어 오고 있다.
(5) a. [[만두 빚은] 것을] 먹었다.
b. [[도둑이 도망 가는] 것을] 잡았다.
(6) a. [자기의 개가 총명한] 그 사람
b. [내가 그의 명찰을 떼어 버린] 학생
c. [[그가 되돌아 갔을 때] 모두가 반가와 했던] 난 군
(7) a. [생선이 타는] 냄새
b. [바람이 부는] 소리
c. [술 마시는] 직장 생활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47
d. [손 씻을 필요가 없는] 음식으로 먹읍시다.
(5)의 문들은 내핵 계 로 분석이 되어 왔지만 (Kim 2002, Jo 2005, Kim 2008,
연재훈 2012: 420 등),4 (최소한 형식 으로는) 종속 의 술어가 형형 어미를
가지고 있으며 ‘것’이 핵어 명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 로 분석을 한다면 외핵
계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것’이 ‘만두’나 ‘도둑’으로 해석 되기 때문에
의미 으로는 내핵 계 인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5 (6)의 형
속에는 인칭 명사인 회생 명사가 나타난다 (Keenan/Comrie 1977: 74, 이선우
1984: 55 등). 재귀 명사와 일반 인칭 명사가 모두 회생 명사가 될 수 있다.
자료 (7)에서는 형 속에 핵어에 상응하는 공백이 없다 (“gapless relatives”:
Kim 1998a, 연재훈 2012: 441).6
Keenan/Comrie (1977: 66)은 계 속의 어떤 요소가 계화가 가능한지에
한 일반화로 아래와 같은 “ 계화 가능성 계(Accessibility Hierarchy)”를 제안
했다 (cf. Lehmann 1986: 666-7).
(8) 주어 > 직 목 어 > 간 목 어 > 사격 보어 > 소유격
이 계에 따르면 주어가 제일 쉽게 계화가 되며 오른 쪽으로 갈수록 계화가
어려워 진다.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왼 쪽 요소들의 계화가 오른 쪽 요소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많이 나타나리라고 상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련 연구와
본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재훈 (2012: 435, 440)은 어, 스웨덴어, 이태리어, 랑스
어 등 계 후행 언어들은 일반 으로 계 가설을 따르지만, 한국어, 일본어,
국어 등 계 / 형 선행 언어들은 그 부합성의 정도가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의 계 (8)을 따르지 않는 언어들에서의 “ 계 ”은 형 인 계 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유형을 이룬다는 일련의 선행 연구가 있다.
Matsumoto (1988, 1997)와 Comrie (1996, 1998a, 1998b, 2003)는 일본어 등 아시아
언어들의 형 을 “일반 명사 수식 구문(general noun-modifying constructions)”
4 Jo (2005: 203, 206)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존 명사로서의 ‘것’을 수식하는 형 을 “light-headed relatives”라고 하고 있다: ‘[순애가 수일에게 ] 것은 책이다.’ 여기서는 ‘것’이 형 의 논항 역할을
한다. 이는 일반 형 과 마찬가지로 계 이지만 (5)의 형 은 계 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5 문장 (5b)에서 주 의 술어를 ‘보았다, 촬 했다, 치 챘다’ 등으로 바꾸면 ‘것’이 종속 체를
나타내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것’이 형 의 특정 요소를 지칭 하는지 체의 내용을 지칭 하는지에 따라 의 인 문장이 될 수 있다.
6 연재훈 (2012: 423)에서는 (7c)가 핵어 명사가 형 술어의 부가어 역할을 하는 로 나오지만,
형 이 ‘직장’을 수식하는, 즉 직장에서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어 ‘직장에서’가 핵어 명사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희락1048
으로 분석 하고 있다. 연재훈 (2012)도 이런 에서 한국어 형 해석에 있어서의
의미-화용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Comrie (2003: 25)는 계 의 특성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 하고 있다.
(9) a. They are a distinct construction type that can be identified as “relative
clauses.”
b. There is a clear syntactic link between the main clause and the relative
clause, such that the relative clause can be analyzed syntactically as
a clause modifying a noun phrase in the main clause and such that
there is a notional head that is shared by both clauses, that plays a
syntactic role in both clauses.
계 은 주 속의 명사구를 수식 하는 통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주 과 계 에
서 각각 어떤 통사 인 역할을 하는 개념 핵어를 공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 시키지 못 하지만 계 의미가 나올 수 있는 유형으로
일반 인 주 -종속 의 계로 보아야 하는 “adjoined relative clauses”와 수식어-
피수식어의 계로 보아야 하는 일반 명사 수식 구문을 소개 하고 있다.
(9)에서 밝힌 계 의 특성을 바탕으로, Comrie (2003: 29-33)는 다음과 같은
형 인 일본어 “ 계 ”을 공백 책략을 사용 하고 있는 계 로 분석 할 수
없고 명사 수식 로 분석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cf Matsumoto 1997).
(10) [gakusei-ga katta] hon
student-Nom bought book ‘the book [that the student bought __].’
첫 번째 이유는 “null anaphor” 언어인 일본어에서는 (목 어가 생략된) 계 이
그 로 정상 인 주 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일본어에는
계 로 해석 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명사구 수식 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11) a. [gakusei-ga hon-o katta] zizitu
student-Nom book-Acc bought fact
‘the fact [that the student bought the book]’
b. [dareka-ga doa-o tataku] oto
someone-Nom door-Acc knock sound
‘the sound of [someone knocking at the door]’
이 두 문장은 일반 인 계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이 문장들과 (10)을 모두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49
어의 “such that” 구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7
(12) a. the book such that the student bought it (10)
b. the fact such that the student bought the book (11a)
c. the sound such that someone knocked at the door (11b)
의 이유들을 바탕으로, Comrie (2003: 31)는 일본어의 (10)과 (11) 같은 자료들이
모두 이 핵어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 구조로 분석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해당 문장에 한 한 해석은 의미와 화용 추론의 상호 작용에 의해 도출
되는데, 어떨 때는 계 인 의미가 나오고 어떨 때는 다른 의미가 나온다고
한다.8 이런 맥락에서 연재훈 (2012: 5-6장)은 한국어 “ 계 ” 해석에서 의미-화용
인 정보가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핵어 명사가 하 범주화
된 요소 뿐만 아니라 화용 인 상황에 따라 다른 요소들도 선택 될 수 있는 을
강조 한다.
(13) a. [책을 산] 학생
b. [[연 선생이 산] 백화 이] 어디에요?
문장 (a)에서는 상황에 따라 ‘학생’이 책을 구입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을
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문장 (b)에서는 ‘백화 ’이 연 선생이 물건을 산
장소일 수도 있고 연 선생이 매입 한 건물일 수도 있다.
문장 (13a-b)에서는 핵어 명사가 형 술어의 보충어나 부가어와 공지시 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통사 인 정보에 의해 결정 된다. 통사 으로 가능한 공지시
계가 둘 이상 성립 할 때는 화용 인 상황에 따라 구체 인 해석이 결정 된다.
그런데, (7)이나 아래의 자료에서처럼 형 내에 핵어 명사와 공지시 계를
이루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핵어와 형 사이의 “연 성”이 으로 배경
지식 등의 화용 인 요소에 의해 결정 된다 (Comrie 1998b, 연재훈 2012: 445).9
7 Comrie (2003: 31)에서는 (10)의 의미를 ‘the student such that he bought the book’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12a)로 수정 되어야 한다.
8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emantics — in particular, the frames of the various predicates — would then interact with pragmatic inferencing to giv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which would
sometimes be like that assigned to an English relative clause, sometimes not.”
9 Comrie (1998b)는 계 구문 형성의 가장 요한 조건으로 화자들이 핵어 명사와 계 사이에 “그럴듯한 계(a plausible relation)”를 추론 할 수 있어야 함을 들고 있다 (cf. Nikolaeva 2006: 507).
연재훈 (2012: 445)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핵어 명사와 계 사이의 의미-화용
계는 그럴듯하게 성립 가능한 연 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성립 가능한 연 성’이란 화 참여자간의 언어외 세계 지식, 배경 지식 등을 통해서 성립 할 수 있는 연 성을 말한다.”
채희락1050
(14) a. [머리가 좋아 지는] 책
b.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연속극
c. 1960년은 [[철수가 서울에 온] 이듬해]-이다.
(a-b)의 자료에서,10 ‘책’과 ‘연속극’은 각각 ‘머리가 좋아 지다’와 ‘(화장실에)
갈 수 없다’라는 서술어와 아무런 통사 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들 자료에
서는 계 속에 ‘그 책을 읽으면’ 등과 같은 부사 이 생략 되었다고 가정 하면
핵어 명사와의 계를 간 으로라도 규정할 수 있지만,11 자료 (c)에서는 그런
계를 포착하기가 더 어렵다. 철수가 서울에 온 것은 1959년이기 때문에 ‘이듬해’가
형 속에서 어떤 통사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통사 으로는 앞의 형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 하는 계에 있다는
것밖에 규정 할 수가 없다.
이제까지 한국어 형 을 계 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본어와
한국어 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이제부터는 한국어 자료에
을 맞추어 한국어에 정말 계 이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지에 한 구체 인 논의를 해 보려고 한다.12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의 형 인 형 은 핵어 명사와 공지시 계를 이루는 공백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친구가 작년에 __ 사 주-ㄴ] 책을 어제 다 읽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공백을 유형론 으로 보았을 때 계 구성 책략 의 하나인
공백 책략에서 말하는 공백과 동일한 유형의 공백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일한 유형이라면 (4)의 형 은 계 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4)의 종속
을 계 로 분석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4)의 공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를 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 것이 어떤 속성의 공백인지
생각 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공백이 과연 계 구성을 한 계 만의
공백인지 혹은 좀 더 일반 인 유형의 공백인지를 악 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의
10 자료 (14a)와 (14c)는 Matsumoto (1997: 6, 9)에 나오는 일본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자료
(14b)는 연재훈 (2012: 445)에 나온다.
11 실제로 이정민 교수께서 그런 방법을 제안 했지만, (14a)의 형 속에서 ‘그 책을 읽으면’과 같은 부사 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 통사 인 근거는 없다고 본다.
12 연재훈 (2012)이 한국어 “ 계 ”의 특이성을 종합 으로 살펴 보고 있지만 한국어 형 을 계 로
보아야 할지 아닐지에 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는 414쪽 각주에서 “한국어에 계 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만 지 하고 있다.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51
모든 형 이 공백을 가지고 있는지, 즉 공백이 형 의 필수 인 요소인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이 두 측면은 (10)과 같은 일본어 형 을 계 로 볼 수
없다는 Comrie (2003)의 분석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 한국어는,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null anaphor” 언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어에서도 주어나 목 어 등 일부 요소가 생략 되어도 정상 인
주 로 사용 될 수 있다. (4)와 같은 형 에서 공백이 없으면 비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15) a. *[철수가/그가 희를 사랑하는] 철수 (cf. [__ 희를 사랑하는] 철수)
b. *[(그) 사람이/그가 물건을 는] (그) 사람
(cf. [__ 물건을 는] (그) 사람)
c. *[(그) 선생님이/그가 뛰어 가시는] (그) 선생님
(cf. [__ 뛰어 가시는] (그) 선생님)
그 지만 이런 상은 형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여러 구문에서
일반 으로 나타난다.
(16) a. *철수는 철수를/그를 믿는다. (cf. 철수는 __ 믿는다.)
b. *그 사람은 [그 사람이/그가 논리 이라고] 생각한다.
(cf. 그 사람은 [__ 논리 이라고] 생각한다.)
c. *[(그) 선생님은 딸에게 집을 보라고 하고]
[(그) 선생님은 화 구경을 갔다].
(cf. [(그) 선생님은 딸에게 집을 보라고 하고] [__ 화 구경을 갔다].)
d. *(그) 새가 [(그) 새가 울면서] 날아 갔다.
(cf. (그) 새가 [__ 울면서] 날아 갔다.)
물론, 친 자리에 재귀 명사나 이에 상응 하는 의미를 가진 표 이 나오면
의 문장들은 모두 정문이 된다.
(17) a. 철수는 자기를/(자기) 자신을/본인을 믿는다.
b. 그 사람은 [자기가/(자기) 자신이/본인이 논리 이라고] 생각한다.
c. [(그) 선생님은 딸에게 집을 보라고 하고]
[자기는/(자기) 자신은/본인은 화 구경을 갔다].
그 지만 재귀 명사나 상응 표 이 들어 가면 (15)의 형 도 모두 정문이 된다.
채희락1052
(18) a. [자기가/(자기) 자신이/본인이 (가장) 희를 사랑하는] 철수
b. [자기가/(자기) 자신이/본인이 (직 /몸소) 물건을 는] 사람
c. [자기가/(자기) 자신이/본인이 (직 /몸소) 뛰어 가시는] 선생님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 해 보면 우리는 형 속에서의 공백이 형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공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형 속의 공백만
을 한 원리/원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5)의 형 과 (16)의 다른
구문들 속의 공백을 모두 함께 설명 할 수 있는 좀 더 포 인 원리/원칙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13
형 속의 공백이 형 인 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공백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직 인 증거는 형 이 “섬 제약(island constraints)”을 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4 먼 , 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계 속의 요소가 계화
되는 경우는 없다.15 그 지만 한국어에는 이런 구문도 상당히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 (cf. 이선우 1984, 신효필 1994, Kim 1998b, Han/Kim 2004, Yoon 2011).
(19) a. [[__ __ 사랑 하던] 애인이 죽어 버린] 철수
b. [[__ __ 빈 떡을 먹은] 신사가 매를 맞은] 요리 집
13 한 익명의 심사 원이 “의미/화용 해석에 기반 한 “결속(binding)” 상과 통사 계 상을 비교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시 했다. 그 지만 이 논문의 핵심 주장 의 하나는 한국어에는 통사
계 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심사 원도 ‘선생님이 __ 사 주셨어요’와 같은 문장에서처
럼 “맥락상 복원 가능하면” 어떤 요소도 생략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백은 형 의 공백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지만 먼 “맥락”의 유형이 여러 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문이나
(16a) 구문에서 나타나는 공백은 문장 외 인 맥락에 의한 것이고 (16b-d) 구문에 나타나는 공백은
문장 내 인 맥락에 의한 것이다. 과연 이 두 유형의 공백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들과 형 의 공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 하다. 결국 본 논문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비록 공백이 생기는
원인은 맥락의 유형에 따라 다를지라도, 이 공백들은 모두 한국어의 “null anaphor” 인 속성에 의해
생기는 동일한 유형의 공백이라는 이다.
14 한국어 형 의 섬 제약 상에 한 설명 방법은 크게 통사 근법과 그 외의 기능 (의미 , 화용 , 언어 처리 ) 근법으로 나 수 있다. 자의 근법을 취하는 연구로는 Yang (1973), Kang
(1986), Kim 1998b, Han/Kim 2004, 김민국 2010 등이 있다. 후자의 근법을 취하는 연구로는 Na/Huck
(1993), Yoon (1995), Yoon (2011) 등이 있다. 만약 한국어가 어떤 통사 섬 제약을 수 한다면 해당 제약을 어기는 문장은 모두 비문이어야 한다. 그 지만 해당 제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문법 인
문장이 존재 한다면 기능 인 근법이 더 합리 이라고 볼 수 있다.
15 한 심사 원이 한국어 형 의 공백이 섬 제약을 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어 계 이 어 계 과 다름을 보여 주는 근거일 뿐 한국어에 계 이 없음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고 지
했다. 물론, 논리 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 지만 먼 생각 해야 할 은 유형론 으로 계 내의
공백을 여러 유형으로 나 어야 한다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어에는 계 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계 구문의 존재에 한 의문이
별로 없다. 계 구문의 존재가 확립된 언어에서는 일반 으로 계 내의 공백이 섬 제약을 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한국어 계 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는 더 큰 이유는 형 속의 공백이 형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공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53
c. [[__ __ 지 까지 지른] 잘못을 선생님이 모두 용서한] 학생
d. [김 교수가 [__ __ 수강 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F를 ] 수업
이 자료들에서는 상 핵어 명사가 하 형 속의 요소와 련을 맺고 있다.
를 들어, (a)에서 ‘철수’는 하 형 ‘[__ __ 사랑 하던]’의 내부 요소와 공지시
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복합 명사구 제약(Complex-NP Constraint)”을
어기고 있다.16 만약, 형 이 계 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이다. 다음의
들도 여러 종류의 섬 제약을 어기고 있다.
(20) a. [사람들이 [ 희가 __ 썼는지] 궁 해 하는] 편지
b. [[철수가 __ 읽으면] 좋을] 책
c. [[그와 [__ 동생이]] (함께) 미국에 이민 간] 그 사람
자료 (a)와 (b)는 각각 “Wh-제약(Wh-constraint)”과 “부가어 제약(Adjunct
Constraint)”을 어기고 있다 (Yoon 2011: 162-3). 자료 (c)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떨어져 홀로 “이동”을 할 수 없다는 “수식어 제약(Modifier Constraint)”을 어길
뿐만 아니라 어떤 요소가 등구의 한 쪽에서만 이동 해 나갈 수 없다는 “ 등
구조 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도 추가로 어기고 있다.
우리는 에서 한국어 형 속의 공백은 다른 구문 속의 공백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섬 제약도 수 하지 않음을 보았다. 그 다면 그 공백은 계 구성을
한 형 만의 공백은 아니라고 단을 내릴 수 있다. 이제 형 의 공백이
필수 인 요소인지를 알아 보자. 우리는 이미 형 자료 (18)에서 ‘자기, (자기)
자신, 본인’ 등의 재귀 명사나 이에 상응하는 의미의 표 이 공백 신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이들이 모두 명사라면 (18)의 형 은 (공백
책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회생 명사 책략을 쓰는 계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한국어에서 가장 표 인 재귀 명사로 알려진 ‘자기’조차도 형 인
재귀 명사로 보기는 어렵다. 어의 재귀 명사와 달리 ‘자기’는 “무한 결속
(unbounded binding)”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자기’가 선행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인 명사로
보기도 어렵다.
16 Han/Kim (2004)의 분석에 따르면, (19a)와 같은 유형의 “이 계 (double relatives)”은 복합 명사구 제약을 어기지 않는다. ‘철수’가 ‘철수가 애인이 죽어 버렸다’와 같은 “다 주격 구문”의 상
주어로 (하 계 에서 “이동” 된 요소가 아니라) 상 계 에서 이동 된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다 주격 구문 분석으로는, Yoon (2011)에서 지 된 바와 같이, (19b-d)와 같은 유형의 자료들을 설명 할 수가 없다.
채희락1054
(21)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솔선수범 해서 지켜야 한다.
설령 ‘자기’는 (재귀) 명사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과 ‘본인’까지
명사로 보기는 더욱 더 어려울 것 같다.
(22) 수는 [놀고 먹는] [(자기) 자신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cf. * 수는 [놀고 먹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자기) 자신’과 ‘본인’은 ‘자기’와 달리 형 의 수식을 받는
핵어 명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7 핵어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만큼
일반 명사 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7)이나 (14)에서처럼 형 내에 핵어 명사에 상응하는
명사조차 없는 형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를 몇 가지
더 살펴 보기로 하자.
(23) a. 나는 [어제 그 친구와 화를 나 ] 요지를 기억 할 수가 없다.
b. 나는 [어제 그 친구에게 설명을 들은] 내용을 이해 할 수가 없었다.
(24) 이 식당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덜어서 먹는다.
(23)의 문장들에서는 ‘ 화’와 ‘요지’ 그리고 ‘설명’과 ‘내용’의 계를 통사 으로
포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문장 (24)에서는 형 내에서 생략 된
요소는 ‘음식’이지만 핵어 명사는 (‘음식’이 아니라) ‘만큼’이다. 이런 종류의 형
에서는 핵어 명사를 나타내는 어떤 종류의 공백이나 명사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어의 모든 형 이 공백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18
17 다음 문장도 ‘자기’와 ‘자신/본인’의 차이를 보여 다: ‘철수는 [ 장에서 [자기를/(자기) 자신을/본인
을] 신랄하게 비 하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자기’의 선행사는 ‘철수’만 가능하지만, ‘자신/본인’의
선행사는 ‘철수’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가능하다.
18 한 심사 원이 한국어에서 “ 계 이 아닌 형 은 명사구 보문으로 취 되어” 온 통에 따라
(7)과 (24)의 문들은 명사구 보문으로 취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지만 “ 계 ”과 “명사구 보문”에
한 객 인 정의가 주어 지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는 “순환성”의 오류에 빠져 아무 것도 설명 하지 못한다. 과연 (7)에서 선행 형 을 ‘냄새, 소리, 직장 생활, 음식’의 보충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문 (24)에서는 형 속에 목 어 공백이 있는데, 왜 “ 계 ”로 볼 수 없는지에 한 설명도 필요하다.
채희락 (2007: 820)에서는 의존 명사 앞에 오는 형어를 보충어로 볼 수 없는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의존 명사와 선행 요소의 계를 형 인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다음으로, (5), (14), (23)과 같은 문장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문제다. 이처럼 형 과 “명사구
보문”의 경계에 있는 들이 다양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 으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는 이들이 ( 형 인 명사-보문 구성과는 달리) 통사 으로는 구별이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55
우리는 이 섹션에서 형 속의 공백이 형 만의 공백이 아니라 일반 인
유형의 공백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공백이 형 의 필수 인 요소도 아님을 알았다.
한국어의 형 을 계 로 분석 할 수 있었던 가장 요한 근거가 실재로는
존재 하지 않으므로 한국어에는 계 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다. Matsumoto (1988, 1997)와 Comrie (1996, 1998a, 1998b, 2003)가 일본어
형 을 명사 수식 구문으로 분석 했듯이, 한국어의 형 도 일종의 명사 수식
구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에는 계 구문이 없고 명사 수식 구문으로서의 형 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다면 형 과 핵어 명사의 결합 가능성은 수식어인 형 과
피수식어인 핵어 명사의 상호 계에 의해서만 결정 된다. 통사 으로는 수식
이 형형 서술어를 가지고 있으며 피수식어가 명사류라는 것만 규정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에서 핵어 명사가 형 속의 공백 혹은 다른 요소와
일정한 의미-화용 인 련성을 맺고 있으면 문법 인 표 이 된다.19
마지막으로, 어떤 분석 방법을 취하든 형 분석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한국어에는 형용사나 동사의 형형이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표 이 많다.
(25) 큰 사람, 쁜 사람; 가는 사람, 자는 사람; 먹는 사람, 때리는 사람, ...
이들 표 에 나오는 형어를 단어 단 로 보아야 할지 구나 등 그보다 큰
단 로 보아야 할지 문제가 된다. 만약 단어로 본다면 이들과 다음 형 들과의
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설명 해야 한다.
(26) a. [키가/몸집이/머리가/... 큰] 사람
b. [얼굴이/몸매가/코가/마음씨가/... 쁜] 사람
(25)의 ‘큰’과 (26a)의 ‘큰’을 다른 단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5)의 ‘큰 사람’에
서 무엇이 크다는 것인지는 화용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25)의 수식어
부분을 형 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 한다.
되지 않으며 각각의 차이는 의미/화용 인 요인에 기인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9 핵어 명사가 형 속의 어떤 요소와 련을 맺을 수 있는지에 한 일반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고 생각 한다. 를 들어, 연재훈 (2012: 427)은, 김민국(2010: 139)을 인용 하면서, 동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가어는 계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 희가 철수와 학교에 갔다’ → *‘ 희가 학교에 간 철수.’
그 지만 형 에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문법성에 문제가 없다: ‘ 희가 함께 학교에 간
철수’). 이는 계화 가능성이 유형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문장의 특성에 의해 정해 짐을 보여 주는 이다.
채희락1056
3. 분사구문과 한국어 형
우리는 앞 장에서 한국어의 형 이 계 이 아니라 일반 명사 수식 구문으로
분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냥 명사 수식 구문이라고 하면 무
포 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 인 하 부류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
(27) a. 새/이/... 책, 첫/옛/... 사랑
b. 가을/여름/... 하늘, 학교/도서 /... 건물
c. 아주 부자, 오래
형 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a-b)에서처럼 형사와 명사도 명사를
수식하는 형어 기능을 할 수 있다. (c)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부사도 형어
기능을 한다. 형 은 이들과 구별되는 형태-통사 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형태
으로는 술어가 형형 어미를 가지고 있으며, 통사 으로는 단 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형태-통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 를
일반 으로 “분사 구문(Participle Constructions)”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형 을 분사 구문 그 작용역이 단 인 분사 로 분석 해야 함을
보이려고 한다.20
3.1. 분사 구문과 그 단
유형론 으로 볼 때, “분사(participles)”는 일반 으로 형용사/ 형사나 명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 형태를 말 한다.21 어에서는 [V-ed] 형태로
형어 기능을 하는 “과거 분사”와 [V-ing] 형태로 형어 기능이나 명사류 기능을
하는 “ 재 분사”가 있다. 명사류 기능을 하는 재 분사를 일반 으로 “동명사
(gerunds)”라고 한다. 이처럼 분사는 기본 으로 동사지만 동사의 일정한 형태로
형어나 명사류 기능을 한다. 어떤 단 의 기능은 그 것의 문장내에서의 분포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그 분포는 해당 단 의 내부 속성이 아니라 외부 속성에
의해 규정 된다. 그러므로 분사를 포함하고 있는 분사 구문은 일정 단 를 심으로
해서 내부 으로는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 으로는 형어나 명사류의
20 이 에도 한국어 문법 개론서 등에서 형 을 분사 구문이나 분사 로 본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 한다. 그 지만 요한 것은 이런 용어를 사용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형 을 계 로
볼 수 없으며 분사 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 한 구체 인 이유의 타당성이다.
21 “Cross-linguistically, participles are considered to be verb forms that can also be used in positions normally filled by adjectives or nouns.” (Tallerman 2011: 82)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57
Adjectival ( 형어) Nominal (명사류)
S S
S VP S VP
S VP V S VP V
속성을 가지고 있는 표 이라고 볼 수 있다.
논리 으로 가능한 분사 구문의 단 는 분사만 포함하는 V, 분사와 그 것의
(주어를 제외 한) 의존 요소들을 포함 하는 단 인 VP, 그리고 주어까지 포함
하는 S를 가정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8) 분사 구문의 기능과 단
어떤 언어에는 각 기능별로 세 종류의 분사 구문이 모두 존재 하며, 어떤 언어에는
한 두 종류의 분사 구문만 존재 하리라고 생각 한다. 한 종류의 구문만 존재 하면
그 단 는 S가 될 것이며 두 종류가 존재 하면 그 단 는 S와 VP가 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즉, 가장 게 분화 된 언어에는 S 단 한 종류의 분사 구문만
있으며 가장 많이 분화 된 언어는 세 종류의 분사 구문이 모두 있을 것이다.
먼 어에는 어떤 종류의 분사 구문이 있는지 검토 해 보자. 에서 말 했듯이,
분사는 형어 기능을 하는 [V-ed] 형태와 형어와 명사류 기능을 하는 [V-ing]
형태가 있다.22 형어 기능을 하는 를 먼 살펴 보자.
(29) a. *a man [him/he sleeping on the table];
*apples [them/they picked in autumn]
(cf. a man [who is sleeping ...]; apples [which are picked ...])
b. a man [sleeping on the table]; apples [picked in autumn]
c. a [sleeping] child; a [broken] arm, a [boiled] egg, a [baked] potato
표 들에서 [ ] 속 요소는 각각 S, VP, V 단 인데, S 단 의 분사 구문은 성립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 단순히 어에서는 S 단 의 분사 구문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S 단 의 분사 구문 신 다른 특수한 구문,
즉 계 구문이 생겨 그 분사 구문이 수행 할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23
22 문법에서는 일반 으로 재 분사 [V-ing]와 동명사 [V-ing]를 구별 하지만, Huddleston/Pullum
(2002: 80-83)은 이 구별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 하면서 [V-ing]를 “gerund-participle” 형태라고 칭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형태 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해석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주장 한다
(1222 쪽).
23 임홍빈 교수께서 지 했듯이, 어에서도 (최소한 형식 으로는) S 단 분사 구문이 존재 한다: John being a brilliant man, ... 그 지만 이 구문은 ( 계 에 려) 명사 수식의 기능은 못 하고 부사 로서
채희락1058
구나 알고 있듯이, 계 과 VP 단 분사 구문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한
련이 있다.
(30) a. a man [(who is) sleeping on the table]
b. apples [(which are) picked in autumn]
호 속 요소가 있으면 계 이 되고 생략 되면 VP 단 분사 구문이 된다. 그 다면
계 을 S 단 분사 구문의 기능을 신 하는 독자 인 구문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29b)의 VP 단 분사 구문과 (29c)의 V 단 분사 구문 사이에는
분포상의 차이가 있다.24 자에서는 수식어가 명사 뒤에 오지만 후자에서는 수식어
가 명사 앞에 온다. 그리고 V 단 분사 구문에서는 동사 수식어가 나타날 수
없다.
(31) a. a [(*soundly) sleeping (*soundly) (*on the table)] child
b. a [(*easily) broken (*easily) (*in July)] arm
다음으로, 명사류 기능을 하는 [V-ing] 형태의 분사를 가진 구문들, 즉 동명사
구문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cf. Tallerman 2011: 95).
(32) a. Kim hated [Lee losing his licence],
[Lee losing his licence] surprised Kim.
b. Kim hated Lee’s [losing his licence],
Lee’s [losing his licence] surprised Kim.
c. Kim hated Lee’s [losing] of his licence,
Lee’s [losing] of his licence surprised Kim.
(a) 문장들에서는 분사 losing을 포함 하고 있는 체가 분사 구문이다. 내부는
모두 동사 인 속성, 즉 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지만 (b)의 문장들에서는
분사의 주어가 소유격 형태로 구문 바깥에 있다. (c) 문장들에서는 분사의 목 어까
지 구문 바깥에 있다. 여기서는 세 단 의 차이가 형식 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어에서 [V-ing]와 [V-ed]가 형어 기능을 할 때는 S 단 의 분사 구문의 기능을
의 기능만 수행 한다. 이 상은 (최소한 기원상으로는) 어에서도 S 단 분사 구문을 가정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24 분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어 에는 어휘화 되어 V 단 의 분사 구문으로도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a [boring] lecture (cf. *The lecture bored him), an [unwritten] language (cf. *She unwrote the language).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59
계 이 수행 하기 때문에 S 단 분사 구문과 VP 단 분사 구문의 차이를
직 살펴 볼 수가 없다. 그 지만 터키어나 일본어 몽골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S 단 의 형 이 기본을 이루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가 분사 구문 바깥에
서 소유격으로 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이 분명히 드러난다.25
(33) 터키어 (Keenan 1985: 160)
[John-’un Mary-ye ver-dig-i] patates-i yedim
John-Gen Mary-IO give-VN-his potato-DO I ate
‘I ate the potato that John gave to Mary.’
(lit: ‘I ate the potato of John’s giving to Mary.)
(34) 일본어 (Nambu 2010: 6)
Ken-wa [musuko-ga/no yonda] hon-o katazuketa.
Ken-Top son-Nom/Gen read book-Acc cleaned.up
‘Ken cleaned up the books which his son read.’
(35) 몽골어 (Hsiao 2012: 361)
[Bi/Minü ö ügedür ün ol-ǰu üǰe-gsen]
1Sg.Nom/1Sg.Gen yesterday Gen meet-ConV.Impfv see-VN.Pfv
tere kümün ini Batu bayi-n_a.
that person 2Sg.Poss Batu exist-Ind.Nonpst
‘The person who I met yesterday is Batu.’
이들 언어에서 분사의 주어가 소유격으로 나타날 때는 (32b)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분사 구문 바깥에 있음을 보여 다. 이런 소유격 주어 구문의 존재는
해당 수식어가 계 이 아니라 분사 구문이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주어가 존재
할 수 없는 계 ”을 가정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5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계 이 핵어 명사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의 치에 따라 련 속성들에
차이가 난다고 한다. 분포 으로 보면, “verb-final” 언어에서 계 이 치 되는 경향이 크며 “verb-initial” 언어에서 후치 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Nikolaeva 2006: 503). 그 지만 “verb-final”
언어에서조차 후치 계 을 가진 언어가 더 많기 때문에 체 으로는 후행 계 이 더 많다고
한다. Keenan (1985: 160)은 계 치 언어들은 후치 언어들에 비해 계 동사가 주 동사와 다른 (분사형의) 비정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Lehmann (1986: 670)에 따르면, 계
치 언어에서의 계 이 후치 언어나 그 외의 언어에서보다 “명사화(nominalization)”의 정도가
크다고 한다. 이런 경향들을 고려 해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등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 ( 형 인 계 이 아닌) 형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채희락1060
3.2. 형 의 분사 구문 분석 그 의의
한국어 분사형은 형형 어미 ‘-(으)ㄴ, -는’ 등이 붙어 형어 기능을 하는 것과
명사형 어미 ‘-(으)ㅁ, -기’가 붙어 명사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 을 다루므로 자만 분석의 상이 된다.
한국어에는 어떤 단 의 분사 구문이 존재 하는지 검토 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앞에서, (25-26)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어짜리 형어도 로 분석 해야 함을
보았다.26 그러면 좀 더 구체 으로, S 단 의 분사 구문과 VP 단 의 분사 구문이
분화 되어 있는지 살펴 보자.
(36) a. *나의 [10년 에 졸업한] 학교 (cf. [내가 10년 에 졸업한] 학교)
b. *철수의 [명동에서 만난] 노숙인 (cf. [철수가 명동에서 만난] 노숙인)
c. *키의 [아주 큰] 사람 (cf. [키가 아주 큰] 사람)
의 자료를 보면 한국어에는, 일본어나 몽골어 등과는 달리, 형 인 형 에서
조차 VP 단 의 분사 구문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27 Kim (1998b: 789-94)은
다음 표 들이 ‘죤의’가 형형 술어의 주어 역할을 하는 의미로 가능하다고 본다.28
(37) a. 죤의 [부러진] 손 (John’s broken hand) (cf. 부러진 죤의 손)
b. 죤의 [사랑 하는] 친구 (‘the friend that John loves’)
(cf. 사랑 하는 죤의 친구)
c. 죤의 [ 재 만나고 있는] 친구 (‘the friend that John is meeting now’)
(cf. 재 만나고 있는 죤의 친구)
그러나 이 표 들은 가정 된 의미로는 불가능하고 ‘죤의’가 직 핵어 명사를 수식하
26 ‘조용한/고요한/ 막한 (사람/교실/...)’과 같은 표 에서 무엇이 조용한지/고요한지/ 막한지 그
주체를 구체 으로 지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용한/고요한/ 막한’이 단 로 분석이 되어야 할 직 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 한다. 그 지만 ‘성품이 조용한 사람,
주 가 고요한 교실’ 등의 련 표 이 가능하기 때문에 (VP/V 단 로 보아야 할 구체 인 증거가
없으면) S 단 로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 한다. 물론, 계 로 분석을 하면 ‘조용한 교실’의 ‘조용한’도 ‘교실이 조용하다’라는 에서 도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 보아야 한다. 그 지만 우리는
형 을 계 로 보지 않으며 형 속에 반드시 공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7 김창섭 교수에 의하면, 세 국어에는 (36)과 같은 표 들이 많이 존재 했다고 한다. 그 다면 세
국어에서는 S 단 형 과 VP 단 형 이 분화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8 Kim (1998b)에서는 다음의 표 들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는 이에 동의 하지 않는다:
‘그 신사의 입은 옷 (the clothes that the gentleman wears),’ ‘죤의 백화 에서 본 옷 (the clothes
that John saw in the department store).’ 후자는 ‘John’s clothes which I saw in the department store’라는 의미로만 문법 으로 보인다.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61
는 의미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죤의’가 뒤의 형 과는 계가 없다는
것이다. ‘죤의’와 [ ] 부분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법 일 뿐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어에는 S
단 형 과 VP 단 형 이 분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S 단 형 만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어의 형 을 어의 계 과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어의 계 은 모두, (2a)와 (3a-b) 등에서처럼, 시제가 있는 “정형(finite)”
동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의 형 은 “비정형(non-finite)” 동사를 가지고 있다.
비록 형형 어미 ‘-는’과 ‘-ㄴ’ 등이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었-’과
같은 정형 동사의 시제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어 형 의 이런 비정형성은
어의 분사 구문에서 볼 수 있는 속성이다. 둘째, 다음에 주어진 어 자료와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 보자.29
(38) a. She saw the boy [who was dancing in the street].
b. She saw the boy [dancing in the street].
c. 그녀는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소년을 보았다.
(39) a. I have a friend [who will help me].
b. I have a friend [to help me].
c. 나는 [나를 도울] 친구가 있다.
(40) a. We would follow tips [which are available in such a situation].
b. We would follow tips [available in such a situation].
c.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조언을 따를 것이다.
각 세트의 (a) 문장은 계 을 포함 하고 있으며 (b) 문장은 해당 계 과 의미 으
로 련이 있는 구 단 구문을 포함 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 해야 할 사항은
(b)의 어 문장들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구문을 구 하고 있지만 번역을 하면
모두 한국어 형 로 표 된다는 것이다. 즉, 어의 계 과 유사 구문들이
모두 한국어 형 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형 이 어의 계 보
다 포 하는 범 가 훨씬 넓다는 것을 보여 다. 이 상도 한국어 형 을
계 이 아니라 더 포 인 분사 구문으로 분석 하는 우리의 입장에 잘 부합
한다.
우리는 이 장에서 한국어 형 을 단 의 분사 구문으로 분석 해야 함을
보았다. 정리 하면, 한국어 형 구문은, [수식어-피수식어] 구문의 한 하 구문으
29 자료 (38-40)은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언어인지과학과에 재학 인 정민하의 2012년 2학기 학기말 발표 자료에서 가져 온 것이다.
채희락1062
로, 수식어는 단 이고 그 술어가 형형 어미를 가지고 있으며 피수식어는
명사/체언인 구문이다. 통사 으로는 이 조건들만 만족 하면 모두 분사 구문이
된다. 그 지만 이 조건들을 만족 한다고 모두 문법 인 표 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 의 내용이 핵어 명사가 지칭하는 상을 하게 “characterize/describe
/identify” 해야 한다는 등의 의미-화용 제약도 필요하다 (cf. Na/Huck 1993:
200, Yoon 2011).30 그리고 이런 제약들을 모두 만족 한다고 할지라도, 언어 처리
입장에서 보면, 해당 표 을 처리 할 때 일정 수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아야
정상 인 표 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cf. Hofmeister/Sag 2010). 만약 수식어와
피수식어 계를 규정하는 통사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 표 이 비문법 이라면
그 비문법성은 모두 의미-화용 제약과 언어 처리상의 문제로 설명 할 수 있다고
본다. 를 들어,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 해 보자 (Yoon 2011: 180).
(41) a. [[__ __ 사랑 하는] 여자가 죽은] 남자
b. *[[__ __ 사랑 하는] 여자가 춤을 추고 있는] 남자
어떤 남자가 사랑 하는 여자가 춤을 춘다는 내용보다는 그 여자가 죽었다는 내용을
활용 함으로써 그 남자를 더 자연스럽게 묘사 할 수 있다. 이 게 표 의 자연스러움
정도로 문법성을 설명 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 형 을 분사 구문으로 분석
하는 입장에서는 통사 인 섬 제약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어 형 에 한 분사 분석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유형의 형 을
모두 동일한 구문으로 분석 했다는 것이다. 한, 그 게 함으로써, 련 문장들의
(비)문법성에 한 설명도 (의미-화용 , 언어 처리 에서) 체계 으로 제시
할 수 있는 기 가 마련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양한 유형의 형 을
여러 종류의 계 로 나 어 분석 했기 때문에 일반화를 이루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유형 내에서조차 해당 표 들의 문법성을 잘 포착 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하고 있는 이런 분사 분석 방법을 일본어와 몽골어 등 유사 언어의
형 분석에도 용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계 을 “분사 기능을 하는 특화된 구문”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을 취하면 유형론 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계
구문과 유사 구문의 분석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계 과 분사 구문이
어떤 계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정립 할 수 있다. 계 은 단 분사 구문이
특별한 형태-통사 장치를 가지게 된 구문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기능 으로는
30 한국어 “내핵 계 ” 구문을 설명 하기 해 Kim (2002)과 Kim (2008)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relevancy” 조건도 의미-화용 제약의 일종이다. 내핵 계 구문에서는 형 과 주 을 연결시켜
주는 핵어 명사가 독자 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화용 제약의 역할이 다른 유형의 형 구문에서보다 더 크게 작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63
유사하며 형태-통사 측면에서만 차이가 난다. 둘째, 기존에는 모두 계 로
보던 것들을 계 과 ( 단 ) 분사 구문으로 분리 하게 됨으로써 형 유형
분류에 새로운 안목을 제공 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언어의 형 을 좀
더 체계 이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고 생각 한다. 를 들어, 일본어
나 몽골어 터키어처럼 형 의 주어가 소유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의
형 을 계 로 분석하면 “VP 단 계 ”이라는 특이한 구문을 상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S 단 계 ”과의 차이 과 유사 을 체계 으로 설명 할 수가
없을 것이다.
4.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형 속의 공백을 다른 여러 구문에서 나타나는 공백과
차이가 없고 섬 제약도 수 하지 않으므로 일반 인 “null anaphor”로 분석 했다.
그리고 공백이 형 의 필수 요소도 아님을 보았다. 이 게 한국어의 형 을
계 로 분석 할 수 있는 가장 요한 근거가 실재로는 존재 하지 않음이 밝
졌으므로 한국어 형 을 단 의 분사 구문으로 분석 하게 되었다. 이 구문은
일종의 [수식어-피수식어] 구문으로 수식어는 형형 어미를 가진 이고 피수식어
는 명사/체언이다. 이런 통사 조건을 바탕으로 의미-화용 조건과 언어 처리상의
조건에 따라 개별 표 의 문법성을 단 할 수 있다.
이 분석이 가장 크게 기여한 바는 한국어에서 (4)와 같은 형 인 형 과
그 외 여러 가지 특별한 유형의 형 을 모두 동일한 구문으로 분석 함으로써
개별 용례의 문법성 차이도 체계 으로 설명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 과 형어 기능을 하는 분사 구문과의 차이 과 유사 을 밝
냄으로써 이들의 계를 좀 더 체계 으로 정립 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가 좀 더 큰 의의를 갖기 해서는 형 해석에 향을 끼치는
의미-화용 조건과 언어 처리상의 조건에 한 포 이고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민국. 2010. “핵어 명사의 계화 제약에 한 연구,” 한국어학 47, 131-162.
신효필. 1994. 한국어 계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연재훈. 2012. “유형론 의 한국어 계 연구,” 국어학 63, 413-457.
이선우. 1984. “한국어 계 의 회생 명사에 하여,” 어학연구 20.1, 51-59.
채희락1064
채희락. 2007. “ 어와 한국어 품사 분류: 품사 재정립 띄어쓰기 재고,” 언어 32.4,
803-826.
Comrie, Bernard.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2nd ed., Balckwell.
Comrie, Bernard. 1996. “The Unity of Noun-modifying Clauses in Asian Languages,”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an-Asiatic Linguistics,
1077-1088. Mahidol University of Salaya, Thailand.
Comrie, Bernard. 1998a. “Attributive Clauses in Asian Languages: Towards an Areal
Typology,” Boeder, W., et al., eds., Sprache in Raum und Zeit 2, 51-60. Gunter
Narr.
Comrie, Bernard. 1998b. “Rethinking the Typology of Relative Clauses,” Language
Design 1, 59-86.
Comrie, Bernard. 2003. “Typology and Language Acquisition: The Case of Relative
Clauses,” Ramat, A. G., ed., Typology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37.
Mouton.
Han, Chung-hey and Jong-Bok Kim. 2004. “Are There ‘Double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istic Inquiry 35, 244-285.
Hofmeister, Philip and Ivan A. Sag. 2010. “Cognitive Constraints and Island Effects,”
Language 86.2, 366-415.
Hsiao, Su-ying. 2012. The Nominative/genitive Alternation in Modern Inner
Mongolian Relative Clauses: A Statistical Perspective,“ Linguistic Research
29.2, 351-380.
Jo, Mi-Jeung. 2005. “The Structure of Non-regular Relativ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ensed clause and CP,”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0.1, 195-222.
Kang, Young-Se. 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Keenan, Edward L. 1985. “Relative Clause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I, 141-1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enan, Edward L. and Bernard Comrie.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99.
Kim, Jong-Bok. 1998a. “On the Mixed Properties of Pseudo Relative Clause
Construction,” Park, B.-S. and J. Yoon, eds.,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83-93.
Kim, Jong-Bok. 1998b. “A Head-Driven and Constraint-Based Analysis of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Language Research 34.4, 767-808.
Kim, Min-Joo. 2008. “Relevance of Grammar and Pragmatics to the Relevancy
Condition,” Language Research 44.1, 95-120.
Kim, Yong-Beom. 2002. “Relevancy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a 112, 541-559.
Lehmann, Christian. 1986. “On the Typology of Relative Clauses,” Linguistics 24,
663-683.
Matsumoto, Yoshiko. 1988. “Semantics and Pragmatics of Noun-modifying
Constructions in Japanese,”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14, 166-175.
한국어에 과연 계 이 존재 하는가: 분사 분석 1065
Matsumoto, Yoshiko. 1997. Noun-Modifying Constructions in Japanese: A Frame-semantic
Approach. Benjamins.
Na, Younghee and G. J. Huck. 1993. “On the Status of Certain Island Violations
in Kor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181-229.
Nambu, Satoshi. 2010. “Nominative/genitive Alternation in Japanes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a Quantitative Study,” In Fainleib, Y., N. LaCara N. and
Y. Park, eds., The 41st Annual Meeting of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Nikolaeva, I. 2006. “Relative Clauses,” Brown, Keith, ed.,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Elsevier.
Song, Jae Jung. 1991.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Conspiracy and
Pragmatics.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11, 195-220.
Tallerman, Maggie. 2011. Understanding Syntax, 3rd ed. Hodder Education.
Yang, Dong-Whee. 1973. “Island Constraints and pro-deletion Phenomena in
Korean,” Language Research 9.2, 144-161.
Yoon, James. 1995. “The Semantics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In Akatsuka,
N.,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4, 413-428. CSLI.
Yoon, Jeong-Me. 2011. “Double Relativization in Korean: An Explanation Based
on the Processing Approach to Islands Effect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6.1, 157-193.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 면 왕산리 산 89한국외국어 학교 언어인지과학과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October 14, 2012Revised: December 14, 2012Accepted: December 23, 2012